
“참 잔인한 작품이다. 작가가 어쩌면 그렇게 독할 수가 있지? 어휴….”
수요일 낮 공연을 마치고 만난 배우 이지하는 “아, 너무 힘들어”하며 자리에 앉았다. 공연을 막 마치고 바로 극장 앞 카페로 직행했던 터라 힘들 만도 했다. 게다가 지금 하고 있는 공연에서 자살을 계획하고 “엄마, 나 오늘 죽을 거야”라고 외치는 딸 ‘제씨’ 역을 맡아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공연 3회 정도를 남긴 이지하와의 인터뷰는 늦은 감이 있지만 도리어 할 말은 많았다.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주문한 빙수가 녹아 물이 ‘뚝뚝’ 흐를 때까지 이지하의 입담은 식지 않았다.
이지하는 현재 연극 ‘잘 자요, 엄마’에서 자살을 계획하고 엄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려는 딸 ‘제씨’ 역을 맡았다. 처음 대본을 받아든 이지하의 첫 느낌은 “잔인하다”였다. 현재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살’이라는 소재는 멀지 않은 이야기다. 하지만 딸이 엄마 ‘델마’에게 죽으러 간다는 선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자살하는 설정은 이지하에게도 잔인하고 강력한 코드였다.
“겉으로만 보면 ‘불효녀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살’이 우리 작품의 주제가 아닌 하나의 명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자 사회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소통을 해야 하는지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연극은 어렵다. 단순히 감상만 하라고 만든 연극은 아닌 게 확실하다.”
극중 제씨는 엄마와 마지막 밤을 보내며 여러 이야기를 꺼낸다. 옆집 아줌마 이야기부터 자신의 이야기까지. 조금씩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상처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자신의 간질병과 바람이 난 남편 그리고 집을 나간 아이의 이야기까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자신의 한계점에 도달한 그의 선택은 ‘죽음’ 뿐이라고 고백한다. 처음부터 쉽게 이해할 순 없었지만 이지하는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제씨’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제씨에겐 아무것도 없지 않나. 지금이야 ‘간질병’은 약만 먹으면 나아지는 병이지만 1970년대에 ‘간질병’은 심각한 것이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니까. 이 자체가 제씨의 삶의 한계를 극명하게 제시해 둔 것이다. 게다가 남편과의 이혼, 아이의 가출까지 모두 자기의 간질병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갈 곳은 늙은 엄마네 집 밖에 없다. 게다가 오빠의 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으니 좌절감도 느꼈겠지. 막다른 골목에 처한 기분이지 않을까. 지금이야 여러 출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여건이 안 됐고. 게다가 그 여성이 풋풋한 20~30대도 아니고 인생의 반을 살아온 40대 여성인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 돌아보면 남은 것이 없으니 존재할 이유를 못 찾는 거다. 결국 그가 온전히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죽음 뿐 아니었을까.”
흔히 ‘엄마와 딸’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재로 많이 사용된다. 결국 남는 것은 가족이라는 이야기로 말이다. 하지만 ‘잘 자요, 엄마’는 노선이 완벽하게 다르다. ‘가족’이라는 관계를 삐딱하게, 냉정하게 바라본 결과물이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감춰야 하는 모순된 관계가 바로 가족이며 이것이 의도치 않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지하는 “작가가 독한 거다. 죽지 않을 것처럼 대화를 나누던 딸이 끝내 죽는 장면을 쓴 것을 보면”이라고 말했다.
“‘가족’은 우리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근데 냉정하게 바라보면 족쇄 아닌 족쇄 같은 관계이기도 하다. 대사 중 엄마가 ‘미안해, 제씨. 나는 네가 내 것 인줄 알았어’라는 말이 있지 않나.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가족이란 의미가 가끔은 ‘이용’이나 ‘소유’가 되기도 한다.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완벽하게 독립하는 것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생기고. 또 결혼 후 말에 떨어져 간질병이 생긴 줄 알았던 제씨는 생의 마지막 날에 어렸을 때부터 간질병을 앓았다는 것을 엄마를 통해 알게 되지 않나. 엄마는 물론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그 말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제씨는 남편의 이혼과 아이의 가출이 자기 탓이라고 원망하고 살진 않았을 거다. 결국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자녀를 향한 족쇄가 된 거다. 끔찍하지 않나.”
‘엄마와 딸의 대화’가 소재인 이야기다보니 주 관객층은 중년 여성이 대다수다. 모녀 관객도 많고 친구들끼리 오는 여성들도 있다. 그러다보니 평소 공연장에서 보기 힘든 추임새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마치 안방에서 주말연속극을 보며 혀를 끌끌 차는 ‘엄마’의 모습이라고나 할까. 이지하는 “추임새 덕분에 극장 분위기가 종종 다를 때가 있다”며 웃기도 했다.

“내가 앞쪽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엄마한테 죽는다고 하니까 어떤 아주머니는 ‘그래, 죽어라. 죽어’라며 혀를 차시더라. 어떤 분은 구수한 욕을 뱉고 가시기도 한다.(웃음) 아무래도 앞부분에서 딸의 자살 발언이 강하게 다가오니 불효녀의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긴 하다. 그런데 정말 ‘제씨’ 나이대인 40대 중후반 여성들 중 크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어찌됐든 거의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생기는 허전함 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지하는 “연극은 재미의 기능도 있지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기능도 있지 않나.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연극을 본 관객들 중 한 분이라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잠시 동안 고민만 해보셔도 배우로서 기쁠 것 같다. 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기분 좋을 것 같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심각한 연극의 문턱이 낮아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지하는 이번 공연을 마치고 창작산실의 ‘색다른 이야기 읽기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를 들어간다. 이지하는 “이 작품 끝나면 우울한 캐릭터는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웃으며 “‘잘 자요, 엄마’를 하면서 내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 이 작품에 대한 만족감은 ‘제로’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스스로 잘 하지 못한 생각이 들었다.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았는데 완벽히 해결하지 못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이런 기분이 10년 만에 든 것 같은데…. 그 만큼 앞으로 내가 점검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의미 아닐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작품이고 내게 많은 ‘과제’를 남긴 작품이다.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사진제공|수현재씨어터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송혜교 맞아? 못 알아볼 뻔…역시 천천히 강렬하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25/133034684.1.jpg)
![원진서 파격 터졌다, 아찔 비키니…♥윤정수도 상의탈의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25/133034522.1.jpg)




![블랙핑크 제니, 깊이 파인 가슴라인…아찔한 포즈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24/133033379.1.jpg)
![수지, 예쁜 얼굴에 무슨 짓? 마구 구겨도 비주얼이 작품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24/13303272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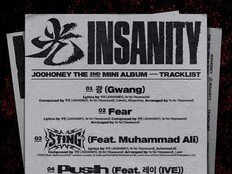



![원진서 파격 터졌다, 아찔 비키니…♥윤정수도 상의탈의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25/133034522.1.jpg)
![송혜교 맞아? 못 알아볼 뻔…역시 천천히 강렬하다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25/133034684.1.jpg)
![이엘리야 그냥 쇼킹→이세영 얼굴 갈아끼운 심경 (미스트롯4)[TV종합]](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26/133039295.1.jpg)


![김희정, 운동복 자태도 남달라…건강미 넘치는 바디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5/12/26/133045716.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