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스틴 존슨.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야구팬들에게 잘 알려진 대로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의 홈구장 쿠어스필드는 투수들의 무덤이자 타자들의 천국이다. 해발고도 1610m의 고지대에 야구장이 있다보니 타구가 다른 구장보다 더 멀리 나간다고 알려져 있다.
LA 다저스 류현진도 쿠어스필드에서의 경험을 이야기기한 적이 있다. 경험담에 따르면 포수가 내미는 미트를 보고 던지면 공이 그보다 더 높게 가기 때문에 미트보다 낮게 목표점을 잡고 던져야 한다고 했다. 투수와 포수 간의 거리가 18.44m로 짧지만 공기밀도가 낮은 고지대에서의 피칭은 평지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이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이 입증하는 엄연한 과학이다.
예일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 로버트 어데이의 연구에 따르면 120m 거리를 날아가는 타구는 고도와 기온, 공의 온도, 기압, 뒷바람, 습도, 투구속도, 배트의 종류 등에 따라 각각 비거리가 더해지거나 덜해진다. 영향력은 다 다른데 가장 큰 변수는 어떤 배트를 쓰느냐다. 그 다음이 습도와 거리다. 해발고도 기준으로 305m마다 비거리가 2m씩 늘어난다고 했다.
25일(한국시간) 멕시코시티 차풀테펙 골프클럽(파71·7345야드)에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 멕시코 챔피언십(총상금 1025만 달러·약 115억 원)에서 장타자 더스틴 존슨(35·미국)이 우승을 차지하고 상금으로 한화 약 19억6000만 원을 챙겼다.
해발고도가 2371m인 멕시코시티에서 펼쳐진 경기답게 선수들의 비거리는 모두 평소 이상이었다. 야구공이었다면 약 16m의 비거리가 더 늘어날 곳이었다. 야구처럼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골프도 고지대에서 치면 비거리가 평소보다 15%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4타차 선두로 로리 매킬로이(30·북아일랜드)와 함께 챔피언조에서 출발한 존슨은 무시무시한 장타대결을 벌였다. 파5 11번 홀에서 무려 404야드의 엄청난 티샷을 날렸다.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꿈같은 숫자였지만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장타 경쟁에서 매킬로이는 존슨을 앞섰다.
그 홀에서 매킬로이는 410야드를 기록했다. 평균 드라이버샷 거리도 차이가 났다. 존슨은 343야드였고, 매킬로이는 365야드였다. 경기 내내 매킬로이의 티샷이 존슨의 샷보다 더 멀리 나갔지만 골프는 비거리를 재는 경기가 아니었다.
티샷과 아이언샷, 어프로치샷 등 숏게임에서 매킬로이가 세계 정상급 기량을 과시하며 앞서나가도 결국 우승은 5타 차이로 존슨이 차지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바로 퍼트였다. 공이 하늘에서 떠 있는 동안에 벌어진 ‘공중전’은 매킬로이가 앞섰지만 정작 그린에 안착한 뒤 벌어진 ‘지상전’ 즉 퍼트에서는 존슨이 이겼다. 존슨은 “그린에서 공을 잘 굴리기만 한다면 올해도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 연습 때 죽기 살기로 드라이버만 들고 공을 힘껏 때리는 주말골퍼가 있다면 존슨의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속보] '아! 추신수, 어쩌다가…' 안타까운 상황](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9/02/25/94271389.2.jpg)











![있지 채령, 허리 라인 이렇게 예뻤어? 크롭룩으로 시선 강탈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3831.3.jpg)


![신지원(조현), 힙업 들이밀며 자랑…레깅스 터지기 일보직전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386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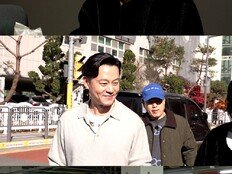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