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72만3338달러를 벌어들인 '토르: 천둥의 신'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3D 관람율을 토대로 관객동원 면에선 오히려 능가했다는 분석이다. 향후 전망도 그만큼 더 좋으리란 신호다.
그런데 북미보다 한 주 늦은 7월 28일 국내개봉이 예정된 '퍼스트 어벤져'엔 나름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 '퍼스트 어벤져'의 원제는 '퍼스트 어벤져'가 아니다. '캡틴 아메리카'다. '퍼스트 어벤져'는 원래 영화의 부제였을 뿐이다.
원작만화 제목도 당연히 '캡틴 아메리카'다. 애초 슈퍼히어로 이름 자체가 캡틴 아메리카니 사실상 그 외 다른 제목은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국내에선 '퍼스트 어벤져'란 부제를 앞세워 개봉하게 됐다. 전 세계에서 원제를 사용하지 않고 '퍼스트 어벤져'로 개봉하게 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단 3개국뿐이다. 다른 두 나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욕타임스 온라인판 분석 기사를 인용 보도한 무비위크 7월 11일자 기사 '수퍼 히어로도 반미 감정은 무서워'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냉전 시대의 유물(?)로 남은 반미 감정이 문제시됐다. 1990년대까지 미국 문화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두 나라에서 섣불리 미국(America)이란 브랜드를 들이미는 마케팅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한국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 주둔해 온 미군에 대해 국민적 반감을 갖고 있다. 수퍼 히어로 무비의 주요 관객층인 젊은 세대는 반미 감정이 특히 높다. '캡틴 아메리카'란 명칭이 되레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씨네21 6월 30일자 기사 '캡틴 아메리카, 세계를 향해!'는 뉴욕타임스보다 더 극단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기사는 "주인공의 이름인 '캡틴 아메리카'가 빠진 이유? 그걸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캡틴 아메리카는 1941년 처음 코믹스 주인공으로 등장했을 때부터 미국적 애국주의를 표방하는 히어로였다. 백악관에 걸려 있는 성조기를 떼다 지은 듯한 쫄쫄이와 방패부터가 팍스 아메리카나의 대변자라는 증거"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외 관객이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라는 제목을 근심 없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캡틴 아메리카는 시대착오적인 히어로"라고 지적했다.

●'퍼스트 어벤져' 해외시장 반감 우려해 제작 지연?
그런데 여기서 위 뉴욕타임스 기사 원문을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기사는 "마블과 파라마운트사는 애초 '캡틴 아메리카'를 놓고 해외엔 '퍼스트 어벤져'로 일괄 배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파라마운트사 해외지부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캡틴 아메리카' 브랜드 가치가 워낙 높다며 제목 변경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결국 한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지는 '캡틴 아메리카' 브랜드 가치가 거의 없어 '퍼스트 어벤져'로 바뀌게 됐을 뿐, 할리우드 측에선 애초 '전 세계적 반미감정'을 우려했다는 뜻이다. 기사에 언급된 미군부대 운운은 '밑져야 본전' 심리로 '퍼스트 어벤져' 제목을 받아들인 한국을 놓고 불필요한 이유를 댄 것에 불과하다.
한편 기사는 '퍼스트 어벤져'와 유사한 이전 사례들도 전했다. 예컨대 2006년작 '슈퍼맨 리턴스'에선 슈퍼맨이 자신의 목적을 말하는 유명한 대사 "진실, 정의, 그리고 미국의 방식으로"가 "진실, 정의, 그런 모든 것들"로 바뀌었고, 이병헌이 출연한 2009년작 '지아이 조'에서도 "A Real American Hero"라는 부제가 "The Rise of Cobra"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기사는 "전체 흥행수익의 70% 넘게 차지하는 해외시장에서 '아메리카'란 단어가 기분 나쁘게 들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결국 근래 할리우드는 항상 미국에 대한 전 세계의 시각을 두려워했다는 얘기다. 한국 등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한편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캡틴 아메리카의 블록버스터 급 영화화가 왜 그토록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실마리가 잡힌다. 캡틴 아메리카의 블록버스터 급 영화화 기획이 처음 제시된 건 벌써 14년 전인 1997년이다.
이후 저작권 소송분쟁으로 2003년까지 제작이 유보됐다지만, 그래도 그로부터 8년이 지난 뒤에야 영화화가 이뤄졌다는 건 확실히 상식적인 전개는 아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그렇게 오래 내버려둘 정도로 만만한 컨텐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941년 원작만화 개시 이래 캡틴 아메리카는 일약 미국 슈퍼히어로 만화를 대표하는 캐릭터 중 하나로 성장했다. 미국 만화전문 사이트 IGN.COM의 '역대 100대 슈퍼히어로' 기획에서도 캡틴 아메리카는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등에 이어 6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런데도 캡틴 아메리카는 같은 기획에서 인지도·인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헐크(9위), 데어데블(10위), 아이언맨(12위), 왓치맨(16위)은 물론, 헬보이(25위), 퍼니셔(27위), 콘스탄틴(29위)보다도 블록버스터급 영화화가 늦었다. 심지어 영화기획에 들어간 1997년 이전에도 저지 드레드(35위), 스폰(36위) 등은 이미 제작까지 마쳐 공개된 바 있다.
결국 할리우드 측에서도 캡틴 아메리카는 일종의 '마지막 카드'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해외시장에서 반감을 살지 모른다는 공포가 미국 내에서의 탁월한 인지도마저 덮어버릴 정도로 컸던 것이다.

● 한국대중은 더 이상 '미국만세'에 신경 쓰질 않는다
물론 '퍼스터 어벤져'가 해외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줄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어쩌면 제목까지 바꿔달았음에도 주저했던 바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시장만을 놓고 봤을 때, 의외로 우려했던 반미감정 탓에 실패하는 일이 있으리라 예상하긴 어렵다. 적어도 '퍼스트 어벤져'로 제목을 바꾼 배려(또는 공포)는 상당부분 오버센스였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왜 그럴까.
먼저 한국에서 '캡틴 아메리카'는 이미 '통용된' 제목이란 점을 들 수 있다. 같은 원작만화를 바탕으로 1979년 유니버설TV에서 제작한 TV용 영화 '캡틴 아메리카'가 그 제목 그대로 1982년 KBS2 '토요명화'에서 방영된 바 있다.
이어 1980년대 중후반엔 영한대역본으로 원작만화 일부가 '캡틴 아메리카' 제하에 출간됐고, 1992년엔 B급 규모의 1990년작 '캡틴 아메리카'가 세경문화영상에서 제목 그대로 국내 비디오 출시된 일이 있다.
이에 '20여 년 전과 지금은 미국에 대한 대중인식이 다르다'는 입장이라면, 이번 영화화와 함께 진행된 여타 미디어 사정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 이미 지난 5월 시공사에선 영화 개봉에 맞춰 '캡틴 아메리카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3권의 원작만화를 출간했다.
지난 7월 15일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세가에서 PS3 게임 '캡틴 아메리카: 슈퍼 솔져'를 제목 그대로 출시했다. 여기서 동떨어진 건 영화판 하나뿐이다. 다들 별 신경도 안 쓰는데 파라마운트사만 오버했던 셈이다.
확실히 21세기 들어 한국대중은 미국영화가 아무리 미국정신을 외쳐대도 딱히 반응하지 않아왔다. 거의 10년 전인 2002년, '스파이더맨'의 엔딩 컷에서 스파이더맨이 성조기가 나부끼는 빌딩 옥상에 서있는 장면을 보고도 한국대중은 짜증내지 않았다. 오히려 시큰둥했다.
'스파이더맨'은 아무런 논란 없이 300만 가까운 관객을 끌어 모았다. 이어 레이건 시대의 전유물 람보가 부활해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미국에서 만든 영화니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당연한 일이다. 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의 여파는 동서 군사경쟁 소강에만 그친 게 아니었다. 1980년대 전반에 걸친 미국의 문화 패권 역시 동시에 소강시켰다. 미국 대중문화상품이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여겨지던 시절은 끝났다.
그와 동시에 한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각지는 자국 대중문화상품 시장을 탄탄하게 키워나갔다. 특히 영화 장르의 경우 시장점유 면에서 50% 이상씩을 회복해내는데 성공했다.
자연스럽게 자국 대중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생겨났고, 미국대중문화에 대한 피해의식은 그만큼 줄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미국대중문화 자체가 별로 대단하게 보이질 않았다. 그저 '돈 쏟아 부은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해졌다.
그러니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성조기가 나부끼건 미국국가가 울려 퍼지건 람보가 부활해 기관총을 쏴대건, 그저 '너희 나라 얘기' 정도로만 치부해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문화적 피해의식이 사라진 자리엔 남는 건 문화적 이질감이다.
이제 세계대중은 그저 비주얼 스펙터클로서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소화하지 그 이상은 아니다. 그 안에 담긴 이데올로기도, 라이프스타일도, 하다못해 윤리적 메시지까지도 모조리 무시해버린다. '남의 일'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캡틴 아메리카'란 제목 하나로 한국대중이 열불 내며 타오르리라는 우려는 그야말로 할리우드 측의 오지랖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캡틴 아메리카' 그대로 개봉됐어도 아무런 노이즈 없이, 무관심 속에 공개됐을 수 있다.

● '퍼스트 어벤져'가 시대착오적으로 여겨지는 이유
그렇다면 할리우드는 왜 이 같은 배려 아닌 배려, 오지랖을 행사하게 된 걸까? '아메리카'란 단어에 해외 각지가 모두 경기를 일으키며 광분하리라 예상하게 된 계기가 뭘까? 부시정권 시절 전 세계에 걸쳐 일었던 반미여론 탓에?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위 뉴욕타임스 기사 중 한 문장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애국적인 전쟁영웅(캡틴 아메리카)을 정치적으로 분열된 미국시장에서 파는 일부터 충분히 까다롭다"는 부분이다.
결국 미국 내에서도 '캡틴 아메리카'는 꽤나 부담스러운 컨텐트였다는 얘기다. 씨네21 기사 말마따나 "심지어 미국에서도 캡틴 아메리카는 시대착오적인 히어로"로 간주됐을 수 있다. 어쩌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을까. 시계를 1990년대 초반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다.
언급했듯 1990년대 초반의 냉전 종식은 미국의 문화 패권을 소강시키는데 일조했고, 그만큼 미국 외 대중문화시장이 자생력을 갖게 하는 계기도 됐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세계 리더로서 미국의 위상도 함께 꺾여버렸다.
1980년대처럼 팍스 아메리카나를 부르짖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 부시정권의 걸프전이 발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걸프전은 '석유를 위한 전쟁'이란 비난을 사며 갖가지 국제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때 즈음부터 미국대중은 점차 레이건시대의 애국주의적 사고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세계가 더 이상 예전처럼 미국을 응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충격과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다.
냉전논리에 섞여들었던 국가주의에도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가 세기말을 만나며 냉소주의, 염세주의의 시대가 찾아왔다. 이른바 X세대의 시대다.
당연히 대중문화계도 그에 영향을 받았다. 암울한 얼터너티브 록이 플래티넘 디스크를 연달아 차지하고, 'X-파일' 같은 음모론 TV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영화계도 마찬가지였다. '탑건'이나 '젊은 용사들' '록키 4' 같은 애국주의 영화들이 큰 인기를 얻었던 1980년대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
냉소적인 '펄프 픽션', 묵시록적 '세븐', 미국 대기업 만행을 다룬 '에린 브로코비치', 마약에 찌든 미국사회를 묘사한 '트래픽' 등이 대히트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해외전쟁을 다루는 시각도 자연스레 부정적으로 변했다.
공화당 지지 액션스타 실베스터 스탤론 역시 지난해 에인트잇쿨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전성기 때와 달리) 지금은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부정하는 영화들이 주류"라고 평가한 바 있다.
곧 국가주의·애국주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슈퍼히어로물마저 외부의 적과 싸우는 슈퍼맨 등보다는 내부의 적과 싸우는 배트맨 등으로 유행이 옮겨갔다. 진정한 문제는 미국 내부에 있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란 의식이 미국대중에 찾아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자국역할과 위상, 이미지에 패배주의적이고 회의적이며 냉소적인 환경 속에서 십 수 년을 보내다보니 더 이상 '캡틴 아메리카'를 그 제목 그대로 해외에 공급한다는 '배짱' 자체가 할리우드에 남아있을 리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조차 어찌될는지 알 수 없는 컨텐트처럼 여겨졌으니 말이다.

● '퍼스트 어벤져' 관객층은 '포스트 X세대'였나
어찌됐건 모로 가도 '남의 나라 얘기'긴 하지만, 정작 우리가 눈여겨봐야할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다. '퍼스트 어벤져'는 확실히 북미에서 대성공을 거두긴 했다. 그러나 그 관객분포가 조금 특이하다.
'퍼스트 어벤져'와 첫 주 거의 흡사한 관객을 끌어들인 '토르: 천둥의 신'은 25세 이상 관객비중이 무려 72%에 달했다. 그러나 '퍼스트 어벤져'는 그보다 크게 적은 58%에 불과했다.
관객 수는 비슷한데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건, 단순히 말해 25세 이상, 미국 주류 관객분포를 감안해보면 25~45세 사이 '제2의 관객층'이 그만큼 '퍼스트 어벤져'를 덜 봤다는 얘기가 된다.
이 세대를 역산해보면 세계 속 미국의 역할에 의문이 일기 시작했던 1990년대 중반 10~30세였던 세대다. 정확히 X세대다. '토르: 천둥의 신'과 '퍼스트 어벤져' 모두 같은 마블 코믹스 원작에 비슷한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이들 X세대에겐 정말로 '퍼스트 어벤져'가 시대착오적인 컨텐트처럼 여겨졌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반대로, 위 관객분포는 25세 이하 세대의 경우 '토르: 천둥의 신'보다 확실히 많은 관객이 '퍼스트 어벤져'를 찾았다는 결과도 함께 보여준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정확히 10년 전 미국이 9.11 테러를 맞았을 당시 5~15세, 소년기~사춘기였던 세대다.
어쩌면 이 세대는 이전 X세대와 달리 외부로부터 큰 공격을 받고 애국주의·국가주의를 회복, '퍼스트 어벤져' 같은 컨텐트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세대로 거듭났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대중문화시장에도 몇 가지 힌트를 알려준다. 한국 역시 1990년대 전반에 걸쳐 X세대 현상을 겪은 바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당시 20대의 신좌파 혹은 문화좌파 현상이라 짚어볼 법하다.
그 뒤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경제 불황이 찾아왔고, 이후부턴 청년의식의 진공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한국도 9.11에 버금가는 테러를 겪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맞아 민간인을 포함해 우리 국민 50명이 살해당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자 20대 젊은 층에서 해병대 지원이 급증하는 등 애국주의 물결이 일었다. 이를 P세대(Patriot 세대)라 따로 일컫는 미디어 보도도 등장했다.
이 세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 세대는 지금의 충격과 분노를 발판 삼아 곧 또 다른 대중문화 트렌드를 만들어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대중문화산업이 '퍼스트 어벤져'를 통해 정작 고심해봐야 할 건 바로 이 같은 부분이다.
세대의식 변화에 따른 미래 트렌드의 예측 부분이다. 하찮은 반미감정 운운이 아니라 말이다. 그리고 미래 대중문화시장은 늘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면을 살펴보는 자의 것이 된다. 업계와 미디어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오·감·만·족 O₂플러스는 동아일보가 만드는 대중문화 전문 웹진입니다. 동아닷컴에서 만나는 오·감·만·족 O₂플러스!(news.donga.com/O2)
이문원 대중문화평론가 fletch@empa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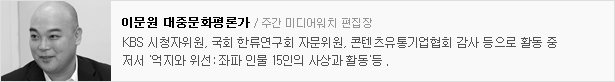







![앨리스 소희, 15살 연상과 결혼+연예계 은퇴 [공식입장]](https://dimg.donga.com/a/298/198/95/1/wps/SPORTS/IMAGE/2022/10/27/116189912.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