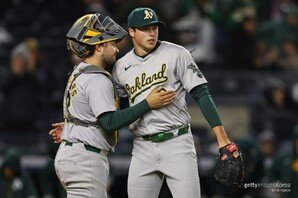고 박용곤 구단주.
OB 베어스(현 두산)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미래의 에이스로 꼽혔던 김일융을 영입하려고 시도했다. 고 박용곤 구단주(1932~2019년)가 요미우리신문사 최고경영진과 접촉한 끝에 트레이드 성사를 눈앞에 뒀다.
일본리그 커리어에서 장명부보다 앞서는 슈퍼 에이스를 품으려는 순간 삼성 라이온즈가 뛰어들었다. 삼성은 이건희 구단주의 주도로 이적료를 합쳐 5500만 엔이라는, 당시로선 천문학적인 액수를 요미우리에 제안했다.
박용곤 구단주는 망설임 없이 김일융 영입작전에서 물러났다. 그 대신 경남 창원에 2군 전용 야구장을 건립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연습장을 지어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서였다. 한동안 OB 선수들은 그 야구장을 ‘니우라(김일융의 일본명) 구장’으로 불렀다. 한국프로야구 역사에 기억될 최초의 2군 전용 구장이었다.
김일융은 1984년부터 1986년까지 3년간 삼성에 54승과 한 차례의 통합우승(1985년)을 선물했다. 그리고 두산은 오래도록 빛나는 ‘화수분 야구’를 얻었다.
4일 영면한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은 생전 야구에 대해 극진한 애정을 보였다. 운영철학도 남달랐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고, 그 유산은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들도 극찬하는 경기도 이천의 베어스파크로 결실을 맺었다.
1998년 OB는 이천의 맥주공장 기숙사를 개조해 핵심 유망주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훈련장을 만들었다. OB 2군 선수들은 이 곳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프로야구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이 폭등하기 시작한 2005년 두산은 이천에 베어스필드를 완성했다.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특급 FA 선수를 싹쓸이할 수 있는 돈이었지만, 두산의 선택은 미래였다.
두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토지매입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550억 원을 2군 훈련장에 더 투자했다. 2014년 베어스파크로 이름을 바꿔 재개장한 이 곳은 최첨단 종합재활훈련시설을 갖췄다. 잠실구장과 관중석만 다른, 똑같은 크기의 야구장도 지었다. 퓨처스리그 선수들이 1군으로 승격했을 때 곧장 그라운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투자다.
나이가 들면서 휠체어를 이용했지만 표정만은 소풍 가는 어린아이 같았던 박 전 구단주를 이제 더 이상은 잠실구장에서 볼 수 없다. 그러나 혜안이 담긴 야구단에 대한 고인의 철학은 여전히 베어스 유니폼에 남아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앨리스 소희, 15살 연상과 결혼+연예계 은퇴 [공식입장]](https://dimg.donga.com/a/298/198/95/1/wps/SPORTS/IMAGE/2022/10/27/11618991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