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의 순간’은 신일고 2학년이었던 1997년. 봉중근은 3번을 치고 투수로도 활약하며 신일고를 전국대회 3관왕으로 이끌었다. 당시 2번 타자가 현재윤(삼성), 4번이 안치용, 5번이 김광삼(이상 LG)이었다.
고교 시절, 타격에도 남다른 재능을 가졌던 그는 타자 대신 투수의 길을 걷게 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지만 미련은 남는다”고 했다. 슬라이딩하고 다이빙 캐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구를 시작해서인지, 야수에 대한 남다른 향수를 갖고 있다. 특히 그의 타격재능을 아쉬워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 더 그렇다. 그래서인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면 타자 복귀(?)도 마음속에 가진 꿈 중 하나다. 타자로 되돌아간 오랜 친구 김광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그래서 누구보다 간절하다.
한국에 돌아오면서 새롭게 생긴 꿈이 하나 있다. 언젠가 꼭 한번 감독, 아니 ‘감독님’이 되고 싶다는 꿈. 미국서 뛸 때 한번도 감독을 꿈꾼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프로야구에서 감독이 갖는 위상은 메이저리그와 또 다르다. 예를 들면 대우도 그렇다. 메이저리그는 선수가 스위트룸을 쓰지만 한국은 감독이 최고급 호텔방을 쓴다. 주변에서 한없는 존경도 받는다.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라고 했다. 항상 꿈을 쫓아 하루하루를 보내는 봉중근. 그는 오늘에 충실하면서 내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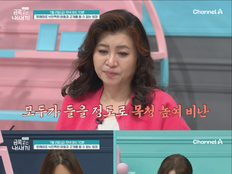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이민정, 딸과 첫 해외여행서 응급 상황…“♥이병헌이 밤새 간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1053.3.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이민정, 딸과 첫 해외여행서 응급 상황…“♥이병헌이 밤새 간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1053.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정다은♥’ 조우종 새 출발, 9년 인연 끝냈다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0/02/05/99554979.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