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농구 MVP로 선정된 KT 박상오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부인 김진아 씨의 축하를 받고 있다.
■ KT 박상오, 아름다운 인생역전
우여곡절 많았던 중앙대 시절
프로에서도 그냥 힘좋은 선수
전창진감독 만나 인생의 전기
막농구에 팀플레이 불어 넣자
평균 14.9점 ‘우승 주역’ 변신
야구에서는 2009시즌 홈런왕 김상현(31·KIA)이 있었고, 축구에서는 2002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최진철(40·강원FC코치)이 있었다. 인고의 시간을 거쳐 30세 전후에 만개한 선수들은 프로스포츠의 큰 활력이 된다. 하지만 유독 프로농구에서만큼은 새로운 스타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2009∼2010시즌. “과연 농구에서는 김상현과 같은 사례가 불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부산 KT의 전창진 감독조차도 “종목 특성상 쉽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2010∼2011시즌. 프로농구에서는 ‘최초의 신화’가 코트를 휩쓸었다. 그리고 박상오(30·KT)는 21일 한국농구연맹(KBL)이 발표한 기자단 투표결과 MVP로 선정되며, 성공스토리 1막의 화려한 마침표를 찍었다. ‘대기만성’ 박상오의 MVP 수상은 한 개인의 영광에 그치지 않는다. 음지에서 땀을 흘리는 수많은 선수들의 희망임과 동시에, 새로운 간판스타들을 통해 도약을 노리는 한국프로농구의 모멘텀이다.우여곡절 많았던 중앙대 시절
프로에서도 그냥 힘좋은 선수
전창진감독 만나 인생의 전기
막농구에 팀플레이 불어 넣자
평균 14.9점 ‘우승 주역’ 변신
● 코트와 영원히 작별할 뻔한 사연
광신정보산업고 재학시절까지만 해도 에이스 대접을 받았다. 농구명문 중앙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당시 중앙대에는 송영진(KT)과 김주성(동부) 등 프로급 빅맨들이 버티고 있었다. 벤치에 있는 시간은 길어졌다 결국 박상오는 ‘욱’하는 마음에 농구부를 뛰쳐나와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을까 싶었죠. 그 땐 어렸으니까….”
‘전투식량병’이 보직이었다. 창고에 짐을 실어 나르는 것이 주 임무. 힘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행정보급관에게도 인기만점. 모든 ‘작업’이 그의 차지였다. 병장 말년에 사고를 쳤을 때, ‘영창행’을 면하게 해준 중대장이 건넨 말은 “2년 동안 중대에 힘쓸 일은 네가 다 했으니…”였다.
전역 이후를 고민하던 때였다. 중앙대 코치가 박상오의 어머니를 통해 농구부 테스트를 권했다. 아들은 농구부를 나올 때 눈물까지 흘렸던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봤다. 아버지와 사별한 후 식당일을 하며 아들을 뒷바라지 했던 어머니였다. 결국 박상오는 다시 몸만들기에 돌입해 중앙대 유니폼을 입었다. 제 발로 나간 선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학교측에서도 꺼림칙한 일이었다. “쫓겨나지 않기 위해” 더 이를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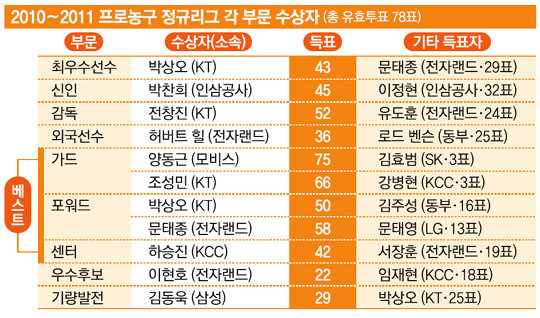
● ‘돌쇠’에서 ‘농구선수’로
2007년 2월. 세 살 어린 후배들과 함께 드래프트에 나갔다. 1라운드 5순위로 꿈에 그리던 프로에 지명됐지만, 2년간은 “힘 좋은 선수”라는 인상만 심었다.
2009년 4월. 박상오의 인생에는 큰 전환점이 마련된다. 바로 전창진 감독의 부임. 전 감독은 ‘홀로 막농구’를 하던 박상오가 팀플레이에 녹아들 수 있도록 조련했다. “영리한 플레이를 펼치지 못할 바에야 아예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며 혹독한 채찍을 휘두르는 방식이었다. 마음의 생채기들은 운동 시간 이후의 스킨십으로 보듬었다. 그렇게 ‘돌쇠’는 ‘농구선수’로 거듭났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54경기에 모두 출전해 평균 14.9점 5.1리바운드를 기록해 KT가 역대 정규경기 시즌 최다승(41승)으로 우승하는 데 큰 힘을 보탰다.
‘쌀가마니, 지게꾼, 무명….’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대충 이런 것들이다. 그래도 박상오는 “모두 마음에 든다”고 했다. 아직도 취재진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하고, 팬들의 박수에 겸손하게 답례하는 선수. 그래서 박상오의 성공스토리는 끝이 아니다. 그는 ‘제2의 박상오’를 꿈꾸는 선수들에게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잘 ‘버티라’”고 조언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사진|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제니, 입에 초 물고 후~30살 되더니 더 과감해졌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6/133169711.3.jpg)
![소유진, ‘방송복귀’ ♥백종원과 투샷 공개…여전한 부부 케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5/133164240.3.jpg)




![서현 협연 논란에 일침…13기 정숙 “대체 뭐가 문제냐” [SD이슈]](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8/133179230.1.png)

![사쿠라, 실크 드레스 입고 우아美 폭발…은근한 볼륨감까지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6/133169543.3.jpg)










![소유, 10kg 감량후 물오른 비키니 자태…찍으면 다 화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16/133172519.1.jpg)




![25살 제니, 욕조→침대까지…파격 포즈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18/133177600.1.jpg)

![소유, 10kg 감량후 물오른 비키니 자태…찍으면 다 화보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16/133172519.1.jpg)




![[사커토픽] 이강인은 ATM, 황희찬은 PSV? 겨울이적시장, 태극전사 거취 변화 가능성](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18/13317856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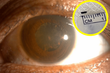




![“무선 고데기는 기내 반입 금지” 인천공항서 뺏긴 사연[알쓸톡]](https://dimg.donga.com/a/110/73/95/1/wps/NEWS/IMAGE/2026/01/16/133171330.2.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