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 고영민은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의 주역으로 활약한 이후 수년간 부진의 늪에 빠졌다. 지난해엔 전력외 선수로 분류되는 설움도 맛봤다. 그러나 원조 2익수는 1군무대로 돌아갈 날을 그리며 구슬땀을 흘린다. 어느덧 서른 살의 베테랑이 된 그는 2014년 부활을 다짐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 두산 고영민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의 주역
슬럼프·부상 이어지며 끝없는 부진
어느덧 고참 대열 오르며 동기부여
“절치부심의 각오로 최선 다하겠다”
프로야구 팬들에게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의 감동은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다. 쿠바와의 결승전 재방송은 지금까지도 케이블 스포츠채널의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다. 결승전 마지막을 장식한 ‘6(유격수)∼4(2루수)∼3(1루수) 더블플레이’는 수없이 리플레이된 장면이다. 당시 이 더블플레이의 연결고리가 된 2루수를 기억하는가. 금메달 확정 아웃카운트를 잡은 어시스트(보살)의 주인공, 바로 두산 고영민(30)이다.
● 끝없는 슬럼프, 사라진 ‘2익수’
당시만 해도 고영민은 24세의 전도유망한 ‘국가대표 2루수’였다. 그의 폭넓은 수비범위를 두고 ‘2익수(2루수+우익수)’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그러나 그에게 태극마크는 2008년이 마지막이었다. 슬럼프와 부상이 이어지면서 끝없는 부진의 터널로 접어들었다. 2010년 10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05(293타수 60안타)에 그친 이후부터는 출장경기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두산은 ‘화수분야구’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선수층이 두꺼운 팀이다. 고영민의 부진은 다른 경쟁 선수들에겐 기회였다. 오재원, 최주환, 허경민 등이 2루수 자리를 대신했다. 지난해에는 아예 ‘전력외’ 선수였다. 고작 10경기 출장에 그쳤을 뿐, 2군에 머무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그렇게 고영민은 잊혀져가는 선수가 됐다. 그는 “2군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팬들이 많은 1군 생활이 그리웠다. 컨디션이 좋아져서 1군에서 연락 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도 연락이 오지 않아 혼자서 좌절하기도 했다. 내 자신에게 화가 많이 났다”고 털어놨다.
● 베테랑, 재기를 꿈꾸다!
긴 슬럼프를 겪는 동안 고영민은 어느덧 서른 살의 베테랑이 됐다. 두산은 이종욱, 손시헌 등의 이적으로 베테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재기를 위한 경쟁과 동시에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그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그는 “그동안 홍성흔, 이종욱, 손시헌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고참의 역할에 대해 많이 보고 배웠다. 선수들에게 격려도 하면서 더욱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고참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재기를 위해 일본 미야자키 스프링캠프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그는 “올 시즌 목표는 하루하루 내 할일을 하는 것이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겠다. 즐겁게 야구하다보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2군에 있는 동안에도 용기를 주신 팬들의 사랑, 그리고 실망한 나를 위해 항상 밝게 대해준 아내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절치부심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재기 의지를 나타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몬스타엑스 체조 찢었다…근본의 셋리로 새 월투 시작 ft.아이엠 삭발 (종합)[DA:리뷰]](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5581.1.jpg)
![보아 ‘25년 동행’ SM 떠난 근황…“잘 지내고 있어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5326.1.jpg)
![르세라핌 시그니처…‘양적 팽창→질적 성장’[현장]](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2880.1.jp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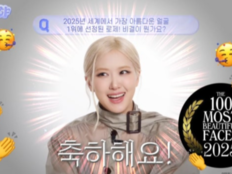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하시4’ 김지민, 김지영 신부 입장에 끝내 오열…“너무 예쁘고 기뻐서” [SD셀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6390.1.pn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