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일성으로 ‘야구 산업화’를 내건 KBO 정운찬 총재가 국내 구단들의 해외 스프링캠프를 둘러보고 미·일 커미셔너와 만나기 위해 ‘외유’에 나선다. 경찰청야구단 폐지와 상무야구단 정원 축소 움직임 등 굵직한 국내현안의 해결이 시급한 터라 우려 섞인 시선도 제기된다. 스포츠동아DB
사람이든 조직이든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한다. 다른 가치가 일치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세상일이 늘 그렇진 못하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것이 유능한 리더다. 반대로 리더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시한다면,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될 것이다. 이는 조직을 퇴보하게 만든다. 시오노 나나미의 표현을 빌리면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 법이다.
KBO는 12일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정운찬 총재가 ‘미국, 일본의 KBO 10개 구단 캠프지를 순회하고, 미국 메이저리그를 비롯한 해외 프로야구 커미셔너와 회동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KBO와 정 총재의 ‘순수한’ 의도를 폄훼할 의도는 없다. 다만 “지금 이 시국에 ‘외유’가 우선이어야 하는가?”라는 야구계의 세평을 들려줄 사람은 적어도 주변에 없는 듯하다.
정 총재는 KBO리그 생태계의 수호자여야 한다. 이미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시그널은 여러 군데서 포착된다. 일례로, 지금 KBO 구단들은 선수들의 경찰청 지원을 막을 수도, 권할 수도 없다. 경찰청야구단이 없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되어가고 있고, 시기만 남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보루인 상무야구단도 정원축소가 원칙적으로 정해졌다. 18명씩 2번에 걸쳐 뽑던 방식을 14명씩으로 줄이면 매년 8명의 자리가 줄어든다.

경찰청 야구단. 사진제공|경찰청
‘국가가 하는 일을 어찌 하겠는가’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정책 결정 때, 조금이라도 야구 쪽에 도움이 되도록 설득하는 것이 KBO의 책무다. 그러나 KBO의 대응은 방치에 가깝다.
정 총재는 지난 9일 7개 분야에 걸쳐 자문위원 10명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은 논외로 치고, 이런 각개격파로 야구계 현안에 실무적 대응이 가능할지, 의구심부터 든다.
더구나 야구 커미셔너의 회동은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다. 정 총재가 메이저리그 커미셔너와 만난다고 ‘말 안 듣던’ KBO 구단들이 고분고분해질 리가 없다. 한 야구인은 “메이저리그 사무국 견학은 총재가 아니라 실무 직원들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이라고 반문했다.
정 총재는 ‘야구 산업화’ 패러다임을 선점했다. 그러나 생각을 현실로 변환하는 과정은 이론 세계처럼 깔끔하지 않다. 마키아벨리의 경구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깔려 있다’.
김영준 스포츠2부 기자 gatzb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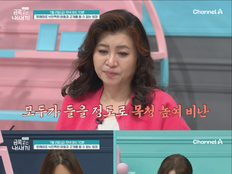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이민정, 딸과 첫 해외여행서 응급 상황…“♥이병헌이 밤새 간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1053.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