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상류사회’의 한 장면. 사진제공|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 ‘상류사회’가 뜨겁다.
영화가 담아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관객이 있는가 하면 작품을 그 자체로 즐기는 관객도 있다. 반면 영화가 명명한 상류사회를 그리는 과정에 등장하는 선정적이면서도 자극적인 설정과 장면에 대한 의견 또한 분분하다. 이래저래 ‘상류사회’를 향한 설왕설래가 활발하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극장에 나선 박해일·수애 주연의 ‘상류사회’(감독 변혁·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여러모로 관객을 자극하고 있다. 작품을 관람하고 끝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갈래로 해석이 확산된다.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반추하게 만드는 여러 에피소드와 인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사 탓이다.
● “재벌들만 겁 없이 사는 거야”
‘상류사회’에 등장하는 몇몇 대사는 그대로 우리의 욕망을 상징한다. 듣다보면 왠지 섬뜩한 기분마저 느끼게 한다. 특히 ‘그들이 사는 세계’로 진입하려고 몸부림치는 주인공 오수연(수애)의 입에서 나오는 대사들은 대부분 그렇다. 노골적이지만 일면 지나치게 솔직하다.
판을 뒤엎을 수 있다고 오판해 ‘재벌만 겁 없이 사는 줄 알아?’라고 묻는 오수연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곧 현실의 절벽 앞에 부딪힌다. 그런 오수연을 향해 “재벌만 겁 없이 사는 거야”라는, 재벌의 일갈은 현실을 비추는 듯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겁 없이 사는’ 재벌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상류사회’ 재벌회장 한용석 역의 윤제문. 사진제공|롯데엔터테인먼트
● “자기가 가진 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돈은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욕망을 실현케 하는 막강한 동력 역시 돈. 도무지 어떻게 그룹 회장이 됐나 싶을 만큼 ‘막장’ 일색인 재벌회장 한용석이 가진 힘도 돈에서 나온다.
그간 한국영화에 등장해 크고 작은 사건을 만들고, 적나라한 상황에도 놓인 숱한 재벌 회장 가운데서 한용석은 차마 보고 싶지 않은 욕망까지도 서슴지 않고 실현하는 적나라한 캐릭터다. 영화이니 망정이지 진짜 그런 인물이 실존한다고 하면, 눈앞에 아찔하다.
다만 ‘상류사회’는 그 한용석 캐릭터를 통해 앞서 ‘하녀’로 시작해 ‘돈의 맛’을 거쳐 ‘내부자들’로 이어지는 ‘그들의 세상’의 명맥을 잇는 역할을 해낸다. 비틀어 은유하는 법 없이, ‘직구’와 같은 묘사가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
● “예술은 똥이야”
‘상류사회’의 한 축은 예술 혹은 예술가들의 세계. 대형 미술관 부관장인 오수연은 나름의 실력으로 그만의 전시를 꾸리길 원하지만, 힘 있고 돈 있는 이들이 그런 기회를 줄 리 만무하다.
스스로 “능력 있는 큐레이터”라고 자부하는 오수연이 그 실력을 인정받은 또 하나의 축은 재벌가의 비자금 마련. 옥션을 통해 그림을 비싼 값에 사들이고 이를 비자금을 만드는 은밀한 거래를 ‘깔끔하게’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현대 예술의 상징인 대형 미술관, 그 안에서 기형적인 생태계를 구성한 이들의 모습은 ‘상류사회’가 보여주는 시대상 가운데 가장 큰 희소성을 갖는다.
재벌과 정치권력의 결탁, 이에 합류하려다 말고 돌아서서 시작하는 복수는 그동안 한국영화에서 익숙히 봐왔던 설정. 반면 미술관과 오수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새로운 세계를 관객에 선사하면서 꽤 신선하게 다가온다. 무엇보다 제 몫 그 이상을 해내면서 극을 이끈 수애의 공이 절대적이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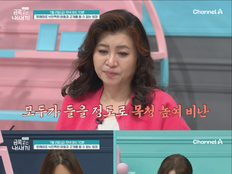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강도에 역고소’ 당한 나나 “무너지지 않고 바로 잡을 것, 걱정 마시라” [전문]](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79222.1.png)

![이민정, 딸과 첫 해외여행서 응급 상황…“♥이병헌이 밤새 간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1053.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트와이스 모모, 티셔츠 터지겠어…건강미 넘치는 바디라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4297.1.jpg)
![레드벨벳 슬기, 아찔한 바디수트…잘록한 허리+깊은 고혹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4151.1.jpg)

![‘정다은♥’ 조우종 새 출발, 9년 인연 끝냈다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0/02/05/99554979.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