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동주(강하늘·왼쪽)와 송몽규(박정민)는 21세 때인 1938년 연희전문학교(연세대)에 나란히 입학해 경성으로 향했다. 문예지 ‘문우’를 펴내며 문학과 글로써 엄혹한 식민의 고통을 이겨내려 했다. 사진제공|메가박스(주)플러스엠
■ 영화 ‘동주’
세상 바꾸는 문학의 힘 믿었던 동주
학업까지 중단하고 폭력 맞선 몽규
항일 방법은 달랐지만 신념은 같아
“인제는 굶을 도리밖게 없엇다”.
부부는 밥 한 끼 온전히 지어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다. 아내는 남편에게 눈물로 궁리를 요구한다. 남편이라고 무슨 요량이 있을까. “결혼할 때 저 먼 외국 가 있는 안해의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온 은술가락”을 떠올린 건 그때였다. 장인은 해외로 망명을 떠난 뒤 “너히가 가정을 이룬 뒤에 이 술로 쌀죽이라도 떠먹으며 굶지 말라”며 은수저를 보내며 “세상 없어도 이것을 없애서 안 되네”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당장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남편은 이라도 “잡혀 쌀, 나무, 고기, 반찬거리”로 연명하고자 한다. 설움에 눈물 흘린 아내는 결국 남편이 은수저와 맞바꾼 쌀로 밥을 짓는다.
“밥은 가마에서 소리를 내며 끓고 잇다. 구수한 밥내음새가 코를 찌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위가 꿈를거림을 느끼며 춤을 삼켯다.”
이 철없는 남편. 먹자며 밥상머리에 대드는데, “앗! 하고 외면하엿다”.
“밥 먹는 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안해의 술가락이 없음을 그때서야 깨달앗던 까닭이다.”

영화 ‘동주’의 한 장면. 사진제공|메가박스(주)플러스엠
● “내면적인 동주, 격정적인 몽규”
1935년 1월1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신인 송한범의 ‘술가락’이란 콩트다. 그해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야기는 가난한 인력거꾼 김첨지의 하루를 그린 현진건의 단편 ‘운수 좋은 날’을 얼핏 떠올리게 한다. 운 좋아 많은 돈을 벌었지만 하필 그날 굶주린 아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김첨지의 비극으로 현실의 고통을 드러냈다. 송한범도 식민의 고통에 신음하며 가난에 헐벗은 이들의 아픔을 반전으로 그려냈다.
송한범, 송몽규의 필명이다. 시인 윤동주와 함께 자라난 동갑내기 죽마고우이자 고종사촌으로 잘 알려진 바로 그이다. 시인의 꿈을 지녔던 윤동주는 18세의 나이로 신춘문예에 당선된 송몽규를 바라보며 부러웠을 터이다. 시를 향한 열망도 더욱 커져갔을 것이다.
두 사람의 성격과 성향은 매우 다르기도 했다.
이들과 중국 북간도 명동에서 함께 자란 고 문익환 목사는 윤동주에 대해 “그를 회상하는 것만으로 언제나 넋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는 아주 고요하게 내면적인 사람이었다”고 돌이켰다. 두 사람과 함께 연희전문학교에서 공부한 뒤 신문기자로 일한 강처중도 “동주는 사교적이지 못함에도 친구들이 많았”고 “산책을 할 때는 사색에 잠겨 있었다”고 말했다.(‘동주야 몽규야’) 반면 송명규는 “다감하고 격정적이었다”고 수필가인 고 안병욱 숭실대 명예교수는 회고했다.(1985년 11월4일 자 매일경제)
그랬기 때문일까. 두 사람은 시대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보폭 역시 달랐다.

영화 ‘동주’의 한 장면. 사진제공|메가박스(주)플러스엠
● “쉽게 씌어지는 시의 부끄러움”
송몽규는 주권 잃은 백성으로서 이를 되찾는 길에 적극 나섰다. 신춘문예에 당선된 그해 4월 학업을 중단하고 중국 난징으로 향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한 차례 투옥된 뒤 일제의 ‘요시찰인물’로 일상을 감시당했다.
그때 윤동주는 1917년 중국 북간도 명동촌 자신의 집에서 불과 3개월 먼저 태어난 송몽규를 “형”이라고 불렀다. 다니던 숭실중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문을 닫고 “친구(문익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자퇴하자 복잡한 심정”으로 “이런 날에는 잃어버린 완고하던 형을 부르고 싶다”(시 ‘이런 날’, ‘동주야 몽규야’ 중에서)고 썼다. 그는 시로써 식민의 절망을 들여다보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어로 시를 쓸 수 없었던, 써서는 안 되었던 시대. 그래서 일본 여성 후카다 쿠미는 그에게 시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다시 영어로 옮겨 영국 출판사를 통해 시집을 내자고 했다. 윤동주는 시집의 제목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지었다.
시인 신경림은 “그의 시에는 유난히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이 많이 나온다”면서 “그 청순하고 개결한 젊음과 함께, 하늘과 바람과 별을 지향하는 밝음과 맑음, 빛의 이미지”를 윤동주 시의 가장 큰 미덕이라 했다. 그럼에도 윤동주는 ‘쉽게 씌워진 시’를 늘 부끄러워했다.
‘窓(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 六疊房(육첩방)은 남의 나라. / 詩人(시인)이란 슬픈 天命(천명)인 줄 알면서도 / 한 줄 詩(시)를 적어 볼가. / … /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 나는 무얼 바라 / 나는 다만, 홀로 沈澱(침전)하는 것일가? / 人生(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詩가 이렇게 쉽게 씨워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 / ….’(시 ‘쉽게 씌워진 詩’, ‘정본 윤동주 전집 원전 연구’)

영화 ‘동주’의 한 장면. 사진제공|메가박스(주)플러스엠
● 식민의 고통…시인과 투사의 운명
그래도 시인은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까닭에 결국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곰 내몰고, / 時代(시대)처럼 올 아츰을 기다리는 最後(최후)의 나. /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 눈물과 慰安(위안)으로 잡는 最初(최초)의 握手(악수).’(위 시)라고 노래했다.
신경림은 “이로써 일제의 강점 하에서는 항일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직된 투사이기에 앞서 시를 쓰는 것을 천직으로 아는 타고난 시인”이었던 윤동주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시인으로 살려니까 항일사상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시인은 그렇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사랑했다. 사촌이자 친구는 또 그렇게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과 시대의 격랑 속으로 뛰어들었다. 시인은 “사람들 마음 속에 살아있는 진설을 드러낼 때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얻는 것”이며 “그 힘이 하나하나 모여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다. 친구는 “그런 힘이 어떻게 모이는가. 그저 세상을 바꿀 용기가 없어 문학 속으로 숨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영화 ‘동주’)
이들의 운명은 한 가지였다. 죽음 앞에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 괴로움을 함께 나눴다. ‘일본 교토 조선인 유학생 사건’으로 1943년 체포돼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나란히 선고받은 이들은 후쿠오카 형무소의 컴컴한 감방에서 숨을 거뒀다. 시인은 그 순간에도 “이런 세상에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다”며 자책했다. 친구는 식민의 폭력에 제대로 맞서지 못해 “안타깝고 한스럽다”고 통탄하며 일제를 비웃었다. 식민의 고통은 이들이 생을 마감한 5∼6개월 뒤 비로소 끝났다. 이들의 나이 28세였다.

영화 ‘동주’의 한 장면. 사진제공|메가박스(주)플러스엠
■ 영화 ‘동주’는?
시인 윤동주와 그의 친구이자 고종사촌형인 송몽규의 이야기. 식민의 고통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맞서고자 했지만 끝내 스러져야 했던 두 사람의 짧지만 치열했던 청춘의 기록이다. 이준익 감독은 강하늘과 박정민을 앞세워 윤동주와 송몽규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흑백화면에 담아냈다. 3·1운동 100주년, 이들을 다시 만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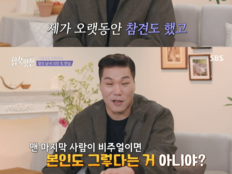






![원어스 전원 전속계약 종료, 이름은 그대로 쓴다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14.1.jpg)

![‘정다은♥’ 조우종 새 출발, 9년 인연 끝냈다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0/02/05/99554979.1.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정다은♥’ 조우종 새 출발, 9년 인연 끝냈다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0/02/05/99554979.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