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어느 가족’. 사진제공|티캐스트
<52> 빅스 엔 - 영화 ‘어느 가족’
그룹 빅스의 엔은 지난 여름 영화 ‘어느 가족’을 관람하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 영화가 올해 5월 열린 제71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을 맡았지만, 엔은 관련 정보를 “일부러 찾아보지 않고” 극장으로 향했다.
엔은 영화가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원제가 ‘만비키(좀도둑) 가족’이라는 자막을 보고 첫 번째 충격을 받았다. 영화는 도쿄의 다 쓰러져가는 목조 주택에서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할머니를 따르는 소녀가 함께 좀도둑을 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다.
그는 “어린 아이가 학교에도 가지 않고 슈퍼에서 도둑질을 하고, 아들이 도둑질을 잘할 수 있게 망을 봐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 어린아이에게 도둑질을 하게 한 걸까 궁금했다”고 말했다.
엔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이라 부르는 이들도 모두 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두 번째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로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한집에서 가족으로 얽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 의해 자신의 일부나 삶을 도둑맞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서 “평범한 가족들과는 달리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로 만들어진 가족의 모습으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빅스 엔. 사진제공|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특히 가족들이 바다로 떠난 휴가 장면에서 할머니가 전하는 묵직한 메시지를 통해 억지스러운 슬픈 감정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영화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는 “누군가를 울리고 싶은 영화가 아닌, 단지 덤덤한 현실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뿐인데도 먹먹하게 가슴을 울렸다”며 “어린 소녀의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디트가 다 올라가도록 한참을 캄캄한 극장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영화를 보고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감독의 인터뷰 기사를 모두 찾아보면서 풀었다. 그는 “가족의 공감과 연대는 때로는 혈육의 정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후 오랜만에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준 영화다. ‘어느 가족’은 가장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작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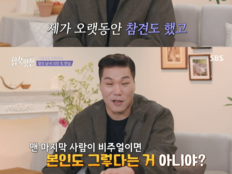






![원어스 전원 전속계약 종료, 이름은 그대로 쓴다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14.1.jpg)

![‘정다은♥’ 조우종 새 출발, 9년 인연 끝냈다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0/02/05/99554979.1.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정다은♥’ 조우종 새 출발, 9년 인연 끝냈다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0/02/05/99554979.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