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 사진제공|FIVB
당분간 우리 배구의 최대 이슈는 여자대표팀과 감독 관련이 될 것이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태국에 져서 동메달에 그쳤던 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참패했다. 선수단은 최선을 다했지만 또 태국에 졌다. 부상 등 운도 따르지 않았다. 44년 만에 2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원인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팬들은 한 사람을 지목한다.
대한배구협회는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대표팀을 전폭적으로 돕겠다면서 전임감독제를 도입했다. 임기는 2022년까지다. 도쿄올림픽 본선출전이라는 중간평가를 놓고 해석의 여지는 있다. 첫 전임감독이 중도 사퇴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해원 감독은 5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에서 “배구인으로서 구차하게 살지는 않겠다”고 했다. 협회는 8일 수뇌부가 참석하는 장시간의 회의 끝에 유경화 여자부 경기력향상위원장과 차해원 감독의 동반사퇴로 들끓는 비난의 여론을 잠재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차해원 감독에게도 명분이 필요하다. “올림픽 본선에 반드시 나갈 수 있다. 그 기회를 달라. 전임감독이 여론에 따라 물러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반발하는 감독은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번 결과에 한국배구연맹과 프로구단도 답답하다. “대표팀이 잘 되어야 프로배구가 산다”면서 대표팀에게 6억원을 지원하고 선수들을 차출시켜준 결과는 허탈감뿐이다. 당장 V리그 개막이 코앞인데 흥행이 걱정이다. 처음 여자부 경기가 분리 독립되는 시즌이다. 여자 대표선수들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신생구단을 창단하려는 계획도 흔들린다.

한국 여자 배구팀. 사진제공|아시아배구연맹
● 대표팀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을까
5월에 새로 시작된 VNL(발리볼 네이션스 리그)부터 시작해 세계선수권대회까지 6개월 동안의 긴 국제배구 시즌에 대표팀을 운영하는 전략이 아쉬웠다.
가뜩이나 인재풀이 모자란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지만 눈앞의 경기마다 모든 힘을 쏟았다. 에이스 김연경의 나이와 체력을 감안했을 때 전력투구할 경기와 포기할 경기를 구분해서 선수를 폭넓게 기용하고 김연경 없는 경기를 통해 다른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 없었다. 또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고정해야 할 주전세터를 놓고서도 감독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반대로 갔다.
감독은 선수들과 스태프를 이끌고 국제대회 시즌동안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가는 선장이다. 배구기술 지도는 다음 문제다. 이번 대표팀은 방향설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내부구성원의 마음을 얻지 못하다보니 한 배에 탄 사람들 사이의 팀워크에 엇박자가 났다. 왜 그 선수를 뽑았는지 이유를 모를 정도로 선수기용의 폭이 좁았다. 아픈데도 억지로 뛴 선수는 선수대로, 제대로 코트에 나가보지도 못한 선수는 선수대로 모두 불만이 쌓였다.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 차해원 감독. 사진제공|대한배구협회
● 선수에 동기부여 못한 감독, 사람관리도 안 된 대표팀
진정한 감독의 역할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다. 오늘 이 경기에서 감독을 위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 대표팀은 아니었다. 배구인들은 “작전타임 때 감독과 선수가 따로 논다”고 지적했다. 선수들의 역할분담과 위계질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탓이었다.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수석코치가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사퇴했다. 당사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걸린 것이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생길 정도로 대표팀의 사람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차해원 감독이 원했던 수석코치를 협회가 거부하면서부터 벌어진 문제점이었다.
이런 것들이 겹치다보니 한국배구에 중요했던 6개월 동안 무엇 하나 이뤄낸 것이 없다. 최소한 다음에는 잘 하겠다는 미래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 대한배구협회와 배구계 어른들은 무엇을 했나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배구인 어느 누구도 대표팀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만큼 대표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 누구도 위험신호를 보내거나 해결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뒤에서 걱정만 하고 흉만 봤다. 협회가 현장의 소리를 잘 듣고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바람에 문제는 더 커졌다.
대한배구협회는 올림픽 다음으로 중요한 대회에 단장조차 파견하지 않았다.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선수들을 다독이고 분위기를 잡아줄 어른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 몇몇은 차기 감독자리를 노린다는 소문마저 나돌았다. 차 감독도 좁은 배구판에서 이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프로구단이 전폭적인 선수지원을 하지 않은 아쉬움도 있다. 그런 엔트리를 꾸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헤아려봐야 한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었기에 코트에서 뛰는 선수들만 더 애처롭게 보였다. 이들은 배구 잘한 죄로 뽑혀서 쉬지도 못하고 고생만 했지만 감사나 칭찬은 고사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귀국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4강이 만든 후광효과는 차츰 사라져간다. 그 때도 배구협회는 정치인 회장과 낙하산 임원 때문에 말들이 많았다. 죽음의 조에 들어 모두가 외면했지만 선수들끼리 똘똘 뭉쳐서 기적을 만들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정다은♥’ 조우종 새 출발, 9년 인연 끝냈다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0/02/05/9955497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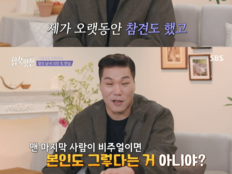



![신지원(조현), 힙업 들이밀며 자랑…레깅스 터지기 일보직전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3865.1.jpg)





![있지 채령, 허리 라인 이렇게 예뻤어? 크롭룩으로 시선 강탈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3831.3.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