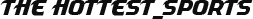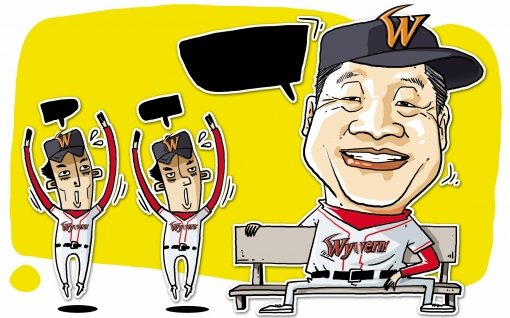
초창기 비활동기간 12월·1월 통째로 쉬어
소집 땐 선수들 살찌고 술에 찌들어 엉망
2007년 김성근감독, 쉼없이 겨울훈련
‘반칙’ 불구 성적 좋자 타구단 따라하기
선수들 개인 생체리듬과 어긋나 부상 위험
1년내내 훈련…가족과 지낼 시간 부족도
1989년이었다. 빙그레 김영덕 감독의 얼굴이 밝아졌다. 루키 송진우가 불펜피칭을 마친 뒤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출전으로 프로 진출이 1년 유보됐다가 빙그레 유니폼을 입은 송진우는 큰 기대를 받던 신인이었다. 그러나 스프링캠프에서 보여준 피칭은 기대 이하였다. 본인은 아직 몸 상태가 정상으로 올라오지 않아서라고 했다. 시범경기에서도 별다른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송진우는 마침내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제 실력을 드러냈다. “이제 됐다”며 김 감독은 흡족해했다. 송진우는 그해 4월 12일 프로 데뷔전에서 롯데를 상대로 6-0 완봉승을 거두며 화려한 전설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요즘 각 구단의 동계훈련과 스프링캠프 시간표와 비교해보면 당시 송진우의 몸 상태나 피칭 스케줄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었다. 21세기 들어 한국프로야구 스프링캠프의 시계는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다.
○프로야구 초창기 스프링캠프의 모습
프로야구 초창기 선수들은 12월과 1월을 통째로 쉬었다. 야구규약으로 정한 비활동기간을 충실히 지켰다. 몸 관리의 중요성을 몰랐다. 2월 1일 훈련이 시작돼도 며칠간은 제대로 된 팀 훈련이 어려웠다. 투수들의 상태가 문제였다. 전력으로 공을 던질 투수가 드물었다. 일본투수들은 2월 1일 캠프 시작과 동시에 불펜에서 100개 이상의 공을 던졌지만, 우리 투수들 특히 에이스급은 3월에야 피칭에 들어갔다. 야수도 마찬가지. 겨울 동안 놀면서 몸에 쌓인 지방과 알코올 성분을 빼내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2월 하순으로 접어들어야 훈련다운 훈련이 가능한 몸 상태가 됐다.
초창기 한국프로야구는 일본프로야구 1.5군과의 연습경기에서 많이 졌다. 지금은 1군과도 대등한 경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훈련 시간표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당시에는 실력차도 있었다. 그러나 시즌과 다름없는 컨디션으로 캠프를 시작한 일본의 1.5군은 아직 진정한 프로를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1군을 압도했다.
○훈련 시간표가 앞당겨진 계기
1991년 연봉상한선 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어졌다. 이때부터 선수들에게 본격적으로 프로의식이 이식됐다. 잘하면 대박을 낼 기회가 생겼다. 선수들의 몸값도 높아졌다. 동계훈련이 더욱 중요해졌다. 구단은 겨울의 땀이 시즌 성적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비공식적으로 선수들을 도왔다. 자율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선수들을 따뜻한 곳으로 보냈다. LG는 투수들을 괌으로 먼저 보내 몸을 만들게 한 뒤 야수와 합동으로 캠프를 시작하는 패턴을 완성했다. 아직 선수들이 자비를 들여 해외에서 몸을 관리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 과도기의 상태로 구단들이 경쟁했다.
결정적으로 한국프로야구 스프링캠프의 시계를 앞당긴 사람은 김성근 감독이다. 2007년 SK 사령탑을 맡자마자 선수단을 이끌고 마무리훈련과 전지훈련을 쉼 없이 실시했다. 그 지옥훈련의 결과는 성적으로 나타났다. 다른 구단들은 ‘SK의 반칙’이라고 지적했지만, 결국 모두 따라갔다. 역시 훈련은 선수 개개인에게 맡겨두는 것보다는 합동으로 진행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었다.
○초반 전력질주를 원하는 한국프로야구
한국프로야구는 시즌 초반에 팀의 운명을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대 페넌트레이스 성적을 보면 초반 스타트가 시즌 성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82년 이후 최초로 시즌 10승을 달성한 팀 가운데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사례는 4차례였다. 1986년 롯데(5위·이하 최종순위), 1988년 OB(5위), 1990년 롯데(6위), 2006년 SK(6위)였다. 최초로 시즌 20승을 거둔 팀 가운데 4강에 탈락한 사례는 1999년 LG(6위)와 2012년 넥센(6위)이었다.
가을에 대역전 드라마를 쓰는 사례가 적은 이유가 있다. 우리 프로야구는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시즌의 3분의 2를 소화한다. 전반기에 승패의 차가 많으면 후반기에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팀들의 견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일찌감치 앞서가는 팀은 견제대상에서 빼고 하위팀을 집중 공략한다. 약점을 보인 팀에는 집중적으로 에이스를 투입해 승수를 챙기고 4강에서 떨어트린다. 투수 로테이션의 영향도 있다. 시즌 동안 투수들을 무리해서 쓰다보니 시즌 막판에 뒤집을 힘도 없다. 그래서 한국프로야구는 4∼5월 성적이 대부분 시즌의 운명을 결정한다.
○빠르다고 다 좋을까?
선수마다 생체시계가 있다. 프로에 데뷔하기 전까지 10년 이상 자신만의 사이클에 맞춰 움직여온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선수들의 생체시계를 급격히 변화시키면 탈이 난다. 특히 신인들은 초반에 코칭스태프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하기에 무리하다 덜컥 부상을 당하곤 한다. 토너먼트대회에 익숙했던 신인의 몸을 장기 레이스에 적합한 상태로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1996년 선동열이 주니치에서 뛰던 때다. 후반기 개막 3연전 때 카도쿠라(전 SK·삼성)가 등판했다. 그해 주니치의 1차지명 신인이었던 카도쿠라는 요미우리를 상대로 완투승을 거두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렇게 위력적인 신인이 왜 후반기에서야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까. 당시 주니치 구단 관계자는 “그동안 유망한 신인들이 입단 첫해에 욕심을 내다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받아 팀 전력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기대주들은 전반기 2군에 두고 충분히 준비시킨 뒤 후반기에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1년 내내 경기와 훈련에 매달리다 보니 선수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위기상황에 몰린 가족도 많다. 갈수록 바빠지는 프로야구의 그늘이다.
전문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imjongk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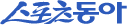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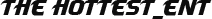
![이다인父 무죄 판결 뒤집히자 ♥이승기 측 “가족 건드리지 말길” [전문]](https://dimg.donga.com/a/298/198/95/1/wps/SPORTS/IMAGE/2023/11/01/12197248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