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올댓시네마
“효주가 참 딱하잖아요. 자존심도 세고, 열등감도 센데 가진 것은 없고. 무능력한 남자친구도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싶어하고. ‘재하’(이원근 분)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어디 기댈 곳도 없고 인생의 희로애락도 없고요. 연민이 느껴졌다고 할까, 그래서 ‘효주’를 하고 싶었나 봐요.”
배우 김하늘은 영화 ‘여교사’ 시나리오를 보며 몇 번을 덮고 다시 읽었다. 글을 읽다 감정이 확 상해버릴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겨우 겨우 마지막 장을 다 읽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를 해보고 싶다’.
‘여교사’는 비정규직 교사 효주(김하늘 분)가 재단 이사장 딸 혜영(유인영 분)이 들어오면서 그로 인한 분노와 질투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김하늘이 연기하는 효주는 만년 작가 지망생인 남자친구를 10년이나 내조하고 학생에게 “선생도 아닌 게”라는 말을 들어도 꾸역꾸역 참아야 하는 계약직 교사다. 그러다 “자신이 학교 후배”라며 다가오는 혜영을 질투하고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재하(이원근 분)를 뺏으려 한다.
●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도 났지만 화면 속 내 모습 보며 기분 좋았다”
김하늘에게 ‘여교사’는 욕심이 나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캐릭터라 욕심이 났다”는 김하늘은 ‘여교사’를 촬영하며 희열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모니터 속 자신의 모습을 보는 그는 더없이 신선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장면 중에 학생이 효주한테 ‘선생도 아닌 게’라고 말하잖아요. 시나리오를 보면서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진짜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닌데 촬영하면서 모멸감이 느껴져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화면 속 나를 보니 기분은 또 좋더라고요. 힘든 데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김하늘은 ‘효주’라는 캐릭터를 습자지처럼 빨아들였다. 그래서 눈빛 하나, 표정 하나 그리고 몸짓 하나 까지도 신경을 썼다. 특히 효주가 사랑했던 재하가 “선생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며 조롱하고 덮쳤을 때 클로즈업이 된 효주의 눈빛을 신경을 많이 썼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질투, 욕심 등 모든 감정에 휘몰아친 효주는 아마 그때 제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수치심도 느꼈을 거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도 했겠죠. 그제야 현실을 알았지만, 그 현실이 더 지옥같았을 것 같아요. 그 연기를 할 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여교사’라는 제목도 물어봤다. 많은 이들이 제목과 예고편만 보면 ‘사제간의 치정극’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김하늘은 “솔직히, 촬영을 할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다”라며 “그래서 그런 거부감이 있어 보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걱정이 된다”라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사진제공=올댓시네마
● “소극적이었던 어린 시절, 배우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해”
세상사는 모든 이들이 각자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를 한다. 그런데 배우라는 직업은 대중에게 노출돼있어 누구보다 비교 당하기가 쉽고 이로 인한 열등감과 좌절감도 생기기 마련이다. 의외로 김하늘은 “배우 생활을 하면서, 그런 감정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지, ‘꿍’하게 감춰 두진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소극적이었던 어린 시절에는 제 안에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 줄 모른 채 안에만 감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이성이 확고해졌을 때는 질투나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부족한가?’라고 생각하며 노력을 하려고 해요. 물론 이 직업을 가지고 자존심을 상할 때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어렸을 적 김하늘은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사람들에게 배우가 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금방 그만 둘 것이라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그는 “연기를 하면서 차츰 성격이 변하더라, 아니 변해야 하더라”고 말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직업인데 살아남으려면 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연기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 있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마치 누가 떠밀어서 억지로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영화 촬영장을 가는데 흥얼거리더라고요. 같이 가던 매니저도 ‘네가 그러는 거 처음이야’ 라며 깜짝 놀랐어요. 그 때 제가 진짜 이 일을 좋아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연기 보는 것도 좋고요.”

사진제공=올댓시네마
● “올해로 21년차 배우, 앙탈 부리면 안 될 때”
그렇게 연기 생활을 한지 어느덧 21년차가 됐다. 필모그래피를 쌓은 만큼 배우로서 책임감과 욕심이 점점 늘어났고 도전하고 싶은 장르도 늘었다. “~하옵니다”라는 말투를 꼭 써보고 싶다며 사극에 대한 의욕도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에 츄리닝·슬리퍼 차림으로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역할도 해보고 싶단다.
그는 “만약 제가 흥행에 목말라했다면, 흥행 성적이 좋았던 로맨틱코미디를 선택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배우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다른 것을 더 해보고 싶고 색다른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예전에는 감정이 힘든 작품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밝은 작품을 선택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니 그 감정마저도 괜찮아지더라. 나름 성장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하늘에게 대한민국의 여배우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도 물어봤다.
“이제, 저는 앙탈을 부리면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저는 늘 당시 대중적인 소재 속에 등장을 하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 가끔 ‘내가 이런 작품도 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작품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지금 영화 시장을 보면 남자 배우들이 대거 포진돼서 확실히 예전보다 들어오는 시나리오는 줄었어요. 같은 배우로서 남자 배우들 부럽죠. 특히, VIP 시사회 초청을 가면 남자 배우들이 10명씩 나란히 서서 인사를 하는데 부럽더라고요. 우리 여배우들도 저렇게 쭉 서서 인사하는 영화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속보] 김제동, 참지 못하고 결단 “돈 부족했는데…”](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6/11/11/81288274.1.jpg)







![에이핑크 오하영, 바닥에 누워 도발 포즈…아찔한 섹시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9/133122911.3.jpg)
![YG 떠난 악뮤, 혹독한 훈련 중…이수현 결국 ‘눈물’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9/133122499.3.jpg)

![“나는 사람이 그리워”…혜리, 결국 못 참고 눈물 [종합]](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9/133128376.1.jpg)






![박은영 전 아나운서, 오늘(9일) 둘째 딸 출산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9/133126059.1.jpg)
![아시아 목소리 대결…‘베일드 컵’, 월드컵 꿈꾸는 글로벌 오디션 (종합) [DA:현장]](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9/133125833.3.jpg)
![황정음, 기획사 등록 오해 풀었다…“착오 있었다” [SD이슈]](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9/13312597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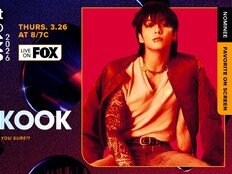

![효민, 손수건 한장만 달랑? 파격 비키니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08/133114676.1.jpg)
![‘문원♥’ 신지, 결혼 앞두고 미모 난리나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07/133113419.1.jpg)



![쯔위, 파격 패션…티셔츠 위에 속옷을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9/133127949.1.jpg)
![신봉선, 여배우래도 믿겠어…11kg감량 후 완벽 옆태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9/133123280.3.jpg)

![에이핑크 오하영, 바닥에 누워 도발 포즈…아찔한 섹시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9/133122911.3.jpg)



![선풍기 아줌마 얼굴서 ‘공업용 실리콘→콩기름’ 4kg 나와 (꼬꼬무)[TV종합]](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09/133122139.1.jpg)
![쯔위, 파격 패션…티셔츠 위에 속옷을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09/133127949.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