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진 입술, 그러나… 한국대표팀 지도자들은 세계 각국의 영입대상 1순위이다. 강도인 감독과 박명환 코치, 김성주 코치 등 세계최고의 지도자들과 함께 한 하루. 공을 던질 때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결과는 뒤를 돌아 눈을 마주치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전영희 기자는 투구 이후 고개를 묻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09/08/25/22502851.2.jpg)
다부진 입술, 그러나… 한국대표팀 지도자들은 세계 각국의 영입대상 1순위이다. 강도인 감독과 박명환 코치, 김성주 코치 등 세계최고의 지도자들과 함께 한 하루. 공을 던질 때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결과는 뒤를 돌아 눈을 마주치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전영희 기자는 투구 이후 고개를 묻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끝난 2009세계여자볼링선수권대회. 한국은 2인조와 5인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홈에서 무너진 ‘볼링 종주국’ 미국의 충격은 컸다. 6명 전원을 프로선수로 내보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국에게 번번이 막혔다. 미국볼링 관계자들과 언론은 “한국선수들은 마치 로봇 같은 볼링을 구사했다”고 극찬했다.
5일 귀국한 대표팀은 휴식 후 17일 재소집됐다.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인도어게임과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동아시아게임 대표 선발전을 위해서다. 끊임없는 경쟁체제로 세계정상을 지키고 있는 볼링대표팀을 찾았다. 과연 로봇볼링이란 무엇일까.
○ 볼링이 정적인 스포츠라는 것은 편견
보통 운동기술을 분류할 때, 농구의 자유투처럼 환경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을 폐쇄기술이라고 한다. 반면, 야구의 타격처럼 가변성에 대해 끊임없이 대처해야하는 것은 개방기술이다. 체육과학연구원(KISS)에서 볼링을 담당하는 신정택(스포츠심리학전공) 박사는 “정지된 핀에 공을 때리는 볼링을 흔히 폐쇄기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개방기술에 가깝다”고 했다.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대경볼링장. 대표팀 강도인(대한볼링협회부회장) 감독은 “볼링을 배우려면, 볼링이 정적인 스포츠라는 편견부터 깨야 한다”고 했다. 볼링의 변화무쌍함은 레인의 상태에서 나온다. 파울라인부터 핀까지의 거리는 고작 60피트(약18m). 하지만 그 사이는 오일 숲으로 가로막혀 있다. 보통 파울라인부터 30-35피트 지점까지 오일이 칠해진 레인은 쇼트코스. 36-40피트까지가 미디엄. 41-45피트까지는 롱 코스라고 부른다. 오일은 레인의 양쪽 홈(거터)보다 레인 가운데에 더 두껍게 칠해져있다.
○ 오일의 바다를 헤쳐 봐야 진짜 애버리지
볼링공은 회전력이 있어야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는 입사각이 확보되고, 파워가 나온다. 하지만 오일지역을 지나는 공은 회전력이 떨어진다. 죽었던 회전은 마른 바닥을 지날 때 다시 살아난다. 선수들은 깊이가 다른 오일의 바다를 옮겨 다니며 헤엄쳐야 한다. 5인조의 경우, 쇼트와 롱에서 각각 3경기씩을 치른 뒤 합산으로 승부를 가린다.
강 감독은 “똑같은 레인이라도 관중이 많거나(열기) 에어컨을 틀면(냉기) 오일이 빨리 마르고, 습기가 많은 날은 오일이 잘 마르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앞 선수가 던진 공의 궤적이 오일 상태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선수들은 보통 오일을 헤치며 자신이 스트라이크를 잘 낼 수 있는 ‘길’을 찾는다. 그래서 경기 중 다른 팀 선수의 ‘길’을 일부러 망쳐 놓는 일도 부지기수다.
여자대표팀 박명환 코치는 “동호인 가운데 애버리지가 200이라는 분도 있지만 한 레인에서 ‘터널을 뚫어’ 치기 때문”이라면서 “레인을 옮겨가면서 치면 급격히 (점수가) 떨어진다”고 했다. 최소한 정비 상태가 다른 레인 100군데에서 쳐봐야 진정한 애버리지가 나온다.
선수들은 레인 상태에 따라 최적의 공을 선택한다. 한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은 최대 6개. 일반적으로 롱 코스에서는 표면이 약하고 무른 볼을 쓴다. 박명환 코치는 “고무공이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다. 마찰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일의 방해에도 회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감독이 5인조에서 교체 선수를 쓸 때, 회전력이 좋은 선수를 롱 코스에 배치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상선약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오전 내내 이론 강의. 근질근질한 몸을 드디어 쓸 기회가 왔다. “저도 예쁜 공으로 하고 싶은데….” 선수들의 공은 형형색색. 지구, 목성, 금성. 태양계의 축소판이다. 하지만, 초심자에게 주어진 공은 투박한 달 표면 같은 하우스 볼. 조선주(대구체육회)의 공에 손가락을 한 번 넣어보려다 눈칫밥을 먹었다. 선수들에게 공은 애인과 같다. 자기 공에 남이 손을 대는 것을 싫어하는 선수가 많다.
보통 볼링장에 가면, 스텝부터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만 박명환 코치는 스윙부터 가르쳤다. “공을 잘 운반하려고 스텝을 취하는 것인데, 스텝에 공을 맞추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했다. 어떤 운동이든 힘이 많이 들어가면 정확도가 떨어지게 마련. 백스윙을 높여 공의 위치에너지를 확보한 뒤, 공의 무게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공을 레인위에 내려놓아야 한다. “일단, 볼링공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놓으세요.”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원리다.
○15피트 밖은 쳐다보지도 마라
폭 1m의 레인위에 섰다. 레인은 2.5cm로 가늘고 긴 보드 39개를 붙여서 만든다. 18m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것은 처음. 박 코치는 “15피트(약4.5m) 밖은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 파울라인부터 핀 사이의 정확히 4분의 1지점에는 스폿이 있다. 이 스폿은 45피트 뒤 핀들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다. 2009여자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 홍수연(서울시설공단)은 “선수들도 스폿을 보고 던진다”고 했다.
만약, 파울라인 중앙에서 보드 한 개 폭(2.5cm)만큼 오른쪽 옆으로 서서 스폿의 정 중앙을 겨냥한다고 가정하자. 18m를 이동한 공은 1번 핀(중앙)에서 왼쪽 옆으로 7.5cm 벗어난 지점에 안착한다. 보드 한 개 폭의 오차가 1:3의 비례에 따라 보드 세 개 폭으로 커진 것. 이 계산법을 이용하면 스페어 처리 시에도 스폿만을 보고 공을 굴릴 수 있다.
○정교함은 기본. 욕심을 제어해야 로봇 볼러
기본강의 끝. 신보현(한체대)과 짝을 이뤄 계민영(텔룩스) 이연지(곡성군청) 조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선수들이 쓰는 공은 약 15-16파운드(약7kg). 하루 종일 공과 씨름하다 보니 선수들의 오른손(오른손잡이)은 울퉁불퉁 거칠다. 강현진은 “여자선수들은 손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하다”고 했다. 그 콤플렉스는 왼손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난다. 왼손은 빛나는 반지에 팔찌 등으로 호사를 누리고 있었다.
볼링이라고는 술내기 몇 번 쳐본 것이 전부. 하지만 못난 오른손은 딱 10년 구력선수의 것이다. 박 코치는 “딱, 100점을 잡아 주겠다”고 했다. 아이스크림 내기인데도 군말이 없는 것을 보니, 선수들도 적절한 핸디캡이라고 생각한 모양. 어차피 선수들에게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했다.
![대표선발전을 준비 중인 선수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연지(곡성군청), 강현진(충북도청), 조선주(대구체육회), 홍수연(서울시설공단), 전영희 기자, 계민영(텔룩스), 신보현(한체대).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09/08/25/22502905.2.jpg)
대표선발전을 준비 중인 선수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연지(곡성군청), 강현진(충북도청), 조선주(대구체육회), 홍수연(서울시설공단), 전영희 기자, 계민영(텔룩스), 신보현(한체대).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레인파악도, 구질 선택도 없다. 그저 스폿의 정중앙만 바라볼 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초반4개 중 3개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이러다 정말 200점치겠는데요?” 선수들의 말에 어깨가 으쓱. 순간 볼링이 마인드 스포츠라는 사실을 잊었다. 실제로 경기 중 지나가는 한 마디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선수도 있다.
점수에 욕심을 내니 힘이 들어가고, 스폿보다는 핀이 먼저 보였다. “절대, 핀 쪽은 쳐다보지도 말라니까요!” 박 코치의 호통소리.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핀에 대한 애정 어린 눈길이 짙어지면 짙어 질수록, 핀은 내 마음을 외면했다. 때로는 아예 핀을 만나지도 못하고 거터 속으로 쳐 박히기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랑하는 에우리디케를 잃은 오르페우스가 된 꼴이었다.
결국 점수는 100점 남짓. 다행히 270점을 기록한 신보현의 분전 덕에 승리했지만 이긴 기분이 아니었다.
앞서나가지 말 것. 유혹에 흔들리지 말 것. 단순히 정교했기에 ‘로봇’이라고 불린 것은 아니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욕심. 그것을 제어해 냈기에 그녀들은 ‘로봇 볼러’가 될 수 있었다.
대구|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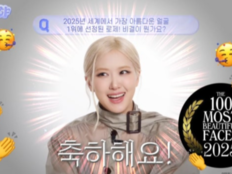
![보아 ‘25년 동행’ SM 떠난 근황…“잘 지내고 있어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5326.1.jpg)
![르세라핌 시그니처…‘양적 팽창→질적 성장’[현장]](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2880.1.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몬스타엑스 체조 찢었다…근본의 셋리로 새 월투 시작 ft.아이엠 삭발 (종합)[DA:리뷰]](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5581.1.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하시4’ 김지민, 김지영 신부 입장에 끝내 오열…“너무 예쁘고 기뻐서” [SD셀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6390.1.pn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