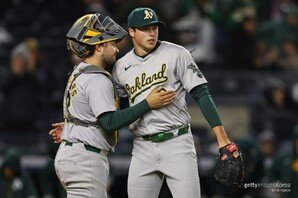1985년 2월 국내프로야구팀으로는 최초로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메이저리그를 경험한 삼성은 그해 가을 전·후기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당시만 해도 메이저리그는 한국야구에 문화적 충격이었다. 위쪽 사진은 김영덕 감독, 고 장효조, 김일융. 스포츠동아DB
ML 다저스와 제휴…미국서 첫 전지훈련
다저타운 화려한 시설·선진 시스템에 주눅
첫 친선경기 등판 김시진 사구 연발 화제도
번트시프트 등 기술 습득…그 해 통합우승
2012한국시리즈 우승이 결정되던 날 삼성 류중일 감독은 책 한 권을 얘기했다. 다저 웨이(Dodger Way)라는 책. SK와의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결정해준 번트시프트와 페이크번트&슬래시를 언급한 뒤였다. 1985년 삼성 라이온스가 최초로 미국 본토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가져온 책이었다. 프로야구 창설 3년 만에 메이저리그를 만난 삼성은 야구의 천국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문명의 충돌이었다. 그 때의 기억을 되돌아봤다.
○1985년 2월 28일 미국행 비행기를 타다!
멀고 먼 길이었다.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플로리다주 베로비치. 선수들은 장거리 비행에 녹초가 됐다. 비행기 통로에 누워 잠을 자면서 갔다. 2월 플로리다의 날씨는 좋았다. 다저타운은 4개의 경기장과 8개의 배팅훈련장, 웨이트트레이닝장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호텔 수준의 숙박시설과 극장, 클럽하우스, 당구장, 수영장, 테니스 및 농구코트도 구비했다. 지금 봐도 훌륭한 시설이지만, 그 당시 삼성 선수들은 화려한 시설에 먼저 주눅이 들었다. 선진야구를 체험하기 위한 미국행은 1982년 10월 피터 오말리 LA 다저스 구단주가 이건희 삼성 구단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한 기술제휴에 따라 진행됐다. 1984년 롯데와의 한국시리즈에서 패해 우승을 놓쳤던 김영덕 삼성 감독의 각오는 남달랐다. 엄청난 훈련을 통해 반드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전지훈련지로 베로비치를 생각했다.
○시행착오의 시작…감독과 매니저, 그리고 모기
첫 문명의 충돌은 훈련이었다. 다저스는 처음 방문한 한국프로야구팀을 위해 예의를 갖췄다. 파견 나온 레드 애덤스(투수), 레오 포사다(타격), 치코 페르난데스(수비), 모리 윌스(주루) 코치들은 전설적 존재였다. 고등학생에게 대학 교수를 붙여준 격이었다. 토미 라소다 감독도 훈련장을 찾았다. 지도방법은 달랐다. 실전용보다는 기본적 기술부터 가르쳤다. “왜?”라는 질문을 유도했다. 코치가 얘기하면 선수가 무조건 따르는 훈련이 아니었다. 의문이 생기면 선수가 이해할 때까지 토론했다.
훈련시간도 짧았다. 양보다 질을 따지는 메이저리그식 훈련. 김영덕 감독은 그 훈련이 양에 차지 않았다. 불만이 많았다. 라소다 감독은 자신과 함께 카트를 타고 훈련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김 감독은 거부했다. 라소다 감독은 그런 김 감독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스프링캠프는 경기를 위한 재미있는 준비였지만 우리는 힘든 노동이었다. 김 감독은 야간훈련도 시켰다. 다저스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김 감독의 고집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훈련장에 조명을 켜고 삼성 선수들이 모였다. 야간훈련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저스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곧 밝혀졌다. 조명을 보고 날아온 모기를 비롯한 날벌레 때문에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유니폼과 땀복을 뚫고 물어대는 모기는 정말 지독했다.
통역도 문제였다. 영어가 능통한 동포들은 많았지만, 야구용어를 몰랐다. 고(故) 김종원 홍보팀장 등이 나서야 했다. 용어에 얽힌 에피소드 하나. 다저스가 선수들의 방을 배정할 때였다. 당시 김종만 매니저의 방을 가장 큰 것으로 줬다. 2명의 김 씨 성을 가진 매니저. 감독도 매니저, 주무도 매니저였던 것이다. 헷갈렸다. 김종만 매니저는 이후 자신을 ‘머니맨’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그는 훈련비로 쓸 현찰을 007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선수시절 류중일 감독. 스포츠동아DB
○1985년 삼성이 경험한 14일간의 신세계
다저스 인스트럭터가 알려준 야구는 지금까지의 야구와 전혀 달랐다. 기본에서 시작하지만, 선수들의 창의력을 요구했다. ‘다저 웨이’의 저자 알 캄파니스 부사장은 야구 전반, 라소다 감독은 팀 운영, 모리 윌스 코치는 주루와 도루에 대해 강의했다. 다저스는 삼성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새로운 야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고서도 만들었다. 다저스가 삼성에 건네준 이 평가서는 나중에 삼성 야구단 선수운영의 기본이 됐다. 다저스는 일본프로야구 출신의 김일융, 송일수에게는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처음 코치가 된 수비담당 천보성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 선수들은 2주간의 훈련이지만 알찬 기술을 배웠다. 베이스러닝에서 괄목상대했다. 1962년 메이저리그 최초로 한 시즌 100도루를 돌파한 모리 윌스의 지도는 큰 힘이 됐다.
1985시즌 삼성은 2사 1·3루서 롱리드 더블스틸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안타 없이 점수를 뽑았다. 올해 한국시리즈의 키워드가 된 번트시프트도 그때 완성했다. 릴레이, 커트플레이, 런다운, 픽오프플레이 등 기본에 바탕을 둔 기술야구를 상대팀은 당해내지 못했다.
○첫 메이저리그와의 경기, 김시진이 화제에 오르다!
삼성은 3월 9일 홀먼스타디움에서 유료관중을 입장시키고 다저스와 첫 친선경기를 펼쳤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서종철, 메이저리그(MLB) 피터 위버로스 커미셔너가 역사적 경기의 시구를 했다. 경기의 비중을 고려해 에이스 김시진이 나왔다. 이날 김시진은 지역신문을 통해 크게 이름을 알린 플레이를 했다. 잘 던진 것이 아니었다. 2회 다저스 주포 페드로 게레로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혀버렸다. 3루 관중석으로 공이 날아갈 정도였다. 라소다 감독을 비롯한 다저스 관계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 게레로는 놀란 라이언, 호아킨 안두하에게 머리를 맞은 적이 있었기에 더욱 난리였다. 긴장이 지나쳤던 김시진은 주전포수 마이크 소시아의 무릎도 맞힐 뻔했다. 김시진은 또 다른 타자에게 사구를 던진 뒤 3점홈런을 맞았다. 하필이면 베테랑 투수 제리 리우스였다.
삼성 타자들의 타구는 내야를 벗어나지 않았다. 타격 3관왕 이만수도 ‘타격천재’라는 고(故) 장효조도 마찬가지였다. 메이저리거가 사용하던 공을 처음 만져본 삼성 선수들은 “우리 공에 비해 물렁해서 거리가 안나간다”고 말했다. 그때 우리 타자들은 몰랐다. 삼성 타자들을 무력화시킨 것은 스피드가 아니라 무브먼트였다. 점수차가 벌어지자 다저스는 마이너리거들을 올렸다. 롭 로웬이 4개의 4구를 연속해서 내줬지만 삼성의 도루 실패로 점수를 내지 못했다. 최종스코어는 7-0 다저스 승리. 삼성은 이후에도 마이너리그 혼성팀과 2차례 더 경기를 했다. 4-0, 7-5로 졌다. 통산 200승 투수 리우스는 첫 경기 뒤 “삼성 선수들의 수준이 더블A 정도냐”는 현지 매스컴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더블A에 있어본 것이 17∼18년 전이어서 나보다는 인스트럭터가 더 잘 알 것 같다.”
○첫 문명의 충돌 이후
김영덕 감독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원위치로 돌아왔다. 삼성은 1985년 사상 최초로 전후기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77승1무32패, 승률 0.706의 성적이었다. ‘다저 웨이’는 훗날 주간야구에서 ‘다저스 전법’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연재됐다. 삼성은 1988년 또 한번 다저타운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제사정을 이유로 계획은 취소됐고, 일본 노베오카로 갔다. 이후 어느 팀도 베로비치를 찾지 않았다. 2012년 다저스는 한국프로야구팀 한화 이글스 류현진에게 280억원의 포스팅 금액을 안기며 유니폼을 입히려고 한다.
전문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imjongk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