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았던 트레이드
롯데와의 이별은 2001년 시작됐다. 마해영은 프로야구선수협회 주축 멤버로 활동하다 삼성으로 트레이드됐다. 그 때 맞바꾼 선수가 지금은 돌고돌아 함께 뛰고 있는 김주찬이다. “일부 팬들은 제가 원해서 팀을 옮긴 거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하지만 저로서도 가슴 아픈 트레이드였어요. 그 때 주장을 맡고 있었으니 ‘설마’ 싶었는데, 결국 짐을 싸라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스포츠신문에 나온 기록표를 볼 때면 자신도 모르게 롯데 선수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고 있었다. “내가 롯데 선수가 아니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죠. 게다가 팀이 3년 연속 최하위를 하는 걸 보면서 마음도 아팠어요. 어디서든 늘 롯데가 잘 되기 만을 바랐거든요.” 2004년 삼성에서 FA(프리에이전트)가 됐을 때도 ‘혹시 다시 불러줄까’ 싶어 부산에 머물렀다는 마해영. 하지만 기다리던 전화는 오지 않았고, 그는 또다시 낯선 KIA 유니폼을 입었다.
●‘천덕꾸러기’ 생활, 그 종착역은 롯데
이후 4년이 그에게는 암흑기였다. 야구하면서 처음으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세대교체’라는 명분 앞에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마해영이었다. 특히 KIA에서 트레이드 형식을 통해 LG로 옮긴 뒤 생활은 상처투성이였다. 2006년 10월의 ‘방출 예고’ 해프닝 후에도 1군 11경기, 2군 10경기에 출전한 게 전부였다.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 베테랑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상황이 아쉽기만 했다. “저만큼 야구한 사람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다른 선수들은 어떻겠어요. 야구 선배들이 후배를 존중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막상 방출된 후에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은퇴하기엔 아직 힘도 남아있고 몸 상태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열정이 너무 컸다. 1980년 8월 17일. 야구를 처음 시작한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그다. 대만 리그, 일본 2군, 미국 마이너리그까지 알아봤다. 그리고 나서 왕년의 톱스타에게 돌아온 롯데 입단 테스트 기회. “뛸 수만 있다면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꿈에 그리던 부산에 그렇게 돌아왔다.
●내 갈 길은 야구, 마지막 유니폼은 롯데
부산은 그가 나고 자란 고향이다. 그리고 야구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 묻어있는 곳이다. 부산 대연 초등학교 시절, 유격수 마해영은 부산 시장이 주는 초등학생 타격상을 받았다. 1년간 타율이 5할4푼5리였다. 이 때 대학생 타격왕이 바로 롯데 한문연 코치. 시상식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인연이 한솥밥으로 이어졌다.
롯데 입단 후 1년도 꿈만 같았다. 입단하면서 받은 2억원(계약금 1억8000만원·연봉 2000만원)은 형편이 어려웠던 마해영에게 상상도 못할 거액이었다. 최동원∼박동희에 이어 롯데 사상 세 번째로 입단 기자회견을 가졌고, 데뷔와 동시에 4번타자를 꿰찼다. 프로 첫 안타를 때려낸 상대는 당대 최고의 스타 선동열. 그 때 롯데 홈관중은 100만명을 돌파했다.
마해영은 그 시절의 영광이 여전히 생생한 듯 했다. 올해도 꼭 그 때의 감동을 느껴보고 싶다고 했다. “출정식 때 (박)현승이가 그러더군요. ‘은퇴하기 전에 꼭 우승 반지를 끼고 싶다’고. 제 심정도 똑같아요. 여기서, 부산에서 꼭 우승하고 싶어요.”
‘마포종점’은 ‘부산’이라는 듬직한 선언이기도 하다. “다시 돌아오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는 정말 롯데 유니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까지, 몸 관리 잘해서, 좋은 모습 꼭 보여드리고 은퇴하고 싶습니다.” 마해영이 활짝 웃었다.
부산=배영은 기자 yeb@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돌싱’ 린, 유혈 사태…고강도 키스 퍼포먼스에 ‘당황’ (현역가왕3)
‘돌싱’ 린, 유혈 사태…고강도 키스 퍼포먼스에 ‘당황’ (현역가왕3) 클유아, ‘판사 이한영’ OST 첫 주자 ‘폭발적 에너지’
클유아, ‘판사 이한영’ OST 첫 주자 ‘폭발적 에너지’ “난 행복해” 박유천, 마약 투약→은퇴 번복 후 日서 근황 공개
“난 행복해” 박유천, 마약 투약→은퇴 번복 후 日서 근황 공개 유지태, 무려 5000억을…슈퍼노트 유통 플랜 본격 가동 (빌런즈)
유지태, 무려 5000억을…슈퍼노트 유통 플랜 본격 가동 (빌런즈) ‘내돈내힘 히어로’ 이준호, ‘K-히어로’의 새로운 획 (캐셔로)
‘내돈내힘 히어로’ 이준호, ‘K-히어로’의 새로운 획 (캐셔로) 박수홍·명세빈 충격…동물 배설물 흙탕물, 케냐 식수 현실
박수홍·명세빈 충격…동물 배설물 흙탕물, 케냐 식수 현실 윤미라, 74세에도 볼륨감 그대로…“살 찌면 엉덩이로 간다”
윤미라, 74세에도 볼륨감 그대로…“살 찌면 엉덩이로 간다”![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 기안84, 유기견 품에 안았다…“새로운 가족 찾아요”
기안84, 유기견 품에 안았다…“새로운 가족 찾아요” NCT 제노·재민 드라마 보러 가야지…‘와인드업’ 16일 공개
NCT 제노·재민 드라마 보러 가야지…‘와인드업’ 16일 공개 ‘원조 쇠맛’ 틴탑, 15주년 피날레 빛났다
‘원조 쇠맛’ 틴탑, 15주년 피날레 빛났다 츄 “십센치 노래로 전국 1위…중학생 때 노래짱”(더 시즌즈)
츄 “십센치 노래로 전국 1위…중학생 때 노래짱”(더 시즌즈) 비, 연예계 논란에 직격 발언…“나태해지니까 사건·사고 나는 것”
비, 연예계 논란에 직격 발언…“나태해지니까 사건·사고 나는 것”![‘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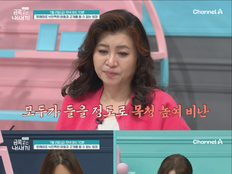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오은영 “단순 버릇 아니다”…초6 금쪽, 가족 모욕에 일침(금쪽같은내새끼)
오은영 “단순 버릇 아니다”…초6 금쪽, 가족 모욕에 일침(금쪽같은내새끼) ‘♥이병헌’ 이민정, 냉장고 공개 “신혼 때 밥 때문에 울어”
‘♥이병헌’ 이민정, 냉장고 공개 “신혼 때 밥 때문에 울어” 정일우, 한복 비주얼 역대급…레전드 화보 나왔다
정일우, 한복 비주얼 역대급…레전드 화보 나왔다 워너원 하성운, 신곡 포토 티저 “강렬하다”
워너원 하성운, 신곡 포토 티저 “강렬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