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인터뷰②] 정인선 “‘검증 안된 주연은 No’ 선례 만들기 싫었다”
MBC 수목드라마 ‘내 뒤에 테리우스’ 캐스팅 기사가 쏟아졌을 때 배우 정인선의 이름은 분명히 이질감을 안겼다. 누군가는 소지섭의 원맨쇼가 될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실패를 말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우려의 기본 전제는 정인선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정인선은 아역 시절은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다작(多作)을 하기 보다 차근차근 연기력을 쌓는데 집중했다. ‘맨몸의 소방관’, ‘액자가 된 소녀’, ‘마녀보감’ 등 그는 분량이나 배역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고 늘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집중했다. 마치 적금을 드는 것처럼.
“저를 고애린으로 살게끔 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검증되지 않은 배우를 써서 망했다는 선례를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어렵고도 힘든 각오를 세웠다. 어떤 배우는 시청률을 두고 ‘하늘의 뜻’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열심히 한다고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에 정인선의 어깨는 그만큼 무거웠다.
“드라마가 시작되고 나서 댓글을 봤는데 어느 분이 ‘나랑 내 남편이 싸우는 줄 알았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걸 읽지마자 두 달간 제 안에 있전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분명히 그 중에 안 좋은 댓글도 있었지만 이번에 깨달은 건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가 어떤 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좋은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인선은 ‘내 뒤에 테리우스’를 일컬어 꿈 같은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지상파 평일 드라마의 첫 주연을 맡아서만은 아니다. 그는 “이렇게 배려를 받아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였다”며 촬영장 분위기를 전했다.
“힘들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때마다 주변에서 제 그릇을 함께 넓혀주시려는 분들이 있었어요. 소지섭 오빠만 해도 더 많이 저에 대해 걱정하고 지적해줘도 되는데 늘 따뜻하게 도와주셨고 많은 분들이 절 웃게 만들려고 해줬어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현장에 있는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인터뷰를 통해 만난 ‘내 뒤에 테리우스’를 끝낸 정인선은 홀가분해 하면서도 마음 속에 고마움을 가득 안은 표정이었다. 촬영장에서 받은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 정도. 이제 정인선은 여기서 얻은 배려와 자신감으로 다음을 준비한다.
“제 목표는 배우로서 얇고 길게 가는 것이었어요. 정말 연기를 좋아하니까 오래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 뒤에 테리우스’ 이후에 그것만 고집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소지섭 오빠께 고민 상담을 했더니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너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라고 본인 경험담도 들려주셨어요.”

결국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을 것인가 아니면 한 템포 쉬고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그런 고민의 와중에도 정인선이 배우로서, 사람으로서 놓치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전 좋은 사람이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어디 하나에 갇히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마음가짐을 꽤 단단하게 다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났으니 이런 생각들을 지속가능한 열정으로 만드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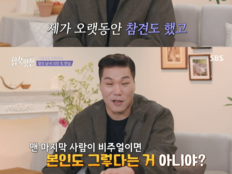



![원어스 전원 전속계약 종료, 이름은 그대로 쓴다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14.1.jpg)



![‘정다은♥’ 조우종 새 출발, 9년 인연 끝냈다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0/02/05/99554979.1.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정다은♥’ 조우종 새 출발, 9년 인연 끝냈다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0/02/05/99554979.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