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카드 김시훈(맨 오른쪽). 스포츠동아DB
잘하는 사람에게는 코트가 즐거운 놀이터지만 누구에게는 가족의 생계가 걸린 일터다. 프로배구 선수로 큰 꿈을 품은 지 벌써 열 번째 시즌. 아직 연봉 1억원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 몇 년은 다음 시즌 선수로 계속 있을지 잘릴지를 걱정하며 지냈다. 두 아이의 아빠 김시훈(우리카드)에게 배구는 가족의 생계가 걸린 직업이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절박했다. 좌절도 많이 했다. 선수생활이 끝날 위기도 많았지만 그래도 버텼다. 힘든 겨울을 수없이 버텨낸 김시훈에게도 마침내 쨍하고 볕들날이 찾아왔다. 처음 수훈선수로 뽑혀 인터뷰도 했다.
26일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진 도드람 2018~2019 V리그 2라운드 우리카드-KB손해보험 경기 뒤였다. 김시훈은 6개의 속공과 5개의 블로킹으로 11득점을 했다. 공격성공률은 85.71%였다. 11득점, 5블로킹은 그의 V리그 개인통산 한 경기 최다였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점수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달랐다.
● 김태진에서 김시훈으로 이름을 바꾼 사연
그는 2009년 11월 신인드래프트를 거쳐 신생팀 우리캐피탈의 선수가 됐다. 창단 팀 우리캐피탈이 2008년부터 2년에 걸쳐 4명씩 우선지명권을 행사할 때였다. 강영준 김현수 김광국이 입단 동기다. 1라운드 4순위로 입단했다.
그 보다 1년 앞서 신영석과 박상하라는 뛰어난 미들블로커가 같은 팀에 들어왔다는 것이 불운이었다. 출전기회가 많지 않았다. 신생팀답게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더 익숙한 생활이 반복됐다. 프로 2년 동안 13득점, 35득점에 그쳤다. 3년차에 107득점을 하며 반짝한 다음에 군에 입대했다. 상무에 있는 동안 승부조작 스캔들이 터졌다. 운 좋게도 그 소용돌이를 피했다. 그보다 더 잘했던 선수들을 제치고 아직까지 배구를 업으로 이어가게 된 이유다.
몸이 자주 아팠다. 주위에서 이런 저런 좋지 않은 일이 터지자 마음도 약해졌다. 사주를 봤다. “이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김태진에서 나라에 도움이 되라는 뜻의 김시훈(是勳)으로 2014년 4월 개명했다. 개명의 덕분인지 2014~2015시즌 개인 시즌 최다인 180득점을 했다.
우리캐피탈은 참으로 기구한 팀이었다. 창단 4년 만에 모기업이 손을 드는 바람에 한동안 KOVO의 관리구단 신세가 됐다. 러시앤캐시의 네이밍스폰서를 거쳐 우리카드가 탄생했다. 형편이 펴지는가 싶었지만 우리카드도 한때 배구단을 포기한다고 했다. 다니던 회사의 운명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태평스럽게 일하는 직장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에이스급 선수들은 다른 팀에 갈 기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에게 팀의 해체는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다.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생계가 걸렸기에 배구는 계속해야 했다.

우리카드 신영철 감독. 스포츠동아DB
● 신영철 감독을 만나 10년 만에 인생의 꽃을 피우다
다행히 배구단을 계속 운영하기로 한 우리카드는 우리캐피탈부터 시작해 많은 감독이 거쳐 갔다. 누구는 그에게 기회를 줬고 누구는 없는 선수로 여겼다. 따지고 보면 모두 자기가 얼마나 팀에 필요한 존재가 되느냐에 달린 일이지만 그것을 아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FA가 됐지만 어디 가서 자랑할만한 계약을 하지도 못했다. 나이가 차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다. 둘째가 태어난 김시훈은 절박했다. 이번 시즌을 앞둔 연봉협상 때였다. 그는 “자존심만 세워달라”고 했다. 자랑스럽게 액수를 말할 처지도 아니었다. 구단은 지난 시즌 거의 출전기회가 없었던 그에게 배려를 했다. 둘째를 생각해서 올려줬다.
시즌을 앞두고 신영철 감독이 새로 부임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고 했다. 대신 변화를 받아들인 선수만 함께 가겠다고 선언했다. 신영철 감독은 디테일에 강했다. 김시훈의 약점인 블로킹 손 모양에 신경을 써서 주문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열심히 그 말을 따랐다. 곁눈질할 여유도 없었다.
한때 그 앞에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가 맨 앞에 있었다. 주전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던 차에 조용히 교만이 찾아왔다. 26일 KB손해보험과의 경기를 앞두고 팀을 A,B로 나눠 훈련할 때 그는 B조였다. 선발로 출전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훈련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였다.
다음날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오직 감독의 지시만을 생각했다. 모든 공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다. 그러자 기회가 왔다. 26일의 인생경기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앞으로 더욱 겸손하게 공을 더 정성껏 대하라는 배구의 신(神)이 준 신호였을 것이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속보] 역시 류현진, 보너스도 역대급 ‘상상초월’](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8/11/27/93044028.1.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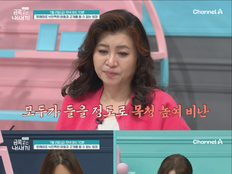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이민정, 딸과 첫 해외여행서 응급 상황…“♥이병헌이 밤새 간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1053.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