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팜트리아일랜드란 이름을 들으면 어쩐지 만화의 한 컷이 떠오른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바다 한 가운데 거북이 등처럼 봉긋이 솟은 섬과 한 가운데 머쓱하게 자라있는 야자수 한 그루. 그 이미지가 참 정겨워 미소가 머금어지고 만다.
조금 일찍 도착했음에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의 로비는 기대감에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지금쯤 배우들은 무슨 생각, 무엇을 하고 있을까.
팜트리아일랜드 소속 일곱 명의 뮤지컬배우들이 총출동하는 무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일정이 맞지 않아 부득이 놓치고 말았기에, ‘이번에는 기어코’하고 분발했다.

김준수
뮤지컬 공연장과 콘서트장의 분위기는 야구장과 축구장만큼이나 다르지만, 어쩐지 반반씩 섞여있는 느낌이다. 뮤지컬배우들이 출연하고, 뮤지컬 넘버를 부르는 콘서트인 것이다. 객석에 앉은 관객들도 이 배합의 미묘한 공기를 기쁜 얼굴로 호흡하고 있었다.
내 마음대로 ‘야자칠성(椰子七星)’이라 이름 붙여 버린 일곱 명의 배우들이 무대에 섰다. 팜트리아일랜드의 대표이기도 한 김준수와 서경수 손준호 진태화가 남자배우, 김소현 정선아 양서윤이 여자배우로 4:3의 구성이다. 양주인 음악감독이 이끄는 ‘야자수오케스트라’가 무대 뒤쪽에 포진했다.

김소현
금요일과 토요일에 공연을 했고, 이날이 ‘막공’. 막공 특유의 냄새가 무대와 객석에 가득했다. 배우들에게선 ‘오늘 다 쏟아붓겠다’는 결연함과 시원함이 기분좋게 전해져 왔다. 마틸다의 ‘어른이 되면(When I grow up)’으로 문을 열어젖힌 콘서트는 데스노트, 지킬앤하이드, 디즈니OST, 엘리자벳, 자유곡의 섹션 위를 질주했다. 위키드, 웨스트사이드스토리, 이프덴, 드라큘라, 물랑루즈의 넘버들이 섹션들을 빵 사이의 햄과 치즈처럼 ‘맛있게’ 연결해 주었다. 이날 배우들이 무대에서 부른 넘버는 34곡에 이른다. “콘서트 악보가 뮤지컬 대작 악보보다 많았다”는 배우들의 말은 거짓도 과장도 아닐 것이다.
뮤지컬 넘버들로 프로그램을 채운 뮤지컬배우들의 갈라 콘서트는 이들이 부르는 넘버를 통해 작품의 한 장면을 되새길 수 있다는 재미가 있다. 작품을 몇 번이나 보았던 사람이라면 이 재미가 몇 배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콘서트가 각별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작품에서 이들의 모습을 언제 다시 보게 될지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마치 역사의 한 장면을 마주하는 기분이었고, 이 순간을 곧바로 냉동시켜 박제실로 가져가버리고 싶었다.

정선아
팜트리아일랜드의 대표 김준수는 과연 ‘야자칠성’ 중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나에게 박하우스의 베토벤 피아노소나타전집이 그렇듯 김준수는 몇몇의 캐릭터에서 첫사랑이자 기준이다. 예를 들어 엘리자벳의 ‘토드’, 데스노트의 ‘엘’이 그렇다. 김준수가 부르는 ‘마지막 춤’, ‘그림자는 길어지고’, ‘게임의 시작’을 듣고 있으면 이 작품들을 처음 보았던 극장의 냄새, 의자의 쿠션, 관객의 숨소리까지 고스란히 재생되고 만다. 김준수가 부른 ‘그림자는 길어지고’ 리프라이즈는 한 달 전까지 나의 스마트폰 벨소리였다.
김준수의 소리는 입체적이다. 마치 무대에서 객석을 향해 거대한 그물을 던지는 것만 같다. 이것은 성량이 아닌, 질감과 형태의 문제다. 다른 이들의 소리가 객석을 향해 레이저처럼 쏘아져 온다면 김준수의 그것은 와락 ‘덮쳐’ 온다.
뮤지컬과 콘서트의 음향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날 김준수의 소리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들렸다. 이는 다른 배우들과의 이중창, 삼중창, 합창에서 더욱 확고했는데, 예를 들어 일곱 배우의 합창은 여섯 개의 살이 달린 거대한 부채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김준수의 소리는 여섯 개의 살이 붙은 종이이자 자루로 기능했다.

손준호
김소현의 ‘나는 나만의 것(엘리자벳)’을 다시 볼 수 있었다니! ‘Once upon a dream(지킬앤하이드)’를 듣고 있자니 몸이 따뜻해져 왔다(세종문화회관의 냉방이 꽤 셌다). 손준호와 부른 ‘All I ask of you(오페라의 유령)’는 이 곡의 교과서. 두 사람은 이 곡을 1000번도 넘게 함께 불렀을 것이다.
정선아의 첫 곡 ‘데스노트’는 원래 남자인 라이토의 넘버. 머릿속이 멍해져 ‘절창’이란 단어 외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다. 정선아의 스타일은 아마도 사라 브라이트만과 마돈나만큼이나 김소현과는 정반대에 놓여 있을 테지만 기울이지 않고 따른 맥주처럼 매력이 넘쳐흘러 당장 눈과 귀를 가져다대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유곡 섹션에서 ‘My strongest Suit(아이다)’를 부를 때는 가슴이 뛰었다. ‘이것으로 충분해, 충분하다고’를 몇 번이나 속으로 삼켜야 했다.

서경수
노래 잘 부르는 배우로 알고 있었지만 서경수의 진면목을 발견한 것도 이날 콘서트의 큰 보람. 서경수와 손준호는 축구장의 능숙하고 다재다능한 윙처럼 부지런히 뛰며 콘서트의 양 사이드를 책임졌다. 서경수의 ‘Hold me in your heart(킹키부츠)’와 손준호의 ‘어떻게 이런 일이(모차르트!)’는 이들의 실력을 환하게 드러낸 넘버들이었다.
진태화와 양서윤을 본 것도 큰 즐거움으로 남았다. 선배들의 벽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반짝반짝 빛을 냈다. 이런 것은 팜트리아일랜드이기에 좀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진태화
배우들은 몇 번이나 ‘가족’을 이야기했다. 팜트리아일랜드라는 섬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안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빛을 내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가 대본의 지문처럼 읽혀졌다.
돌아오는 길. 몇 번이나 다리가 풀려버렸는지 모른다. 광화문 빌딩의 조명이 몹시 휘황해 눈이 부셨다.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귀로부터 전해져 오는 먹먹함이 묘했다. 확실한 것은, 그것은 기분 좋은 느낌이라는 것. 팍팍한 삶을 무르게 만들고, 긴 여행을 다녀와 내 집 침대에 몸을 던지는 순간의 안도감을 주었다는 것.
3시간 30분이란 시간은 이렇게, 많은 것을 변화시켜 놓았다. 공연장에 들어갈 때와 밖에 있는 나는, 같은데 달라져 있었다.
마치 어른이 되어(Whem I grow up). 새로운 인생(A new life)를 만나고, 마침내 사랑에 눈을 뜨게 된, 지금 이 순간처럼.

양서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사진제공 | 팜트리아일랜드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수호 사망 충격…연쇄살인범 아닌 희생양 (힙하게)[TV종합]](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23/09/25/121351745.1.jpg)

![문가영 다 비쳐! 눈 둘 곳 없는 순백의 시스루룩 [DA★]](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23/09/24/121341593.1.jpg)




![이주승 역시나 탈탈 털렸다…카니에 휘둘리다 ‘텅 빈 동공’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6151.1.jpg)


![오정연, 43세 맞아? ‘군살 제로’ 아찔한 건강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5689.1.jpg)

![‘환연2’ 성해은, 20kg 감량 다이어트 비결…절식+폭식도 고백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5722.1.jpg)



![안성재, ‘두바이 딱딱 강정’ 논란 종결 “이젠 ‘안쫀쿠’”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5590.1.jpg)
![김태호 PD가 도파민 대신 ‘마니또’를 택한 이유…“자극보다 진심” [PD를 만나다]](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46895.3.jpg)


![근황 공개는 간보기?…이휘재, ‘불후의 명곡’으로 4년 만 복귀 [DA포커스]](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8510.1.jpg)
![티아라 효민, 초밀착 바디라인 감탄만 ‘보정 필요 없어’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5936.1.jpg)
![장영란, 2년 숨긴 ‘비밀’ 최초 고백…알고보니 새 사업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5569.1.jpg)




![캐나다 行 ‘이휘재♥’ 문정원, 4년 만 근황…“어느새 3월” [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4/133459538.1.jpg)
![문가영, 어깨라인 드러낸 오프숄더…청초 비주얼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786.1.jpg)

![샤라포바, 이탈리아서 뽐낸 수영복 자태…몸매 여전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477.1.jpg)
![이지혜, SNS 규정 위반 경고 받았다…39만 팔로워 어쩌나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11/133344737.1.png)
![“애둘맘 맞아?” 홍영기, 아슬아슬 끈 비키니 입고 뽐낸 몸매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7346.1.jpg)
![이주승 역시나 탈탈 털렸다…카니에 휘둘리다 ‘텅 빈 동공’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6151.1.jpg)
![티아라 효민, 초밀착 바디라인 감탄만 ‘보정 필요 없어’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5936.1.jpg)
![티아라 효민, 초밀착 바디라인 감탄만 ‘보정 필요 없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5936.1.jpg)
![‘54세’ 심은하 근황 깜짝…이렇게 변했다 [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7326.1.jpg)
![“미쳤나”…로버트 할리, 아내에 물 뿌렸다 ‘충격 고백’ [DA클립]](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7406.1.jpg)

![오정연, 43세 맞아? ‘군살 제로’ 아찔한 건강미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568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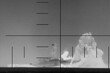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