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을 앞두고 각종 서류를 작성하며 일본 입국 자체를 걱정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귀국일입니다. 체감하기로는 도쿄에서 보낸 3주가 마치 사흘 같습니다.
2020도쿄올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 속에 전례 없는 무관중 대회로 펼쳐졌습니다.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시즈오카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관중을 받지 못했죠. 게다가 도쿄에는 올림픽 기간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가 발령됐습니다. 당연히 입국자들에 대한 조치도 무척 엄격했죠.
외국 취재진에게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했습니다. 입국 후 14일간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상세히 기술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입국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 서류가 승인이 나지 않아 취재진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스포츠동아도 입국 이틀 전 새벽에야 승인이 됐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절반의 성공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니,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입국 이튿날부터 3일째까지는 숙소에서 꼼짝없이 격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격리가 풀리고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각종 행정절차를 마친 뒤에야 현장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찾은 여자양궁 단체전 현장에서 강채영-장민희-안산 선수가 금빛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보니 올림픽을 취재하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안산 선수에게 “이름의 한자가 뫼 산(山)이냐”고 묻고 답변을 받았는데, 곧바로 강채영 선수가 제게 “혹시 진주 강 씨인가요”고 되물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한국의 금메달 6개 중 4개가 확정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개막 초반 대한민국의 메달밭으로 불리는 양궁, 펜싱, 태권도, 유도, 배드민턴 등의 일정이 모두 몰려있어 자연스럽게 현장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첫 해외 올림픽 취재인 데다 코로나19의 특수성까지 겹쳐 두려움도 있었지만, 1주차를 잘 넘기니 그 이후는 동선을 짜는 일도 한결 수월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입국 후 14일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숙소 앞에서 미디어 셔틀버스(TM)를 타고 무조건 터미널(MTM)로 이동한 뒤에야 현장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대중교통으로 30~40분 거리를 2시간 가까이 허비했습니다. 방역택시(TCT)는 예약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서울로 치면, 광화문에서 영등포 또는 송파구로 이동하는데 무조건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야 하는 식이었습니다.
사고도 있었습니다. 귀국을 이틀 앞두고 한국야구가 도미니카공화국과 동메달결정전에서 패한 장면을 보고 돌아왔더니 지갑이 사라진 겁니다. 다행히 현금을 분리해 들고 다녔던 터라 피해는 최소화했지만, 카드 재발급 절차 등을 생각하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제가 갔던 장소들에 모두 전화를 돌려보니 요코하마스타디움 인근 파출소에 분실된 지갑이 들어왔다더군요. 경찰관과 통화를 하다가 “일단 와서 확인하라”는 말에 현장에 갔더니 제 지갑이 맞네요.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중이 들어오지 않는 경기장과 대회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이는 도쿄시민들을 보면 올림픽의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했지만, 엄청난 추억이 됐습니다. 김연경 선수를 앞세운 여자배구대표팀의 일본전과 터키전 승리 현장은 그야말로 환희의 장이었고, 미국-스페인의 남자농구 8강전 취재도 색다른 기억으로 남을 듯합니다. 눈앞에서 케빈 듀란트,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미국프로농구(NBA)의 슈퍼스타들을 언제 또 만나보겠습니까. 비록 와글와글하진 않았지만, 올림픽의 매력은 충분히 느낀 대회였습니다.
귀국 직전 코로나19 검사 결과도 음성입니다. 3년 뒤 파리에선 코로나19가 종식돼 관중들로 가득 찬 경기장을 보고 싶습니다. 굿바이 도쿄!
도쿄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2020도쿄올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 속에 전례 없는 무관중 대회로 펼쳐졌습니다.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시즈오카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관중을 받지 못했죠. 게다가 도쿄에는 올림픽 기간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가 발령됐습니다. 당연히 입국자들에 대한 조치도 무척 엄격했죠.
외국 취재진에게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했습니다. 입국 후 14일간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상세히 기술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입국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 서류가 승인이 나지 않아 취재진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스포츠동아도 입국 이틀 전 새벽에야 승인이 됐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절반의 성공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니,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입국 이튿날부터 3일째까지는 숙소에서 꼼짝없이 격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격리가 풀리고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각종 행정절차를 마친 뒤에야 현장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찾은 여자양궁 단체전 현장에서 강채영-장민희-안산 선수가 금빛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보니 올림픽을 취재하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안산 선수에게 “이름의 한자가 뫼 산(山)이냐”고 묻고 답변을 받았는데, 곧바로 강채영 선수가 제게 “혹시 진주 강 씨인가요”고 되물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한국의 금메달 6개 중 4개가 확정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개막 초반 대한민국의 메달밭으로 불리는 양궁, 펜싱, 태권도, 유도, 배드민턴 등의 일정이 모두 몰려있어 자연스럽게 현장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첫 해외 올림픽 취재인 데다 코로나19의 특수성까지 겹쳐 두려움도 있었지만, 1주차를 잘 넘기니 그 이후는 동선을 짜는 일도 한결 수월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입국 후 14일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숙소 앞에서 미디어 셔틀버스(TM)를 타고 무조건 터미널(MTM)로 이동한 뒤에야 현장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대중교통으로 30~40분 거리를 2시간 가까이 허비했습니다. 방역택시(TCT)는 예약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서울로 치면, 광화문에서 영등포 또는 송파구로 이동하는데 무조건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야 하는 식이었습니다.
사고도 있었습니다. 귀국을 이틀 앞두고 한국야구가 도미니카공화국과 동메달결정전에서 패한 장면을 보고 돌아왔더니 지갑이 사라진 겁니다. 다행히 현금을 분리해 들고 다녔던 터라 피해는 최소화했지만, 카드 재발급 절차 등을 생각하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제가 갔던 장소들에 모두 전화를 돌려보니 요코하마스타디움 인근 파출소에 분실된 지갑이 들어왔다더군요. 경찰관과 통화를 하다가 “일단 와서 확인하라”는 말에 현장에 갔더니 제 지갑이 맞네요.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중이 들어오지 않는 경기장과 대회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이는 도쿄시민들을 보면 올림픽의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했지만, 엄청난 추억이 됐습니다. 김연경 선수를 앞세운 여자배구대표팀의 일본전과 터키전 승리 현장은 그야말로 환희의 장이었고, 미국-스페인의 남자농구 8강전 취재도 색다른 기억으로 남을 듯합니다. 눈앞에서 케빈 듀란트,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미국프로농구(NBA)의 슈퍼스타들을 언제 또 만나보겠습니까. 비록 와글와글하진 않았지만, 올림픽의 매력은 충분히 느낀 대회였습니다.
귀국 직전 코로나19 검사 결과도 음성입니다. 3년 뒤 파리에선 코로나19가 종식돼 관중들로 가득 찬 경기장을 보고 싶습니다. 굿바이 도쿄!
도쿄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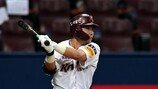
![이민정, 딸과 첫 해외여행서 응급 상황…“♥이병헌이 밤새 간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1053.3.jpg)




![‘강도에 역고소’ 당한 나나 “무너지지 않고 바로 잡을 것, 걱정 마시라” [전문]](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79222.1.pn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정다은♥’ 조우종 새 출발, 9년 인연 끝냈다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0/02/05/99554979.1.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트와이스 모모, 티셔츠 터지겠어…건강미 넘치는 바디라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4297.1.jpg)
![레드벨벳 슬기, 아찔한 바디수트…잘록한 허리+깊은 고혹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4151.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