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부산 아이파크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로 둥지를 옮긴 이장관(34)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현역 생활을 마감했다.
이장관은 6일 인천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일본 J리그 감바 오사카와의 친선전 하프타임 때 은퇴식을 갖고 12년간 정들었던 그라운드를 떠났다.
그는 “축구 선수로 그간 정말 행복했다. 인천에서 현역을 마감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1997년 부산 대우 로얄즈에 입단한 뒤 작년까지 11년간 오직 한 팀을 위해 뛴 이장관은 지난 시즌 중반 구단에서 은퇴를 권유하며 지도자 연수를 제시하자 현역 생활을 연장하기 위해 인천행을 택했다. 당시 “아직 더 뛸 수 있다”고 했던 이장관의 다짐은 불과 6개월만에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왜 그랬을까. 대학팀 코치로 가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김석현 인천 부단장은 “김태수 용인대 감독이 옛 제자 이장관에게 지도자를 권유했다. 우리도 선수가 동의하면 허락하겠다고 했고, 이장관이 먼저 구단에 ‘은퇴하겠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여승철 홍보팀장도 “용인대에 가기로 돼 있어 은퇴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없었다.
특히 대학팀 코치로 가기 위해 은퇴한 것을 두고 한 축구인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부산 구단에서 보장해준 프로팀 코치 자리를 포기하고 인천에 온 선수가 대학팀 코치로 옮긴다는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말 못할 속사정에 포커스를 맞춘 발언이다. 아울러 불과 2분만에 후다닥 해치운 은퇴행사도 ‘팀에 소금같은 선수’를 보내는 자리치고는 너무 초라했다. 어떤 속사정인 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한편, 이날 인천은 오사카와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인천은 이준영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전반 종료 직전 동점골을 내주며 비겨 역대 전적에서 1승1무1패가 됐다.
인천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구교환X문가영 ‘만약에 우리’, 150만 관객 돌파 [DA:박스]](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8/133177536.1.jpg)





![제니, 입에 초 물고 후~30살 되더니 더 과감해졌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6/133169711.3.jpg)



![소유진, ‘방송복귀’ ♥백종원과 투샷 공개…여전한 부부 케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5/133164240.3.jpg)
![사쿠라, 실크 드레스 입고 우아美 폭발…은근한 볼륨감까지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6/133169543.3.jpg)

![소유, 10kg 감량후 물오른 비키니 자태…찍으면 다 화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16/133172519.1.jpg)




![25살 제니, 욕조→침대까지…파격 포즈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18/133177600.1.jpg)

![소유, 10kg 감량후 물오른 비키니 자태…찍으면 다 화보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16/133172519.1.jpg)


![25살 제니, 욕조→침대까지…파격 포즈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18/13317760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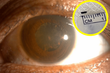




![“무선 고데기는 기내 반입 금지” 인천공항서 뺏긴 사연[알쓸톡]](https://dimg.donga.com/a/110/73/95/1/wps/NEWS/IMAGE/2026/01/16/133171330.2.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