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에게 궁합이 맞는 지도자가 있는 것처럼 감독들에게도 코드가 맞는 팀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제주 유나이티드(전신 부천 SK를 포함) 전임 감독들이었던 최윤겸, 정해성, 알툴 베르날데스(브라질) 등 3명의 대리인을 맡았던 필자는 세 사람 모두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는 바람에 번번이 그 뒤처리(?)를 도맡아야 했다. 이쯤 되면 필자와 제주의 인연도 보통은 넘는 모양이다.
세 지도자 중 최 감독은 1년 만에, 나머지 두 사람은 재계약에 성공한 뒤 중간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팀을 떠났다. 최 감독의 전임인 조윤환, 정해성 감독 이전에 사령탑을 맡았던 하재훈, 트나즈 트르판(터키)까지 포함하면 99년부터 꼭 10년 만에 6명의 감독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같이 중도 퇴진한 셈이다. 제주가 ‘감독들의 무덤’이란 소리를 들을 만도 하다.
조윤환 최윤겸 하재훈 등 과거 유공출신 프랜차이즈 스타들을 30대 나이에 감독에 앉히는 등 파격적인 선택을 마다하지 않은 반면 그 마무리 역시 파격적인 경우가 많았다.
개인적으론 필자가 대리인을 맡았던 세 사람 모두 뛰어난 감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최윤겸 감독은 퇴진 직후인 2002년 말 필자가 주선한 대한축구협회 우수지도자 네덜란드 연수에 손님으로 동행했는데, 칼바람이 부는 겨울 날씨에도 깨알 같은 글씨로 강의내용을 노트에 빼곡히 적고 다니던 기억이 새롭다. 90년대 중반 올림픽팀을 맡았던 비쇼베츠(러시아) 이후 두번째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현재 대표팀에서 2002년 핌 베어벡의 역할을 맡고 있는 정해성 전 감독의 경우 클럽에 비해 본인의 야망이 너무 컸다. 그룹(SK)의 프로축구단 운영의지가 없어 툭하면 매각 운운했던 당시에 그는 우승을 꿈꿨고, 끊임없이 구단의 지원을 호소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그의 열정에 맞는 팀은 제주가 아니라 수원이나 성남, 서울 등이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사람은 알툴 감독이었는데, 수많은 우승기록과 화려한 프로필에 비해 한국의 실정을 너무 몰랐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계약조건이 시즌 내내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차라리 제주처럼 만들어가는 팀이 아니라 완성된 팀이었다면 그가 좀 더 빛났을 것이다.
이처럼 사연 많은 제주의 신임 사령탑으로 17세 대표팀 감독을 지낸 박경훈 씨가 최근 부임했다. 사령탑 경험이 없는 게 약점이긴 해도 구단의 우승의지나 사장을 비롯한 프런트의 지원은 전임 감독들이 부러워할 만큼 개선됐다. 그가 본의 아니게 ‘감독들의 무덤’이 돼버린 제주의 징크스를 깨뜨리고 장수감독으로 우뚝 서게 되길 기대해 본다.
지쎈 사장
스포츠전문지에서 10여 년간 축구기자와 축구팀장을 거쳤다. 현재 이영표 설기현 등 굵직한 선수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중견 에이전트다.
제주 유나이티드(전신 부천 SK를 포함) 전임 감독들이었던 최윤겸, 정해성, 알툴 베르날데스(브라질) 등 3명의 대리인을 맡았던 필자는 세 사람 모두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는 바람에 번번이 그 뒤처리(?)를 도맡아야 했다. 이쯤 되면 필자와 제주의 인연도 보통은 넘는 모양이다.
세 지도자 중 최 감독은 1년 만에, 나머지 두 사람은 재계약에 성공한 뒤 중간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팀을 떠났다. 최 감독의 전임인 조윤환, 정해성 감독 이전에 사령탑을 맡았던 하재훈, 트나즈 트르판(터키)까지 포함하면 99년부터 꼭 10년 만에 6명의 감독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같이 중도 퇴진한 셈이다. 제주가 ‘감독들의 무덤’이란 소리를 들을 만도 하다.
조윤환 최윤겸 하재훈 등 과거 유공출신 프랜차이즈 스타들을 30대 나이에 감독에 앉히는 등 파격적인 선택을 마다하지 않은 반면 그 마무리 역시 파격적인 경우가 많았다.
개인적으론 필자가 대리인을 맡았던 세 사람 모두 뛰어난 감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최윤겸 감독은 퇴진 직후인 2002년 말 필자가 주선한 대한축구협회 우수지도자 네덜란드 연수에 손님으로 동행했는데, 칼바람이 부는 겨울 날씨에도 깨알 같은 글씨로 강의내용을 노트에 빼곡히 적고 다니던 기억이 새롭다. 90년대 중반 올림픽팀을 맡았던 비쇼베츠(러시아) 이후 두번째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현재 대표팀에서 2002년 핌 베어벡의 역할을 맡고 있는 정해성 전 감독의 경우 클럽에 비해 본인의 야망이 너무 컸다. 그룹(SK)의 프로축구단 운영의지가 없어 툭하면 매각 운운했던 당시에 그는 우승을 꿈꿨고, 끊임없이 구단의 지원을 호소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그의 열정에 맞는 팀은 제주가 아니라 수원이나 성남, 서울 등이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사람은 알툴 감독이었는데, 수많은 우승기록과 화려한 프로필에 비해 한국의 실정을 너무 몰랐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계약조건이 시즌 내내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차라리 제주처럼 만들어가는 팀이 아니라 완성된 팀이었다면 그가 좀 더 빛났을 것이다.
이처럼 사연 많은 제주의 신임 사령탑으로 17세 대표팀 감독을 지낸 박경훈 씨가 최근 부임했다. 사령탑 경험이 없는 게 약점이긴 해도 구단의 우승의지나 사장을 비롯한 프런트의 지원은 전임 감독들이 부러워할 만큼 개선됐다. 그가 본의 아니게 ‘감독들의 무덤’이 돼버린 제주의 징크스를 깨뜨리고 장수감독으로 우뚝 서게 되길 기대해 본다.
지쎈 사장
스포츠전문지에서 10여 년간 축구기자와 축구팀장을 거쳤다. 현재 이영표 설기현 등 굵직한 선수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중견 에이전트다.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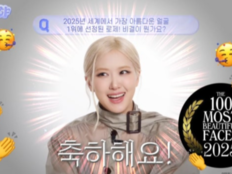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보아 ‘25년 동행’ SM 떠난 근황…“잘 지내고 있어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5326.1.jp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르세라핌 시그니처…‘양적 팽창→질적 성장’[현장]](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2880.1.jpg)
![몬스타엑스 체조 찢었다…근본의 셋리로 새 월투 시작 ft.아이엠 삭발 (종합)[DA:리뷰]](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5581.1.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하시4’ 김지민, 김지영 신부 입장에 끝내 오열…“너무 예쁘고 기뻐서” [SD셀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6390.1.pn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