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찰나의 수심 판단 착오로 우이도 돈목항에 드러누워버린 집단가출호. 바닥이 돌이었거나 바람, 파도가 조금만 더 심했더라면 필경 배가 깨졌을터였다. 좌초한 배를 보며 타들어가는 대원들의 가슴처럼 저녁놀이 불타고 있다.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서쪽, 깊고 아늑한 만(灣)을 이룬 돈목을 겨누고 진입하던 집단가출호의 수심계는 비상사태를 알리고 있었지만 때는 이미 늦어있었다. 심상찮은 느낌에 틸러를 밀어 뱃머리를 돌리려는 순간,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어이없는 좌초. 바람과 물때, 모두 우리 편이 아니었다.
섬의 지형에 교란된 바람은 배를 수심이 더 낮은 쪽으로 밀어붙였고, 썰물은 바람과 반대방향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비상사태다.
배에 있는 밧줄을 몽땅 연결, 100여 미터 떨어진 방파제에 고정시켜 배가 밀리는 것을 막는 한편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2개의 닻을 던졌다.
마을 주민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하면 좌초 위치의 간조 수심은 1미터. 앞으로 물이 더 빠져 배는 더 기울 것이었고, 그걸 막을 방법은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울어진 배 안에서 물건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선실을 정리하는 것 정도였다.

세일링 요트는 배 밑바닥에 크고 무거운 킬(keel)이 달려있어 수심에 특별히 민감하다. 해도에는 전 해역의 수심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해저지형은 퇴적물의 양과 조류에 따라 변한다. 이번 좌초는 최근 몇 년 동안 우이도 서쪽으로 모래 퇴적이 급격히 진행 중인 탓에 생긴 사고였던 것이다. 배가 잘 보이는 방파제 위에 캠프를 설치하는 동안 필자 등 몇 명은 스킨다이빙으로 물 속에 들어가 배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예상대로 바닥이 부드러운 모래층이었다. 최소한 배가 다칠 염려는 던 셈이다.
해가 저물며 바람이 잤고 배는 완전히 누워버렸다. 이제 바람과 파도 없이 밀물이 얌전히 들어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한 좌초선의 선원들은 마음을 비우고 낮에 박영석 대장이 트롤링 낚시로 잡은 삼치와 조피볼락을 모닥불에 구웠다. 일찌감치 뜬 보름달이 와불(臥佛)처럼 바다에 누워있는 집단가출호에 교교한 월광을 뿌렸다.

이 수역은 조류가 거세 출항할 때 밀물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달려봐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걸음이다. 만조가 새벽 3시여서 목요일 저녁에 일찌감치 서울을 출발해 다음날 새벽 3시 출항할 수 있었다.
게다가 육로상의 거리도 멀어 항해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하면 항상 새벽 2~3시가 되니 일수로 꼬박 5일을 소비하게 된다.

곧이어 아침햇살이 퍼지며 섬과 바다를 온통 금빛으로 물들였다.
프로 골프 선수인 아들 성우 군과 동행한 8000미터의 사나이 박영석은 흑산도가 멀리 보일 무렵 서둘러 낚시 준비를 시작했다.
“두고 봐요. 오늘 점심은 회덮밥을 먹게 될테니…”
그러나 웬걸. 박대장의 낚싯대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조용했다. 회덮밥은 커녕 첫날부터 라면으로 점심을 떼운 박대장은 흑산도에 도착하자마자 낚시점을 수소문해 항해중인 배에서 할 수 있는 낚시채비 끄심바리 장비를 구했다. 첫 날의 ‘회덮밥 대신 라면’의 굴욕을 만회하려는 박영석 부자의 오기 탓에 이튿날 우이도로 향한 집단가출호는 어선으로 돌변했다.
야생 서바이벌의 달인 박영석 대장의 재능은 산에서 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통했다. 흑산도 북서쪽 장도 앞에서 회심의 낚시를 드리운 박 대장은 한꺼번에 조피볼락을 3마리씩 꿰어 올리더니 남서풍을 받아 우이도를 향해 달리는 배 위에서 끄심바리로 한창 제철인 삼치를 낚아 올리기 시작했다.

“아빠, 몇 마리 잡을까?”
“내일까지 먹어야하니까 대원 1인당 2마리씩, 스무 마리만 건지자.”
정말로 박 대장 부자는 평균 3분에 한 마리씩 삼치를 잡아 올렸다. 초반에 잡힌 삼치는 박 대장의 익숙한 칼질에 회로 떠졌다. 대원들은 박 대장의 칼질이 끝나자마자 도마 위에서 그대로 게 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회로 먹고 남은 삼치는 저녁 식사 때 쓰기 위해 소금을 뿌려 뱃전에 걸어 말렸다. 말린 생선들은 물론 ‘좌초의 현장’ 우이도에 도착해 깡그리 먹어치웠다. 방파제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와 피운 모닥불에 석쇠구이로 요리된 삼치가 어찌나 맛있었던지 대원들은 눈으로는 좌초한 배를 걱정스레 바라보면서도 젓가락질을 쉬지 못했다.
만조인 새벽 3시경부터 좌초한 배를 구해내는 작전이 벌어졌다. 더 이상 항내 수심을 믿지 못하게 된 터라 닻을 회수하고 방파제로 배를 대는 작업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이뤄졌다. 작전을 성공시킨 뒤 대원들은 다시 잠을 청하기도 뭣해 고무보트 상륙정을 이용해 돈목과 성촌 사이에 형성된 유명한 우이도 사구를 산책하며 해가 뜨길 기다렸다.
대원들이 상륙한 돈목해변부터 우이도 사구까지는 모래와 바람과 파도가 연출한 자연의 갤러리였다. 드넓은 모래밭에 바람이 그려낸 몽환적인 무늬들은 새벽 바다 안개 속에서 더욱 신비로웠다.
되도록 현지 음식 재료를 구입, 직접 요리해 먹는다는 집단가출호의 항해 원칙에 따라 배에 준비된 식량은 비상시에 대비한 장기 보존식품 몇 가지를 제외하면 쌀과 양념류 밖에 없다. 박 대장이 잡은 생선은 이미 동나 이날 점심거리는 하의도 남쪽 8마일쯤에서 만난 어선으로부터 조달했다.

진도를 끼고 목포로 들어가는 중에 제법 강한 바람을 만났다. 섬과 섬 사이에 생성된 골바람 덕분이다. 집단가출호는 다음달 목포~제주간 요트 레이스를 앞둔 상황. 당초 전남도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식 대회였으나 신종플루 확산 우려 때문에 지자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며 개최가 무산된 탓에 동호인들끼리의 친선 레이스로 대체됐다.
강한 바람을 만난 집단가출호는 다음달 레이스를 염두에 두고 온갖 돛을 골고루 활용하며 훈련을 겸해 총알 같은 속도를 냈다. 오후 5시, 사흘 전에 떠났던 목포항 삼학도마리나에 진입했다.
목포~제주 항로는 원래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인데다 다음달 쯤엔 북서계절풍이 시작되어 만만찮은 항해가 될 것이다.
아웃도어 칼럼니스트 송철웅
사진 | 이정식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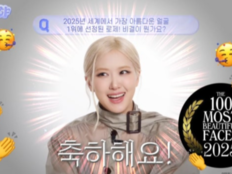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르세라핌 시그니처…‘양적 팽창→질적 성장’[현장]](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2880.1.jpg)


![몬스타엑스 체조 찢었다…근본의 셋리로 새 월투 시작 ft.아이엠 삭발 (종합)[DA:리뷰]](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5581.1.jpg)


![보아 ‘25년 동행’ SM 떠난 근황…“잘 지내고 있어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5326.1.jp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하시4’ 김지민, 김지영 신부 입장에 끝내 오열…“너무 예쁘고 기뻐서” [SD셀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6390.1.pn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