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맥스미디어
● 전라도 천년 (김화성 글·안봉주 사진|맥스미디어)
책 제목이 눈길을 끈다. 전라도 천년이다. 이유가 있다. 올해가 바로 전라도가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전라도 땅에 사람이 산 것이 1000년 되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하지만 이 땅이 ‘전라도’라 처음 불린 것은 1018년 고려 현종 때로 기록에 남아 있다. 전라도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현종이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의 첫 글자를 따 전라도라 하였다는 것이다. 조선팔도에서 두 번째로 생긴 경상도(1314년)보다 무려 300년 가까이 앞선다.
이 책은 전라도 1000년의 기록을 담은 인문서이다. 전라도 출신 저자들의 글과 사진을 통해 지난 천년을 정리하고, 다가올 천년을 노래한다. 전라도 사람들이 ‘징허고 오지게’ 살아온 이야기가 미안할 정도로 쉽게 읽힌다.
책은 총 다섯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전라도의 탄생(파트1)’부터 설움을 이겨낸 역사의 기록인 ‘타오르는 등불(파트2)’, 판소리 추임새의 향연 같은 전라도 말을 다룬 ‘거시기 머시기 아리랑(파트3)’, 일생을 판소리 연구에 바친 ‘판소리의 아버지’ 신재효 이야기 등을 담은 ‘전라도에서 놀다(파트4)’, 전라도뿐만 아니라 변방 중의 변방이던 제주도의 역사와 함께 제주살이의 묘미를 밝힌 ‘오백년 한 지붕 두 가족, 전라도와 제주도(파트5)’까지이다.
전라도 말을 다룬 세 번째 파트는 제목만 봐도 웃음이 난다. 저자는 “전라도 말은 말 사이사이에 리듬이 살아있다”고 전제한다. “긍게 말이여∼”와 “큼메 마시!”로 대표되는 전라도 말은 “글쎄, (그러게) 말이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전라도 말은 이야기꾼에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신바람을 넣어주기에 제격이다. 상대의 말을 때로는 긍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면서 은근슬쩍 자신의 뜻을 담는다. 저자는 “뭐든 딱 부러지게 말 못하는 전라도 사람들의 성정과 닮았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거시기’가 빠질 수 없다. “어이, 나가 마리여, 어저끄 거시기랑 거시기 허다가 거시기 헌티 거시기 혔는디, 걍 거시기 혀부렀소”.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 한 단어를 무한대로 사용한다.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타 지방 사람이 들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전라도 대표언어이다. 이 책에서는 거시기란 단어의 다양한 ‘활용법’을 작가 특유의 재치있는 글로 풀었다.
‘전라도 천년’의 저자 김화성은 1956년 전북 김제 봉남에서 태어났다. 33년간 언론계에서 기자생활을 했고 현재는 대학, 기업연수원, 각종 단체에서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이달의 기자상’, ‘한국편집기자 대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은 축구다’, ‘CEO 히딩크 게임의 지배’, ‘책에 취해 놀다’, ‘음식 인문학 꽃밥’ 등 10여 권의 책을 썼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원어스 전원 전속계약 종료, 이름은 그대로 쓴다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14.1.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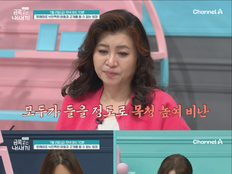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이민정, 딸과 첫 해외여행서 응급 상황…“♥이병헌이 밤새 간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1053.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정다은♥’ 조우종 새 출발, 9년 인연 끝냈다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0/02/05/99554979.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