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송경섭 감독-U-23 대표팀 김학범 감독(오른쪽). 사진|스포츠동아DB·대한축구협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요즘 가장 열 받는 뉴스는 채용 비리다. 금융권이나 공기업에서 터져 나오는, 상상을 초월한 비리를 보고 있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그야말로 실력보다 빽(배경)이 앞서는 불공정한 사회다. 스포츠로 치면 승부조작이다. 승부조작은 범죄행위다. 채용비리도 사회를 좀먹는 범죄다. 이런 폐단이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특혜가 판치는 사회에서 구직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배신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올해 축구계는 채용 비리와는 정반대의 그림이 나왔다. 능력 위주의 감독 선임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학연과 지연이 연결고리가 되던 축구계의 어두운 과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요즘은 많이 깨끗해졌다. 이름값보다는 능력을 앞세운 트렌드가 확실히 눈에 띈다.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선 강원FC 송경섭(47) 감독과 U-23 대표팀 김학범(58) 감독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송 감독은 올 시즌 초반 가장 핫한 지도자다.
지난해 11월까지 그의 보직은 강원의 전력강화팀장이었다. 팀장에서 곧장 사령탑에 오른 깜짝 선임으로 주위에선 우려가 컸다.
그는 프로 무대에서 선수로 뛰긴 했지만 존재감은 없었다. 1996년 수원 삼성에서 2경기를 뛴 게 전부다. 29세에 지도자 교육을 받으면서 일찌감치 진로를 정했다. 이후 단계를 높여가며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최고 단계인 P급 지도자 교육까지 마쳤다.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전임 교육 강사와 U-13, U-16, U-17, U-22 대표팀 코치를 했다. 유명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지도자로서는 능력을 인정받았다. FC서울~전남을 거치면서 프로 무대를 경험했고, 2017년 강원의 전력강화팀장이 됐다.
당초 구단은 스스로 물러난 최윤겸 감독 후임으로 이름값 있는 지도자를 물색했다. 하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다. 결국 구단은 팀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송 팀장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사진제공|강원FC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구단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그의 능력은 성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강원은 인천, 서울, 상주를 꺾으며 3연승이다. 모두 2-1 승리다. 예상을 뒤집는 행보다. 행운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탄탄한 전력으로 연전연승이다.
강원은 지난해와 달리 올 시즌엔 대어급 영입이 없었다. 대신 송 감독을 중심으로 내실을 다졌다. 특정 선수에 의존하는 패턴도 개선됐다. 송 감독의 전술 능력도 돋보인다. 상대에 따른 맞춤형 전술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강원은 상위스플릿 유지는 물론이고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진출권 획득이 목표다. 이 목표는 송 감독의 능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학범 감독은 선수 시절 태극마크와는 거리가 멀었다. 실업팀에서 줄곧 뛰다가 코치까지 했다.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때 러시아 출신의 아나톨리 비쇼베츠 감독 밑에서 선진축구를 배우면서 지도자로서 눈을 떴다. 무엇보다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틈만 나면 유럽이나 남미로 날아가 축구 공부를 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운 게 큰 도움이 됐다. 누구도 만만히 볼 수 없을 정도의 실력도 쌓았다. 차경복 감독 밑에서 코치를 하면서 성남의 3연패(2001~2003년)를 일궈냈고, 감독으로서도 정규리그 우승(2006년)을 경험했다. 그의 지도력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가 U-23 대표팀 감독으로 김 감독을 낙점했을 때 우승 경험과 함께 전술능력과 선수파악 및 장악능력을 높이 샀다. 협회는 이름값 대신 오직 그의 능력만 보고 선택했다. 그런 점에서 김 감독은 김판곤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이 지도자 선발 시스템의 개혁을 시도한 첫 번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김 감독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선발 시스템의 틀이 갖춰지고 발전한다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부천을 상대로 연습경기중인 U-23 대표팀.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기대에 부응해야하는 건 김 감독의 몫이다. 1월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실망감을 안긴 우리 대표팀의 분위기를 바꿔놓기 위해 그는 밤잠을 설친다. 그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분명 어려운 도전이다. 하지만 어렵다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피해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난 이 도전을 결단코 승리로 만들어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아시안게임이 김 감독의 1차 시험대다. 여기에서 성과를 낸다면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갈 수 있다.
과거의 명성보다는 현재의 능력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올바른 사회다. 한국축구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다. 평소 ‘공부하는 지도자’로 소문난 이들 감독들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체육학 박사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속보] 류현진 마지막 모의고사, 결과보니…](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8/03/28/89341439.2.jpg)
![[속보] 추신수, 3경기 연속…예상도 못한 근황](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8/03/20/89182965.1.jpg)
![[스토리 베이스볼] 영어 유창 코치·교사 자격증 감독](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8/03/29/89374579.2.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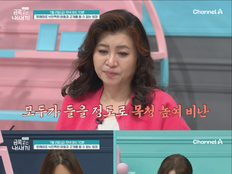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이민정, 딸과 첫 해외여행서 응급 상황…“♥이병헌이 밤새 간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1053.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