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마주치는 사람들은 대개 앞니를 드러내며 환한 미소를 보내준다. “유, 꼬레(당신은 한국인)?” 그리곤 한 마디를 내뱉는다. “깜언(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멋쩍은 표정을 지을 수 밖에 없다. 솔직히 상대의 고마움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찾을 때마다 자주 들어왔던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 물음은 없다. 곧바로 한국인부터 입에 올린다. 베트남과 한국이 한층 가까워졌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즐기는 축구가 양 국을 성큼 다가서게 한 매개체가 됐다.

베트남 축구대표팀. 스포츠동아DB
베트남 축구의 2018년은 대단했다. 더 이상 ‘스포츠 약소국’ 이미지는 없다. 계기가 있다. 박항서(59)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과 23세 이하(U-23) 대표팀의 동반 선전이 연중 내내 계속되면서 편견과 선입관이 보기 좋게 깨졌다.
먼저 스타트를 뗀 것은 U-23 대표팀이다. 1월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예상을 깨고 준우승을 차지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러시아월드컵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여름에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4강 진출로 또 다른 역사를 썼다.
바통은 A대표팀이 물려받았다. U-23 대표팀에서 활약한 다수와 교집합에 있으나 형님들도 동생에 전혀 뒤지지 않는 대단한 성과를 냈다. ‘동남아 월드컵’으로 명명되는 스즈키컵에서 정확히 10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2년 계약을 맺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통합 사령탑으로 부임, 임기 반환점을 돈 박 감독이 입버릇처럼 언급한 스즈키컵을 평정하자 베트남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로 향하는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는 노이바이 국제공항 입국장에는 박 감독의 대형 광고 간판이 걸려있다. 하노이를 찾는 지구촌 식구 모두가 좋든 싫든 박 감독의 얼굴을 먼저 봐야 하는 셈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길거리에서도 박 감독을 향한 현지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베트남과 북한의 평가전을 위해 방문한 하노이 도심에서는 ‘PARK HANG SEO‘의 선명한 문구에 U-23 VIETNAM이라고 적힌 베트남축구협회의 홍보물을 부착한 자가용과 택시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드물게는 작은 태극기를 베트남 국기와 앞 유리에 함께 끼운 채 달리는 차량도 보였다.
규모와 교육 커리큘럼, 강사의 지명도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하노이 등 한국어를 가르치는 베트남의 저명 교육기관들은 즐거운 비명을 내지르고 있다. 오래 전 시작된 한류 아이돌의 영향으로 진작 포화상태였으나 ‘박항서 매직’이 추가된 지금은 향후 수개월 간의 입학생을 추가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호황을 누린단다.
현지에 상당기간 체류 중인 한 한국어 강사는 “어떻게 해서든 박항서와 엮이는 분위기다. 이는 내 의지와 관계없는 일이다. 조금이라도 베트남 축구, 특히 박 감독과 인연이 있으면 그 시간부로 작은 영웅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놀랍게도 여기서 ‘인연’이란 박 감독과 함께 촬영한 휴대폰 사진도 포함된다.
이렇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된 베트남에선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끊이질 않는다. 얼마 전에는 베트남 국적의 CEO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한국인들에게 상품을 무료로 선물한다는 소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회자돼 화제를 낳았다.
부상을 당한 제자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항공기 좌석을 양보하고, 직접 다친 부위를 다정히 마사지해주는 모습이 대변하는 박 감독의 ‘파파 리더십’과 ‘파파 스킨십’은 다양한 광고와 패러디로 계속 소비되고 있고 베트남의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에 박 감독의 발언들이 게재되기도 했다. 심지어 누군가는 베트남 국부로 추앙받는 호치민 주석을 박 감독과 비교하기도 한다. 그만큼 친근하면서도 대단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장면이다.
사업차 베트남을 자주 방문하는 한 국내 기업인도 “AG까지만 해도 ‘한국이 좀더 특별한 국적이 됐구나’ 정도였는데, 지금은 서로 환대해주지 못해 난리도 아니다. 열흘 전쯤 공짜 밥을 제공하겠다는 식당도 경험했다. 물론 돈을 지불했으나 한사코 식당 주인이 고사하는 바람에 애를 먹은 적이 있다”며 웃었다.
박 감독은 베트남으로 향하던 지난해 10월만 해도 굉장히 절박한 처지였다. 환갑을 바라본 나이, 젊은 지도자들을 선호하는 국내 축구계의 풍토로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다음 스텝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다급한 상황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잠시도 한눈을 팔 새가 없는 나머지 오직 베트남 축구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었다. 궁하면 통하고, 진심도 통한다는 세상의 진리가 박 감독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하노이(베트남)|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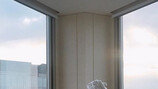



![서강준 ‘MBC 연기대상’ 수상 “간절히 연구하는 배우될 것” [종합]](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1/133067678.1.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계모 살해해 ○○ 담근 패륜아…충격 실화 맞아? (하나부터…)[TV종합]](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4689.1.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임지연, ‘연예인과 불륜’ 등 재벌회장 온갖 비리 폭로 (얄미운 사랑)[TV종합]](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59781.1.jpg)



![있지 채령, 허리 라인 이렇게 예뻤어? 크롭룩으로 시선 강탈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3831.3.jpg)
![신지원(조현), 힙업 들이밀며 자랑…레깅스 터지기 일보직전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3865.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