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집’ 송강호가 이번 영화를 통해 김지운 감독과 5번째로 호흡을 맞춘 것은 물론, 처음으로 감독 역할을 맡으며 색다른 연기에 도전했다. ‘거미집’에서 영화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다고 자부한 그의 자신감이 관객들에게 통할 수 있을까.
송강호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영화 ‘거미집’ 인터뷰를 진행해 기자들과 만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송강호는 인터뷰 시작 전 변희봉의 별세 소식에 대해 입을 떼며 “조금 전에 소식을 들었다. ‘살인의 추억’ ‘괴물’을 같이 했다. 평소에도 자주 뵙진 못했지만 연락을 드리곤 했다”라고 말했다.
또 송강호는 변희봉과의 마지막 추억에 대해 “선생님은 5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을 오셨다. 그때 마지막으로 뵀다. 투병 중인 소식은 봉준호 감독을 통해 들었었다. 너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거미집’의 매력에 대해 “팬데믹을 거치면서 OTT를 비롯해 콘텐츠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풍성하게 접할 수는 있지만, 영화의 매력을 가진 영화가 그리웠다. 또 그런 작품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거미집’이 관객들에게 뭔가 대중적이지만 그래도 영화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기쁘다. 결과는 둘째 문제다”라고 자평했다.
또 송강호는 “캐릭터보다는 이 영화의 장르가 처음이다. 한국영화에서는 이런 영화가 처음이다. 그래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만 보여주면 콩트 같다. 이 영화의 피상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간군상을 통해 결국에는 영화가 끝났을 때, 우리 실제 영화가 끝났을 때 상징은 무엇인가가 참 좋았다. 그게 이 영화만이 가진 강렬한 맛인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또 ‘거미집’의 장르에 대해서는 “괴기스럽지만 종합선물세트 같은 유쾌한 장르라고 생각한다”라고 표현했다.
극중 열등감에 사로잡힌 김감독처럼 송강호도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을까. 송강호는 “열등감은 항상 있다. 좀 잘생기고, 멋진 배우들을 보면 움츠려들고 열등감이 생긴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 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이번 영화에서 감독 역할을 하면서 송강호는 “늘 감독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정서로 했다. 그러다보니 예를 들어 상황에서 어떨 때는 자기에게 주문을 거는 장면도 있고, 그 주문이 상대방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장면도 있었다. 인간의 희로애락이 다 표현되는 것 같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다 묻어있지 않나 싶었다”라고 느낀 바를 표현했다.
또 실제 김지운 감독에게도 그런 지점을 느꼈냐고 묻자 “마지막 결론에서 광기 어리게 ‘잘 찍혔지’라고 한 건 김지운 감독의 ‘놈놈놈’ 현장에서 봤던 것 같다. 그때는 다 광기의 도가니였다. 촬영을 하루 남기고 패닉이 됐었다. 중간에 위험한 장면을 찍었을 때 모든 노력이 그 필름에 담기길 원했는데,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 갈까봐 그랬던 것 같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지운 감독과의 5번째 호흡과 관련해 송강호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집요하면서 진중하고, 영화를 촬영하는 전 단계가 침착하다. 그리고 정말 집요하게 찍는다. 그래서 좋다. 그런 집요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김지운의 스타일과 영화적인 미쟝센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단지 예전 ‘놈놈놈’까지만 해도 지금의 산업적인 시스템과 많이 달랐다. 현장에서 촬영 기간도 길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실험도 있었지만 더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다. 그런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김지운 감독의 열정은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어린 후배부터 경력의 배우들까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던 ‘거미집’. 이에 대해 송강호는 “현장에서도 칭찬을 많이 했다. ‘투’ 수정(임수정, 정수정)뿐만이 아니라. 여빈 씨나 장영남 씨의 재발견이 놀랍지 않았나. 오정세 씨와 워낙 재능이 출중하다. 박정수 선생님도 반가운 얼굴이었다. 모든 배우들이 다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영화를 준비하며 송강호가 가장 고민했던 지점에 대해 묻자 “‘거미집’이라는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앙상블 연기가 빛을 발하려면 뭐가 중요할 것인가, 배우들과의 리듬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엔딩까지 갈 수 있을지 생각했다. ‘거미집’ 자체가 관개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컸다”라고 답했다.
송강호는 이번 영화가 과거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 “최소한 5, 60대 관객들은 알아듣지만, 젊은 관객들은 ‘연기를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흑백과 컬러의 대비를 시킨 것도 일종의 장치라고 생각했다. 흑백이 그 시대의 풍경이자 공기였다. 그런 장치로 쓰였을 것 같다. 그런 식의 소품과 음악들이 두루두루 그 시대를 말해준다.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영화를 통해 느낀 감독의 무게감, 그리고 앞으로 감독 도전의 가능성에 대해 묻자 송강호는 “감독이라는 자리가 영화 속에서 간접적이지만, 직접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느낀 건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거다. 감독으로서의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러기엔 배우도 벅차다. 그래서 애초부터 감독 (도전)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마지막으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올해의 호스트’로 선정된 송강호는 “작은 힘이나마, 비상체제니까 행사도 있어서 먼저 내려가려고 한다. 작년에도 자리를 하기도 했으니까 올해도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얼마든지. 한국 영화계 축제의 장인데 힘이라도 된다면”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개봉하는 ‘거미집’은 1970년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감독(송강호 분)이 검열,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현장에서 촬영을 밀어붙이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는 영화다.
송강호는 처음으로 카메라 뒤의 감독을 연기한다. 기필코 걸작을 만들고 싶은 ‘거미집’의 ‘김감독’은 1970년대 꿈도 예술도 검열당하던 시대, 성공적이었던 데뷔작 이후 계속해서 악평과 조롱에 시달리는 영화감독이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송강호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영화 ‘거미집’ 인터뷰를 진행해 기자들과 만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송강호는 인터뷰 시작 전 변희봉의 별세 소식에 대해 입을 떼며 “조금 전에 소식을 들었다. ‘살인의 추억’ ‘괴물’을 같이 했다. 평소에도 자주 뵙진 못했지만 연락을 드리곤 했다”라고 말했다.
또 송강호는 변희봉과의 마지막 추억에 대해 “선생님은 5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을 오셨다. 그때 마지막으로 뵀다. 투병 중인 소식은 봉준호 감독을 통해 들었었다. 너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거미집’의 매력에 대해 “팬데믹을 거치면서 OTT를 비롯해 콘텐츠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풍성하게 접할 수는 있지만, 영화의 매력을 가진 영화가 그리웠다. 또 그런 작품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거미집’이 관객들에게 뭔가 대중적이지만 그래도 영화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기쁘다. 결과는 둘째 문제다”라고 자평했다.
또 송강호는 “캐릭터보다는 이 영화의 장르가 처음이다. 한국영화에서는 이런 영화가 처음이다. 그래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만 보여주면 콩트 같다. 이 영화의 피상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간군상을 통해 결국에는 영화가 끝났을 때, 우리 실제 영화가 끝났을 때 상징은 무엇인가가 참 좋았다. 그게 이 영화만이 가진 강렬한 맛인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또 ‘거미집’의 장르에 대해서는 “괴기스럽지만 종합선물세트 같은 유쾌한 장르라고 생각한다”라고 표현했다.
극중 열등감에 사로잡힌 김감독처럼 송강호도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을까. 송강호는 “열등감은 항상 있다. 좀 잘생기고, 멋진 배우들을 보면 움츠려들고 열등감이 생긴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 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이번 영화에서 감독 역할을 하면서 송강호는 “늘 감독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정서로 했다. 그러다보니 예를 들어 상황에서 어떨 때는 자기에게 주문을 거는 장면도 있고, 그 주문이 상대방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장면도 있었다. 인간의 희로애락이 다 표현되는 것 같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다 묻어있지 않나 싶었다”라고 느낀 바를 표현했다.
또 실제 김지운 감독에게도 그런 지점을 느꼈냐고 묻자 “마지막 결론에서 광기 어리게 ‘잘 찍혔지’라고 한 건 김지운 감독의 ‘놈놈놈’ 현장에서 봤던 것 같다. 그때는 다 광기의 도가니였다. 촬영을 하루 남기고 패닉이 됐었다. 중간에 위험한 장면을 찍었을 때 모든 노력이 그 필름에 담기길 원했는데,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 갈까봐 그랬던 것 같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지운 감독과의 5번째 호흡과 관련해 송강호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집요하면서 진중하고, 영화를 촬영하는 전 단계가 침착하다. 그리고 정말 집요하게 찍는다. 그래서 좋다. 그런 집요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김지운의 스타일과 영화적인 미쟝센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단지 예전 ‘놈놈놈’까지만 해도 지금의 산업적인 시스템과 많이 달랐다. 현장에서 촬영 기간도 길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실험도 있었지만 더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다. 그런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김지운 감독의 열정은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어린 후배부터 경력의 배우들까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던 ‘거미집’. 이에 대해 송강호는 “현장에서도 칭찬을 많이 했다. ‘투’ 수정(임수정, 정수정)뿐만이 아니라. 여빈 씨나 장영남 씨의 재발견이 놀랍지 않았나. 오정세 씨와 워낙 재능이 출중하다. 박정수 선생님도 반가운 얼굴이었다. 모든 배우들이 다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영화를 준비하며 송강호가 가장 고민했던 지점에 대해 묻자 “‘거미집’이라는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앙상블 연기가 빛을 발하려면 뭐가 중요할 것인가, 배우들과의 리듬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엔딩까지 갈 수 있을지 생각했다. ‘거미집’ 자체가 관개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컸다”라고 답했다.
송강호는 이번 영화가 과거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 “최소한 5, 60대 관객들은 알아듣지만, 젊은 관객들은 ‘연기를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흑백과 컬러의 대비를 시킨 것도 일종의 장치라고 생각했다. 흑백이 그 시대의 풍경이자 공기였다. 그런 장치로 쓰였을 것 같다. 그런 식의 소품과 음악들이 두루두루 그 시대를 말해준다.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영화를 통해 느낀 감독의 무게감, 그리고 앞으로 감독 도전의 가능성에 대해 묻자 송강호는 “감독이라는 자리가 영화 속에서 간접적이지만, 직접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느낀 건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거다. 감독으로서의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러기엔 배우도 벅차다. 그래서 애초부터 감독 (도전)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마지막으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올해의 호스트’로 선정된 송강호는 “작은 힘이나마, 비상체제니까 행사도 있어서 먼저 내려가려고 한다. 작년에도 자리를 하기도 했으니까 올해도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얼마든지. 한국 영화계 축제의 장인데 힘이라도 된다면”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개봉하는 ‘거미집’은 1970년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감독(송강호 분)이 검열,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현장에서 촬영을 밀어붙이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는 영화다.
송강호는 처음으로 카메라 뒤의 감독을 연기한다. 기필코 걸작을 만들고 싶은 ‘거미집’의 ‘김감독’은 1970년대 꿈도 예술도 검열당하던 시대, 성공적이었던 데뷔작 이후 계속해서 악평과 조롱에 시달리는 영화감독이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효심이네’ 출연 중인 노영국,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 [전문]](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23/09/18/121231868.1.jpg)

![송강호, 변희봉 별세 “5년 전 父 장례식 찾아주셔…안타깝다” [DA:인터뷰]](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23/09/18/121234346.1.jpg)







![4년 조용하던 이휘재…갑자기 다시 뜬 이유 [굳이 왜?]](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30.1.jpg)


![‘1세대 톱모델’ 홍진경·이소라, 파리서 ‘본업 모먼트’ 포착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51.1.jpg)
![트와이스 지효, ‘속옷 노출’ 파격 시스루…뒤태 더 아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107.1.jpg)



![[단독] 히말라야 편성 갈등? jtbc “우리와 무관한 행사”](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2616.1.jpg)


![장원영, 블랙 민소매 입고 ‘심쿵’ 셀카…인형이 따로 없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9980.1.jpg)

![기안84, ‘기안장2’ 스태프 150명 사비 선물…미담 터졌다 [SD톡톡]](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769.1.png)


![이지혜, SNS 규정 위반 경고 받았다…39만 팔로워 어쩌나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11/133344737.1.png)
![“애둘맘 맞아?” 홍영기, 아슬아슬 끈 비키니 입고 뽐낸 몸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7346.1.jpg)

![이영애, 인파 뚫고 손미나 응원 갔다…“의리의 여왕” [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39.1.png)
![산다라박 “마약 안 했다”…박봄 글 파장 [굳이 왜?]](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444.1.jpg)


![캐나다 行 ‘이휘재♥’ 문정원, 4년 만 근황…“어느새 3월” [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4/133459538.1.jpg)
![문가영, 어깨라인 드러낸 오프숄더…청초 비주얼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786.1.jpg)

![샤라포바, 이탈리아서 뽐낸 수영복 자태…몸매 여전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477.1.jpg)

![“콧구멍 변해” 백지영, 성형 10억설 고백…정석원 ‘연골 약속♥’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2619.1.jpg)
![이시안 수위 조절 실패…코 성형 구축설+김고은 겹지인 고백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521.1.jpg)
![‘구독자 100만 임박’ 김선태, 영향력 어디까지…사칭 계정 등장 [DA이슈]](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14.3.jpg)
![트와이스 지효, ‘속옷 노출’ 파격 시스루…뒤태 더 아찔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107.1.jpg)
![“미쳤나”…로버트 할리, 아내에 물 뿌렸다 ‘충격 고백’ [DA클립]](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7406.1.jpg)

![‘54세’ 심은하 근황 깜짝…이렇게 변했다 [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732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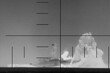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