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읽는 마지막 선비 최익현|이승하 지음|나남
“내 목을 자를지언정 상투는 자를 수 없다.(吾頭可斷此髮不可斷)” “나도 성공하지 못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 500년이 여기서 종지부를 찍으려 하는데 백성들 중 힘을 합쳐 적을 토벌하고 국권을 회복함을 의(義)로 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후손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겠소? 내 나이가 일흔넷이지만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고 싶지 않소이다.” 조선 말 단발령에 대항해 상투를 자르지 않겠다는 상소문을 올리고, 을사조약이 체결돼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자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분연히 일어나 의병을 일으켰던 ‘마지막 선비’ 최익현의 말이다. 흔히 최익현하면 ‘역사 속의 보수 꼴통’이나 고리타분한 유학자, 근대화를 막은 시대착오주의자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좀 더 나은 평가라면 일제에 맞선 의병장 정도다. 크게 틀리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 최익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언컨대 최익현은 역사 속에서 과소평가됐다. 최익현은 평생 초지일관의 삶을 살았다. 한결같았다. 그 어려운 시기에 변절과 변심은커녕 자신의 굳은 신념을 끝까지 지켰다. 그 키워드는 ‘우국충절’이다. 늘 힘없는 백성의 편에 선 양반이었고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유학정신을 끝까지 지킨 ‘진정한 유학자’였다. 고지식하게 고종의 잘못을 지적해 두 번이나 귀향을 갔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의병을 조직해 무력투쟁을 벌였다. 의병활동으로 붙잡혀 대마도로 끌려가자 일본 땅에서 난 쌀로 지은 밥을 먹지 않겠다며 단식투쟁 끝에 죽음을 맞이했다. 저자는 최익현을 10년 가까이 연구했다고 한다. 최익현의 글을 쓰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 “누군가가 ‘우리나라 위인들 중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최익현 선생입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최익현의 삶은 나라보다는 개인, 돈이라면 지조도 자신도 버리는 세태, 권력과 영광 앞에선 초심을 내팽개치는 지식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죽비와 같다.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Culture diary] 이야기하듯 풀어놓은 ‘남한산성의 속살’](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6/05/19/78197079.2.jpg)
![[Culture diary] 불평등의 시대…분배의 경제를 위한 해법은?](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6/05/19/78197062.2.jpg)









![원어스 전원 전속계약 종료, 이름은 그대로 쓴다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1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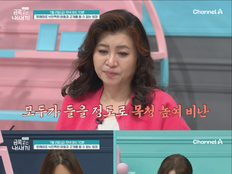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정다은♥’ 조우종 새 출발, 9년 인연 끝냈다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0/02/05/99554979.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