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아카데미의 시스템은 원자재를 추출해 정제한 뒤 최상품을 미국으로 반출하던 과거의 설탕공장과 아주 흡사하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998년 ‘ML의 중남미 파워’에 관한 특집을 통해 카리브해 국가의 핵심 수출품이 사탕수수에서 빅리거로 변화하는 트렌드를 전했다. 10년 전 당시 전체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한 6973명의 선수 중 미국 이외 국적 선수는 36에 달했다. 이 중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등 카리브해, 남미 출신 라틴계 선수 숫자는 2183명이었다. 이 추세는 갈수록 심해져 2005년 829명의 빅리그 등록 선수 중 204명이 라틴계였다. 도미니카공화국 91명, 베네수엘라 46명, 푸에르토리코 34명, 멕시코 18명이었다. 일본 12명, 한국 4명, 대만 1명이었던 아시아를 압도하는 숫자였다.
또 2005년 올스타전 멤버 60인 중 역대 최다인 24명이 라틴계였다. 이 중 절반이 도미니카공화국 한 나라에서 나왔다. MVP 역시 미겔 테하다의 차지였다. 빅리그는 4분의 1이 라틴계지만 마이너리그는 절반 이상이 라틴계 일색이다.
빅리그의 라틴 파워의 원인은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50년 사이 빅리그 구단은 16개에서 30개로 늘어난 반면 야구는 농구·미식축구에 유망주를 빼앗기고 있다. 특히 흑인층이 그렇다.
스콧 보라스 같은 에이전트의 득세로 미국 내 신인 드래프트 계약금은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야구 아카데미의 라틴 유망주와 계약하는 데엔 평균 3만 달러면 족하다. 시즌 인건비도 월봉 700달러면 된다. 도미니카공화국의 1년 연평균 수입이 2000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선수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메이저리그 전 구단이 도미니카에 야구 아카데미를 건설했고, 오마르 미나야 단장이 있는 뉴욕 메츠는 루키리그 팜 중 2개가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에 있다.
무차별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6세 미만 선수들과 계약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놨다. 실제 LA 다저스와 계약한 아드리안 벨트레(현 시애틀)가 이 규정에 저촉돼 문제를 일으켰지만 대세를 꺾진 못했다.
라틴계의 득세에 대해 빅리그 라틴 커넥션의 대부격인 미나야 단장은 “중남미는 메이저리그의 혈액 공급원”이라고 요약했다. 물론 그 성공 확률은 5도 안 되지만 말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구교환X문가영 ‘만약에 우리’, 150만 관객 돌파 [DA:박스]](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8/133177536.1.jpg)




![사쿠라, 실크 드레스 입고 우아美 폭발…은근한 볼륨감까지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6/133169543.3.jpg)




![소유진, ‘방송복귀’ ♥백종원과 투샷 공개…여전한 부부 케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5/133164240.3.jpg)


![제니, 입에 초 물고 후~30살 되더니 더 과감해졌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6/133169711.3.jpg)



![소유, 10kg 감량후 물오른 비키니 자태…찍으면 다 화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16/133172519.1.jpg)




![25살 제니, 욕조→침대까지…파격 포즈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18/133177600.1.jpg)

![소유, 10kg 감량후 물오른 비키니 자태…찍으면 다 화보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16/133172519.1.jpg)


![25살 제니, 욕조→침대까지…파격 포즈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18/13317760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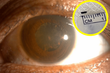




![“무선 고데기는 기내 반입 금지” 인천공항서 뺏긴 사연[알쓸톡]](https://dimg.donga.com/a/110/73/95/1/wps/NEWS/IMAGE/2026/01/16/133171330.2.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