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야구 심판들의 ‘수난시대’다. 연이은 오심으로 심판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오심 해결책으로 비디오판독 도입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심판들의 축 처진 어깨를 세우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많다. 스포츠동아DB
■ ML식 비디오 판독 도입은 어렵다는데…
비디오 판독 도입은 막대한 재원 확보 등 걸림돌
4심 합의 따른 판정 번복…심판들에게도 비상구
대기심이 TV 중계화면 검토 후 시그널 주는 등
우리 환경에 맞는 과도기적 시스템 반드시 필요
프로야구가 연일 오심 문제로 시끄럽다. 프로야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수, 심판, 팬, 언론이 ‘4륜구동’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지만, 지금 한국프로야구는 심판이라는 한쪽 바퀴에 큰 구멍이 나 버렸다. 더 큰 문제는 모든 여론이 구멍 난 한쪽 바퀴의 잘못만을 탓하고 있는 분위기다. 심판 없이 프로야구가 제대로 설 수 없지만, 프로야구의 한 축인 심판은 그야말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오심은 경기의 일부’라는 전통적인 관점과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은 디지털화되고 첨단화된 세상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최근의 야구팬들에게 오심은 그저 ‘야구를 망치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프로야구는 현재 한쪽 바퀴가 무너진 채 살얼음판 위를 달리고 있다.
● 준비되지 않은 비디오 판독 확대
메이저리그는 올해부터 비디오 판독 확대(챌린지 시스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메이저리그 심판이라고 오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30개 구장에 12대씩의 카메라를 설치했고, 인력을 투입했다. 각 팀 감독들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6회 이전 1차례)하면 메이저리그 사무국 본부의 관제센터에서 판단해 해당 경기의 심판에게 판정을 내려주는 시스템이다. 무려 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판정이 번복되면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권이 다시 주어지고, 심판의 판정이 맞으면 요청권이 사라지는 제도다.
한국프로야구는 당장 메이저리그를 따라하기는 힘들다. 아직 준비도 돼 있지 않고, 예산도 부족하다. 예산이 있더라도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일례로 대구구장은 곳곳에 비디오 판독용 카메라를 설치하기조차 힘들만큼 낙후돼 있다. 2016년부터 신축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 확대를 실시하는 시점도 애매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TV중계 화면만으로 비디오 판독 확대를 시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TV중계를 안 하거나, 지연 혹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처럼 경기가 마냥 지연되지 않도록 각 팀의 비디오 판독 요청(챌린지) 횟수는 정해놓고 가야하는데, 판독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방송사 사정으로 판독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더 커진다.
● 과도기 절충점 ‘4심합의제’ 도입 필요
그렇다고 그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비디오 판독 확대를 도입하기까지 선수단과 심판의 합의 하에 절충점을 찾아야한다. 한국만의 ‘챌린지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중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4심합의제’의 도입이다. 현재 야구규칙 9.02(a)에 따르면 페어와 파울, 볼과 스트라이크, 아웃과 세이프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잡혀 있다.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은 심판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남겨두더라도, 나머지는 메이저리그도 비디오 판독을 통해 정정을 하도록 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오심 논란은 역시 아웃과 세이프 판정에 있다.
현재 시스템은 심판이 스스로도 미심쩍은 판정을 내려도 뒤집을 수 없다. 물론 가장 가까이에서 판정을 내린 심판의 판정이 4심합의에 의해 번복된다면 해당 심판은 허수아비처럼 전락할 수도 있지만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오심을 할 수 있다. 프로야구 심판 경력 22년으로 그동안 가장 심판을 잘 보는 심판 중 하나로 평가받던 나광남 심판마저 최근 연이은 오심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금 한국의 심판들은 오심 한번 하면 거의 범죄자로 몰리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4심합의에 따라 아웃과 세이프 판정도 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심판들에게도 하나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 여기에다 당장 메이저리그식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기심을 활용하는 것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판들은 판정에 자신이 없으면 대기심 쪽부터 바라본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기심이 TV중계 화면을 보고 오심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일도 종종 있다.
이럴 바에야 이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감독의 4심합의 판정 요청(경기당 1∼2회 가량)이 들어오면 4심이 합의를 하되, 이 마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대기심에게 TV 화면을 통한 시그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방송사 사정으로 TV중계 화면을 활용할 수 없다면 4심합의를 최종적인 판정으로 하고, 감독도 더 이상 어필을 하지 못하도록 큰 틀에서 합의를 하면 된다. 물론 모든 판정을 4심합의로 할 수는 없고, 가능한 판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이는 메이저리그식 비디오 판독 확대와는 차원이 다르고, TV 중계화면을 통한 판독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한국만의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냉정해야한다. 구멍 난 바퀴의 잘못만을 탓하며 흥분하기보다는 어떻게 구멍 난 바퀴를 보완해 제대로 굴러가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심판 없이는 프로야구가 바로 설 수 없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선수, 심판, 팬, 언론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함께 납득할 수 있는 한국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프로야구를 관장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문가영, 어깨라인 드러낸 오프숄더…청초 비주얼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786.1.jpg)

![에스파 윈터, 슬립 차림 고혹적 분위기…색다른 느낌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6570.1.jpg)
![샤라포바, 이탈리아서 뽐낸 수영복 자태…몸매 여전해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477.1.jpg)


![‘임신 31주’ 나비, 만삭 D라인 화보…아들 배에 귀 ‘뭉클’ [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0984.1.png)
![랄랄 또 성형…심각하게 부은 얼굴에 ‘딸도 기겁’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7659.1.jpg)



![‘임신 18주’ 김지영, 60kg 진입→혼인신고 완료…“옷이 다 작아” [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1408.1.png)
![‘환승연애4’ 백현, 전 여친 박현지 X룸 생수의 진실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7729.1.jpg)
![‘육상계 카리나’ 김민지, 성형설 입 열었다 “저도 이렇게 예뻐질 줄…”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406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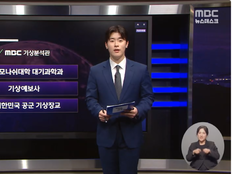
![안정환, 피자집 창업 논란 해명 “기부 목적” [전문]](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3/03/07/118211740.1.jpg)

![샤라포바, 이탈리아서 뽐낸 수영복 자태…몸매 여전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477.1.jpg)
![문가영, 어깨라인 드러낸 오프숄더…청초 비주얼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786.1.jpg)

![이채영, 화끈한 노브라 패션+키스마크…언니 옷 여며요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678.1.jpg)
![‘44kg’ 감량했던 김신영 “돌아왔다” 입 터진 근황 [DA클립]](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1/133442467.1.jpg)

![남지현 촬영장 현실 폭로…“감독님이 ‘못생긴 X’ 이라 불러”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0337.1.png)
![씨스타 다솜, 복근 말도 안 돼…청순미 벗어던지고 과감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8373.1.jpg)
![고아성, 해외 이동 중 폭설에 위급상황 “차 미끄러져 패닉”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8063.1.jpg)


![야구 최고의 국가대항전이 온다…한국, 17년만의 2라운드행 가능할까 [WBC 개막]](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1204.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