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서정.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996애틀랜타올림픽 기계체조 종목별 결선 남자 도마 부문에 출전한 여홍철(경희대 교수)은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기대를 모았다. 알렉세이 네모프(러시아), 비탈리 셰르보(벨라루스), 리샤오샹(중국) 등 당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불리던 체조 스타들과 한 무대에 섰다.
여홍철은 ‘도마의 신’으로 불렸다. 그는 1차시기에서 양손으로 도마를 짚고 2바퀴 반(900도)을 비트는 ‘여2’를 구사했다. 완벽했다. 1차시기 점수는 9.837. 결선에 출전한 8명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2차시기가 아쉬웠다. 착지동작에서 뒤로 크게 밀렸다. 금메달 페이스였지만, 2차시기 점수가 9.567에 그쳤다. 최종 9.756으로 네모프(9.787)에 이어 2위가 됐다.
여홍철은 서럽게 울었다. 결과는 은메달. 세계에서 2번째로 잘했다는 훈장이지만, 당시만 해도 “은메달에 그쳤다”는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나왔을 정도로 금메달에 목을 메는 분위기가 강했기에 서러움은 더했다.
그로부터 25년 뒤. 만 50세의 여홍철은 2명의 딸을 둔 ‘아빠’이자, 후진을 양성하는 교수가 됐다. 그의 둘째 딸 여서정(19·수원시청)은 아버지가 아쉬움에 그토록 서럽게 울었던, 그 종목의 후계자가 됐다. 국가와 지역이 다를 뿐 무대(2020도쿄올림픽)와 종목(기계체조), 기구(도마)까지 모두 같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다. 그 때 딸의 멘탈(정신력)을 돌본 이는 아버지였다.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힘을 북돋웠다.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윗사람이 보낸 장문의 메시지 및 조언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나 같은 무대에 서봤던 아버지의 ‘살아있는 조언’은 딸에게 큰 힘이 됐다. ‘아버지 찬스’의 모범사례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운동하던 체조훈련장에서 기구를 만지며 놀던 딸은 그렇게 성장했다.
딸은 1일 도쿄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도마 결선에서 힘차게 날아올랐다. 1차시기는 완벽했다. 비트는 동작이 2바퀴(720도)인 것만 제외하면, 아버지의 고유기술 ‘여2’처럼 날아올랐다. 본인의 고유기술인 ‘여서정’을 완벽하게 해냈다. 착지 또한 흔들림이 없었다. KBS 해설위원으로 이 경기를 중계하던 아버지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서정이 ‘여서정’을 해낸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착지하는 순간 ‘됐다’고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나 2차시기는 달랐다. 5.4난도의 기술로 안전하게 연기를 펼쳤지만, 착지가 불안했다. 한 발이 뒤로 크게 밀렸다. 중간순위는 3위. 아버지와 함께 중계하던 캐스터는 “이것(불안했던 착지)까지 닮을 필요는 없을 텐데”라며 아버지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다. 뒤이어 연기를 펼친 3명의 선수 모두 여서정의 점수를 넘지 못했다. 최종 결과는 동메달이었다.
경기가 모두 끝난 뒤 아버지처럼 딸도 울었다. 의미는 달랐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딸이 동메달을 확정한 순간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다. 한국여자체조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라는 더할 나위 없는 업적에 대한민국도 열광했다.
“더 열심히 해서 이제는 아빠를 이겨보고 싶어요.” 딸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딸에게도, ‘여서정의 아빠’로 각인되고 싶다는 아버지에게도 2021년 8월 1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였다.
도쿄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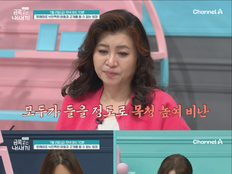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이민정, 딸과 첫 해외여행서 응급 상황…“♥이병헌이 밤새 간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1053.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