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순’으로 생애 최고의 흥행 임순례 감독
《임순례(47) 감독이 7년 만에 연출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한국 영화 침체의 순간’을 날려 버렸다. ‘세 친구’와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수작으로 마니아들의 주목을 받던 그는 이 영화를 계기로 더 많은 대중에게로 다가갔다. 전작에서 남자들의 이야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여자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마이너리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스타일은 여전하다. 실제로 만난 그는 자신의 영화와 똑같았다. 이름도, 외모도 푸근한 그에게 ‘언니!’ 하며 위로받고 싶어질 정도로…. 그에게선 자신의 영화처럼 삶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힘이 느껴졌다.》
―‘흥행 감독’이 된 소감은….
“나는 원래 담담하다. 관객이 들어도 담담, 안 들어도 담담. 의식이 있을 땐 그런데(웃음), 자면서 남몰래 웃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20일에 영화를 봤다.
“이 영화는 결국 다 같이 잘해 보자는 얘기다. 당선인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지금은 좋은 마음으로 다 잘해 보자고 하는 시점이니까 영화를 보고 그런 마음을 느끼셨으면 했다.”
―영화가 빨라지고 재미있어졌다고 한다.
“전에는 내 스타일대로 만들었고 망하는 것에 부담이 없었다. 그런데 전작들을 관객의 관점에서 보니까 지루하고 경직된 점이 보였다. 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관객을 꼭 지루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 이번엔 예산이 많이 들었고(순제작비 36억 원) 이 회사(MK픽처스)에 전에도 ‘와이키키…’로 손해를 끼쳐 관객이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자들끼리 작업하니 어땠나.
“여자들의 수다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성격도 무뚝뚝하다. 이번 현장에선 늘 20여 명의 여자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1초도 쉬지 않고 수다를 떨었다. 촬영감독이 ‘좀 조용히 해’ 하고 소리 지르면 1분 있다가 또 떠들더라. 그게 비결이었다. 그들은 힘들 때 화내지 않고 ‘(출연료) 입금됐으니 해야지’ 하고 농담하며 수다와 웃음으로 아줌마스럽게 풀었다.”
―‘비주류’에 대한 애정이 깊어 보인다.
“남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과 ‘한 끗’ 차이더라. 그래 봐야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하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매력에 관심이 간다.”
―영화의 여러 설정이 신파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작위적이고 진부한 설정이 있지만, 대중영화에서 관객들이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다.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다. 미숙(문소리) 남편 얘기를 많이 지적하는데, 운동만 하다가 사업을 하면 실패하기 쉽고,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다 보면 가장 그러지 말아야 할 순간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악수(惡手)를 둘 수도 있다.”
―여성 감독의 영화는 흥행이 잘 안되는 편이다.
“블록버스터는 기본적으로 ‘구라를 잘 풀어야’ 한다. 여성들은 자신이 잘 아는 것을 잔잔하게 풀어 가는 것은 잘하는데 과장하고 좀 더 멋있게 포장하는 것을 못한다.”
―여성 감독의 성장을 느끼나.
“내가 6대 여성 감독인데 1대 박남옥 감독님부터 나까지 40년 걸렸다. 2000년 이후엔 수적으로 많아졌으니 성장이다. ‘아름다운 생존’(그가 만든 여성 영화인에 대한 다큐)을 만들 때 박 감독님을 인터뷰했는데 예전엔 여자라고 녹음실에서 문도 안 열어 줬다고 하셨다. 1980년대 이미례 감독님도 남자 스태프들이 술과 음담패설로 기를 죽이려고 했단다.”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여성들에게 조언한다면….
“(한숨) 남자가 감독 되기가 국회의원 될 확률이라면, 여자가 감독 되기는 대통령이 될 확률이라고 하더라. 한국 영화가 위축되면서 데뷔하기는 더 힘들어졌다. 그래도 감독이 되고 싶다면…, 자기 재능과 열정을 믿는지 자신에게 물어봐라. 믿을 만하면 버틸 수 있고 버티다 보면 만들 수 있다.”
채지영 기자 yourcat@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K팝과 K의료 만났다…SM엔터·고려대병원 MOU 체결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936.1.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문가영, 허리 훤히 드러낸 파격룩…치명 섹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0735.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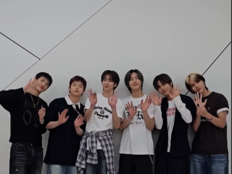
![숙행, ‘상간 소송 논란’ 후폭풍…사과문 공개→하차 선언[SD이슈]](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2706.1.jpg)





![이종석 1억 기부, 암환자·취약계층 환자 위한 선행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2388.1.jpg)


![쌍둥이맘 맞아? 한그루 비키니, 탄탄한 애플힙 자랑 ‘부러워’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29/133059045.1.jpg)


![숙행, 상간녀 의혹에 “출연중인 프로그램 하차…사실관계 밝힐 것” (전문)[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2257.1.jpg)




![아이들 민니, 멤버도 놀란 비키니 사진…압도적인 자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28/133051172.1.jpg)
![원진서 아찔 비키니 후끈…♥윤정수 사로잡았네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29/133052286.1.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임지연, ‘연예인과 불륜’ 등 재벌회장 온갖 비리 폭로 (얄미운 사랑)[TV종합]](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59781.1.jpg)

![숙행, 상간녀 의혹에 “출연중인 프로그램 하차…사실관계 밝힐 것” (전문)[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2257.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