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패로 한국야구는 큰 위기를 맞았다. 사진은 지난 2일 타이중 인터콘티넨탈구장에서 열린 네덜란드전에서 상대 선수와 충돌 후 괴로워하고 있는 포수 강민호의 모습이다. 타이중(대만)|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 한국야구 3無
[1] 급격한 지도자 교체 과도기 뿌리없는 야구
[2] 대표팀 대들보 역할 할 제2의 이승엽 부재
[3] 2002월드컵 영향…세대교체 자원이 없다
한국야구가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에서 탈락해 팬들에게 충격을 던져줬다. 2006년 제1회 WBC 4강,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09년 제2회 WBC 준우승,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차곡차곡 득점을 쌓아가며 성장일로에 있던 한국야구는 이번에 예상치 못한 실점을 하며 제동이 걸렸다. 이제 4∼5년 전 올림픽과 WBC 신화의 잔영을 걷어낼 때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실점 이후가 중요하듯, 한국야구도 이번 WBC 실패를 거울로 삼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스포츠동아는 ‘위기의 한국야구, 긴급진단’ 코너를 마련해 3회에 걸쳐 싣는다. 한국야구의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내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첫 번째 주제는 ‘한국야구 어디로 가고 있는가’다.
○과도기에 들어선 한국야구
최근 야구계 내에서도 “한국야구가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프로야구가 700만 관중을 돌파하며 흥행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야구 수준은 2000년대 후반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다. 리그를 압도하는 투수와 타자가 줄어들고, 수비와 주루플레이에서 어이없는 실수들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향평준화로 보일 뿐 야구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실제로 각종 기록적인 지표들에선 부실의 흔적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하향평준화든, 상향평준화든, 한국야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데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 한국야구는 2000년대 후반 다양한 색깔을 추구하며 발전했다. 강한 불펜이 지배하는 야구에서, 짜임새 있는 야구, 빠른 야구가 대세를 이루며 진화를 거듭했다. 호쾌한 야구는 아닐지라도, 이런 색깔들을 특화해 국제대회에서 호성적을 올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야구만의 무기가 퇴색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프로야구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구단의 입김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 감독들은 해마다 대거 해고되고 있다. 젊은 감독들의 등장으로 지도자의 세대교체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감독이 바뀌면 코치도 바뀐다. 야구관과 지도방식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하나의 야구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구조다. 선수들도 지도자들의 급격한 교체 속에 혼란을 겪고 있다. 결국 한국야구도 현재 과도기에 접어든 상황이다. 앞으로 한국야구가 국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델과 무기를 찾아야할 시기다.
‘제2의 이승엽을 찾아라’ 한국야구 세대교체 절실
○세대교체 속에 미래를 준비할 때
한국야구는 아직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09년 WBC의 주역들이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들에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장 국가대표 대들보인 이승엽(37·삼성)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대표팀 마운드를 지켜온 정대현(35·롯데)도 2017년 제4회 WBC 때는 39세로 대표팀 합류가 불투명하다.
2000년대 후반 한국대표팀에선 이종욱(33·두산), 정근우(31·SK), 이용규(28·KIA) 등이 이른바 ‘발야구’를 주도했다. 그런데 이번 WBC에는 이종욱이 빠졌고, 정근우도 다음 대회에선 노장 축에 들어간다.
새로운 전력 수혈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지만, 이번 대표팀 명단만 보더라도 발야구를 이어갈 젊은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다고 ‘제2의 이승엽’으로 성장할 만한 거포도 찾기 쉽지 않다. 프로야구는 현재 세대교체를 시도해야 할 시기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프로야구는 신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중고 신인왕이 대세다. 순수 신인왕은 2007년 임태훈(두산)이 마지막일 정도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 때 야구는 침체기였다. 어린이들은 대부분 축구에 입문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 그들은 고교생이나 프로 1∼3년생쯤 된다. 부족한 자원 중에서도 야구를 선택한 선수는 투수로 몰리는 경향이 짙어 특히 야수 쪽 뿌리가 부실하다.
올해 프로야구는 9구단 시대를 연다. 2015시즌부터는 10구단 체제로 접어든다. 자원의 부족 속에 구단은 늘어난다.
프로야구 하향 평준화를 막아낼 묘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다행히 베이징올림픽을 전후로 야구를 시작한 어린이들이 많다. 그들이 프로야구, 나아가 국가대표 중심세력으로 성장할 때까지 한국야구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제니, 日 생일파티 ‘샴페인 걸’ 논란…클럽 연출 왜 [SD이슈]](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8/133178118.1.png)






![사쿠라, 실크 드레스 입고 우아美 폭발…은근한 볼륨감까지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6/13316954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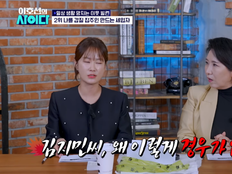
![구교환X문가영 ‘만약에 우리’, 150만 관객 돌파 [DA:박스]](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8/133177536.1.jpg)

![소유진, ‘방송복귀’ ♥백종원과 투샷 공개…여전한 부부 케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5/133164240.3.jpg)

![제니, 입에 초 물고 후~30살 되더니 더 과감해졌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6/133169711.3.jpg)

![소유, 10kg 감량후 물오른 비키니 자태…찍으면 다 화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16/133172519.1.jpg)




![25살 제니, 욕조→침대까지…파격 포즈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18/133177600.1.jpg)

![소유, 10kg 감량후 물오른 비키니 자태…찍으면 다 화보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16/13317251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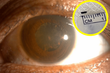




![“무선 고데기는 기내 반입 금지” 인천공항서 뺏긴 사연[알쓸톡]](https://dimg.donga.com/a/110/73/95/1/wps/NEWS/IMAGE/2026/01/16/133171330.2.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