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동아DB
NC는 2013시즌 KBO리그 1군에 참가했다. 이후 2014년부터 3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올라갔다. 2014년 준플레이오프(준PO)에 진출했고, 2015년 PO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한국시리즈(KS)까지 밟았다.
창단 4년이라는 시간 안에 NC가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KBO리그 신생팀의 역사를 돌아봐도 유례가 없다. kt만 봐도 KBO리그 1군 진입 후 2년 연속 최하위를 면하지 못했다. NC의 전략 방향성이 압축성장을 끌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NC가 지향한 ‘롤모델’은 어디였을까. 야구계에서는 “두산 카피(Copy) 전략의 성공”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는다. 그 덕분에 NC는 소모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시각이다.
마케팅 업계에서는 ‘미 투(me too) 전략’이라는 용어가 곧잘 등장한다. 어딘가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경쟁업체에서 신속하게 인력과 물량을 집중해 따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차별화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NC의 발전 과정을 따져보면 ‘미 투 전략’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측면이 없지 않다. 수장부터 두산에서 ‘화수분 야구’, 허슬두 야구‘를 경험했던 김경문을 창단 감독으로 선택했다. 박승호 수석코치, 최일언 투수코치, 최기문 배터리코치, 구천서 수비코치 등도 선수 혹은 코치로서 두산 밥을 먹었다.
NC는 프리에이전트(FA) 등 선수 영입에서도 두산 출신을 ‘우대’했다. 두산에서 FA를 선언한 손시헌, 이종욱은 이제 NC 내, 외야의 축이자 정신적 지주다. 포수 용덕한도 두산 출신이다.
NC도 두산처럼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역동적인 야구를 펼친다. 외국인선수에게 로열티를 부여하고, 과감한 신인 육성을 추구하는 대목도 ‘두산 웨이’와 흡사하다.
두산은 2016시즌 개막을 앞둔 시점부터 내심 NC를 가장 부담스러워했다. 전력 자체도 충실하지만 두산을 가장 잘 아는 적수이기 때문이었다. 두산도 그만큼 NC를 잘 알지만 김경문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KS에서 NC는 이제 ‘원조’ 두산을 넘는 ‘청출어람’에 도전한다. NC는 김 감독과의 계약이 KS를 끝으로 종료된다. 주력선수들의 노쇠화도 피할 수 없다. NC도 자기만의 길을 열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두산을 이기는 것이 상징적 첫 걸음이 되겠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닐 터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PS리포트] LG의 가을은 그 어느 해보다 값졌다](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6/10/25/81003808.2.jpg)
![[스타플러스] ‘KS 진출’ NC 박석민이 보여준 ‘가을DNA’](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6/10/25/81003732.2.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몬스타엑스 체조 찢었다…근본의 셋리로 새 월투 시작 ft.아이엠 삭발 (종합)[DA:리뷰]](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5581.1.jp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보아 ‘25년 동행’ SM 떠난 근황…“잘 지내고 있어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532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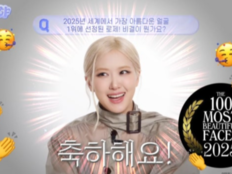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하시4’ 김지민, 김지영 신부 입장에 끝내 오열…“너무 예쁘고 기뻐서” [SD셀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6390.1.pn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