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이 지난 8일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에서 우승을 확정한 직후 우승 현수막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 감독은 남다른 소통 능력을 통해 ‘전북 현대 왕조’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 스포츠동아DB
감독은 권한을 갖지만 책임도 져야 하는 자리다. 선수선발과 전술운용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지만, 그에 따른 성적도 감독의 책임이다. 그게 공평하다. 문제는 감독이 원하는 선수단을 꾸릴 수 있느냐다. 요즘 프로축구 K리그 구단들을 보면 투자는 바닥이다. 대신 성적에 대한 잣대는 엄중하다. 이런 분위기를 견뎌낼 감독은 많지 않다. 감독 잔혹사가 매년 되풀이 되는 이유다.
이런 면에서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은 연구대상이다. 특히 구단과 선수, 팬과의 복잡 미묘한 관계를 풀어가는 소통 능력은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2005년 여름 전북 지휘봉을 잡은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게 구단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구단 마인드는 지방 클럽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4등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적당히 지도하다가 때가 되면 떠나면 된다는 분위기였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생각을 바꿨다. 긍정적으로 변했다. 상황이 어떻든 좋은 팀을 만들어 축구인생에서 보람을 찾자고 생각했다. 재기에 목말라하는 선수들을 모았다. 이적료 없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다. 구단이 걱정하던 돈은 별로 들지 않았다. 감독의 열정에 선수들은 성적으로 보답했다. ‘재활공장장’이라는 별명이 만들어졌다. 예상보다 괜찮은 성적에 구단이 관심을 보였다. 인정을 하겠다는 신호였다. 그렇게 서로는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후 구단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필요한 선수영입은 물론이고 클럽하우스 등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시설에 투자했다. 지난 10여년의 세월은 헛되지 않았다. 구단의 지원이 없으면 지도자의 구상을 물거품이 된다. 감독은 어떻게든 구단을 설득해야 한다. 최 감독은 그걸 성공했다.
최 감독은 선수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했다. 지방구단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던 선수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다. 그 속에서 방법을 찾았다. 칭찬과 용기, 그리고 동기부여였다. 2009년 정규리그 최종전에 그가 무릎십자인대 파열로 재활 중이던 김형범의 유니폼을 입고 나온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뭉클하다. 전북은 당시 정규리그 첫 우승을 했다. 감독과 선수의 믿음은 그렇게 생겼다.
세월이 흐르면서 전북의 축구문화가 만들어졌다. 감독은 편견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선의의 경쟁이 가능해졌다. 비슷한 능력일 경우 선배를 배려하는 불문율도 생겼다. 명문구단의 반열에 오른 지금 감독은 잔소리 하지 않는다. 선수들이 알아서 한다. 팀에 대한 애정과 희생정신이 있기에 가능하다. 우승 DNA를 만들어가는 교과서라 할만하다.
전북에는 골수팬이 많다. 어려운 시절에도 응원하던 팬들은 이제 나이 지긋한 중년이 됐다. 애정에는 변함이 없다. 소중한 팬이다. 감독은 먼 거리를 달려온 팬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챙긴다. 한 때 팬들이 등을 돌린 때도 있었다. 2008년 중반 거듭된 부진에 팬들이 분노하자 감독은 진심을 담은 편지로 마음을 돌렸다. 우여곡절을 통해 서로는 강력한 연대의식이 생겼다. 감독은 이제 더 많은 지역 활동을 강조한다. 연고의 뿌리가 탄탄해지는 이유다.
올 시즌 전북은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게다가 2012년 스플릿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스플릿 라운드 돌입 이전 우승이다. 그런 절대 1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구단과 선수, 팬들이 한마음이 될 때 가능하다. 특히 감독이 중심에서 소통을 잘 할 때 팀이 더 강력해진다는 걸 최 감독은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체육학 박사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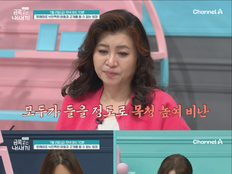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원어스 전원 전속계약 종료, 이름은 그대로 쓴다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14.1.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