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열린 삼성과 KIA의 개막전에서 한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피를 흘리며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5년에는 날아온 파울볼에 맞아 앞니가 빠진 관중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험에 따르면 투수가 던진 시속 140km의 공을 타자가 쳤을 때, 시속 180km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한다. 가히 날아오는 흉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파울볼에 맞은 관중은 야구장이라는 시설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야구 티켓의 뒷면에 ‘운동장에서 파울볼, 기타에 의하여 부상을 당할 때는 주최측이 현장의 응급치료만 책임지고 그 뒤의 책임은 지지 않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따라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관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이 문구는 유효하지 않다.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야구장 티켓에 기재된 문구가 약관법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을 명했기 때문이다. 즉 모든 부상에 대해 주최 측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야구장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야구단이나 지자체가 상당한 부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서울지방법원은 관중석의 그물에 구멍이 뚫려 있었거나, 지나치게 낮게 설치되어 있었거나, 파울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은 경우에 지자체 및 구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각 구단은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다. 그런데 보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그 배상액이 충분할지 의문이다. 야구장 밖에서 공에 맞아 차량이 파손되거나, 매점 등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액이 꽤 높지만 관중석에서 맞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놀라울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일단 관중석에 앉아 있는 관중은 충분히 부상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한다는 비정하고도 명쾌한 판단이다.
하지만 모든 관중이 시속 180km의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모두 피할 만큼 반사신경이 좋은 것은 아니다. 단지 야구를 좋아해 야구장에 왔다는 이유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프로야구 600만 관중 시대. 꿈같은 수치고 비약적인 발전이다. 하지만 그 600만이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당장 눈앞의 수익이 아닌,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구단과 지자체의 노력이 아쉽다.
한화 팬·변호사
실험에 따르면 투수가 던진 시속 140km의 공을 타자가 쳤을 때, 시속 180km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한다. 가히 날아오는 흉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파울볼에 맞은 관중은 야구장이라는 시설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야구 티켓의 뒷면에 ‘운동장에서 파울볼, 기타에 의하여 부상을 당할 때는 주최측이 현장의 응급치료만 책임지고 그 뒤의 책임은 지지 않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따라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관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이 문구는 유효하지 않다.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야구장 티켓에 기재된 문구가 약관법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을 명했기 때문이다. 즉 모든 부상에 대해 주최 측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야구장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야구단이나 지자체가 상당한 부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서울지방법원은 관중석의 그물에 구멍이 뚫려 있었거나, 지나치게 낮게 설치되어 있었거나, 파울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은 경우에 지자체 및 구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각 구단은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다. 그런데 보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그 배상액이 충분할지 의문이다. 야구장 밖에서 공에 맞아 차량이 파손되거나, 매점 등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액이 꽤 높지만 관중석에서 맞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놀라울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일단 관중석에 앉아 있는 관중은 충분히 부상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한다는 비정하고도 명쾌한 판단이다.
하지만 모든 관중이 시속 180km의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모두 피할 만큼 반사신경이 좋은 것은 아니다. 단지 야구를 좋아해 야구장에 왔다는 이유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프로야구 600만 관중 시대. 꿈같은 수치고 비약적인 발전이다. 하지만 그 600만이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당장 눈앞의 수익이 아닌,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구단과 지자체의 노력이 아쉽다.
한화 팬·변호사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제니, 깜짝 공개 고백했다…“자꾸 보고 싶어” 누구길래?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9/133327952.1.jpg)







![송가인 맞아? 선녀→검객 파격 변신 ‘AI 아님’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9/133330059.1.jpg)



![조병규 호텔방에서 발견…햇살 받으며 폰 삼매경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9/133329623.1.jpg)



![‘누난 내게 여자야’ 고소현, 군살 제로 비키니 자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08/133318624.1.jpg)


![모모, 뒤태 노출에 ‘심쿵’…옷이 너무 과감한 거 아냐?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10/133334193.1.jpg)
![박정민, 눈에서 꿀 떨어지겠어…신세경 향한 달달 눈빛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10/133333508.1.jpg)

![송가인 맞아? 선녀→검객 파격 변신 ‘AI 아님’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09/133330059.1.jpg)
![정말 샛별 맞네…이나현, 올림픽 데뷔전서 한국 여자 빙속 1000m 사상 최초 ‘톱10’ 진입 [강산 기자의 여기는 밀라노]](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10/133332059.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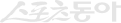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