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그룹이 14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축구단 창단을 공식 선언했다.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왼쪽)이 한국프로축구연맹 권오갑 총재에게 창단의향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bluemarine007
■ 프로축구 ‘서울 제2구단’ 창단 선언한 이랜드의 과제
2020년 챔스·K리그 동시제패 비전
현실적으로는 7년 내 자립도 어려워
타 구단 현황 참고해 예산 편성해야
아시아 시장 겨냥은 바람직한 선택
이랜드그룹이 ‘서울 제2구단’ 창단을 공식화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9일 창단 의향을 전한 이랜드는 14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창단을 발표했다. ‘No1. 인기 프로축구단’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랜드는 내년 K리그 챌린지(2부리그) 참가에 이어 이른 시일 내 클래식(1부리그)으로 승격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다. 성공적인 K리그 연착륙까지는 숱한 과제들이 놓여있다.
● 현실적 계획 수립이 먼저!
이랜드는 ‘프로축구단 2020’ 비전을 내놓았다. ▲관중 1위 ▲자립형 구단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장밋빛 청사진의 세부계획은 이렇다. 2015∼2016년 관중 1만명에 K리그 챌린지 우승을 이루고, 2017∼2018년 관중 2만5000명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낸다. 2019∼2020년에는 관중 4만명에 챔피언스리그와 K리그 클래식을 제패한다.
목표는 좋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챌린지에서 1만 관중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또 대부분의 기업구단들도 자립경영을 추구하지만, 모기업의 지원이 부족해지면 ‘그저 그런’ 팀이 된다. 이랜드는 시즌티켓 비율 50%에 스폰서 50개면 자립률 10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다. 실례로 지방 유력 A구단은 관중 1만여명에 연간 입장수익이 6억원 안팎에 이르지만, 프랜차이즈 선수 B의 연봉을 맞추기도 빠듯한 형편이다. 현실적으로 창단 이후 7년 내 자립은 어렵다.
예산 편성도 확실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랜드가 첫 시즌 예산으로 50억원을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사실이라면 2016년 과제로 설정한 탈 챌린지급 선수단 구성은 어렵다. 광주FC, 대전 시티즌 등 챌린지 시민구단의 연간 운영비도 70억∼80억원에 달한다.
● 아시아 마케팅은 긍정적!
K리그 구조상 관중이 곧 수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10만원 안팎의 프로축구 C구단의 시즌티켓과 90만원에 육박하는 프로야구 D구단의 시즌권을 보면 알 수 있듯 국내프로축구시장의 규모는 열악하다. 이런 국내축구시장에서 벗어나 이랜드가 아시아시장으로 시선을 확장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인다. 패션, 레저, 엔터테인먼트 등 6개 영역에서 250여개 브랜드를 보유한 이랜드는 지난해 총 매출 10조원을 올렸고, 중국에 진출한 국내패션·유통업체 중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꼽힌다. 중국 내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에 7000여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축구는 격동기를 맞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막강 자금력을 앞세운 광저우 에버그란데라는 ‘탈 아시아’를 노리고 있다. 일본 J리그도 세레소 오사카를 중심으로 본격 투자에 나섰다. 광저우는 이탈리아대표 디아만티를, 오사카는 우루과이 특급 디에고 포를란을 보유했다. 추정 연봉만 50억∼60억원이다. 이랜드는 2020년 초특급 용병 확보를 약속했다. 앞선 2018년에는 중국과 동남아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동남아시장은 J리그가 오래 전에 뛰어든 ‘레드오션’이다. 몇몇 동남아 스타들을 영입하며 중계권 판매에 나서는 등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랜드로선 차별화 전략이 필수적이다. 물론 내실을 다진 뒤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이특, 새해부터 통 크게 질렀다…1억 포르쉐 플렉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2929.3.jpg)
![제시, 논란 뒤 근황 포착…새해에도 애플힙 ‘눈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2502.3.jpg)







![유스피어 데뷔 7개월 만에…“전속계약 종료” [전문]](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06/30/131909631.1.jpg)
![‘40억 건물주’ 이해인 새해에도 파격미 여전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2559.1.jpg)
![신지, ♥문원과 떠났나…휴양지서 더 어려진 미모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1914.3.jpg)




![트와이스 모모, 티셔츠 터지겠어…건강미 넘치는 바디라인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4297.1.jpg)



![아이브 장원영, ‘인간 복숭아’ 아닐 리가…러블리+핑크빛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5567.1.jpg)
![김빈우, 역대급 비키니 몸매…43세 안 믿겨 ‘부럽다’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5504.1.jpg)
![이특, 새해부터 통 크게 질렀다…1억 포르쉐 플렉스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2929.3.jpg)
![신지, ♥문원과 떠났나…휴양지서 더 어려진 미모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1914.3.jpg)
![두목 호랑이 이승현 ‘시즌 최다 30점’ 폭발…현대모비스, 홈 8연패 탈출 [SD 울산 스타]](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550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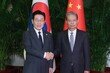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