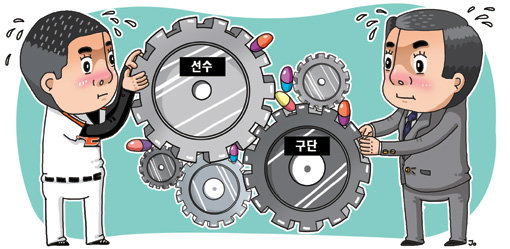
■ 최진행 사태로 본 프로야구 금지약물 실상
KBO는 지난달 25일 ‘한화 최진행(30)이 금지약물을 복용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두산 이용찬(현 상무)이 역시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징계를 받았다. 어느덧 KBO리그에서 ‘약물 스캔들’은 연례행사처럼 터지고 있다. KBO는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 ‘괴담’은 끊이질 않고 있다. 약물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리그의 명운을 걸고 싸워야 할 ‘공공의 적’이다.
‘약발’ 안 받는다는 야구판 해마다 스캔들
최진행 30경기 정지 후 2가지 괴담 떠돌아
“모르고 먹었을까?”-“최진행만 먹었을까?”
KBO 도핑감시 체제 한계…강력대응 필요
“선수 방치 구단에도 책임 물어야” 지적도
● 왜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될까?
흔히 야구는 다른 종목에 비해 소위 ‘약발’이 잘 안 받는 종목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근력이 좋아져도 방망이에 맞히지 못하면, 투구 밸런스가 잡히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5m 차이로 펜스 앞에서 잡히는 타구가 담장을 넘어가면 선수는 약을 못 끊는다.” 그 순간, KBO의 모든 통계와 역사는 왜곡된다. 그리고 리그의 신뢰는 실종된다. 메이저리그조차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을 ‘약물의 시대’로 부르는데, “이 시기 모든 기록에는 각주를 달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다.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것이다.
프로스포츠는 인간의 육체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승리를 추구하는, 엄혹하지만 치열한 세계다. 이런 공간에서 약물의 힘을 빌려 상대를 이기려는 의도와 행위는 ‘반칙’이다. 좁게는 도덕적으로 나쁘고, 넓게는 리그 전체를 훼손하는 범죄다. 약물로 몸이 망가지면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한다.
● 어떻게 약물 청정지역을 만들까?
최진행이 적발돼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음에도 야구계에선 2가지 괴담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첫째는 ‘최진행이 정말 모르고 먹었겠느냐’이고, 둘째는 ‘정말 최진행만 먹었겠느냐’다. 결국 KBO의 현재 도핑 감시체제를 못 믿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현재의 도핑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원초적 의심에 대해 KBO는 대응해야 한다. “검사횟수를 늘리고 불시검사도 도입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징계 수위도 최고 1년 자격정지까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구단들도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선수가 모르고 먹었다’로 넘길 일이 아니다. 프로야구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약물이 적발되면 이를 방치한 구단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재수 없어서 우리 팀 선수가 걸렸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약물 스캔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정구단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며 일이 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단들도 ‘약물 불감증’에 빠져있다는 증거다. 선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단의 명예와 리그의 신뢰를 걸고 바라보지 않는 한, 약물의 유혹은 너무 달콤하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트와이스 지효, 복근+바디라인 압도적…자기관리 끝판왕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4/133408741.1.jpg)





![랄랄 맞아? 눈밑지+코 수술 후 확 달라진 근황…“착해진 거 같기도”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3/133404710.1.jpg)
![기희현 군살 제로 수영복 자태, 놀라워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2/133395234.1.jpg)


![‘하니 동생’ 안태환 결별, 누나와 한솥밥 먹던 소속사 떠난다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5/133418797.1.jpg)
![“제니야 고마워” 션도 감동시킨 1억 기부…수익금에 사비까지 보탰다 [DA:이슈]](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11/133345038.1.png)


![‘내새끼의연애2’ 측 “시즌1 지적 수용한 시즌2 될 것” [일문일답]](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5/133418798.1.png)

![‘김민희와 혼외자 출산’ 홍상수, 근황 공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4/133409214.1.jpg)



![‘김민희와 혼외자 출산’ 홍상수, 근황 공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4/133409214.1.jpg)


![‘의붓아들 살해’ 무기수와 키스한 女, 알고 보니 담당 판사? (하나부터 열까지)[TV종합]](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4/133408242.1.jpg)
![박지현, 밀착 레깅스핏+11자 복근 美쳤다…무결점 바디라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24/133412175.1.jpg)
![‘차정원♥’ 하정우, 美서 포착…과감한 삭발 변신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24/133411750.1.jpg)
![“제니야 고마워” 션도 감동시킨 1억 기부…수익금에 사비까지 보탰다 [DA:이슈]](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11/133345038.1.png)
![‘김민희와 혼외자 출산’ 홍상수, 근황 공개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24/133409214.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