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은 국내에서 가장 넓은 잠실구장을 쓰는 만큼 기동성에 초점을 맞춰 팀 컬러를 바꿨지만, 장타력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LG는 2005년 팀의 10년을 책임질 수 있다는 오른손 거포 박병호(왼쪽)와 정의윤을 영입하고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채 타 팀으로 떠나보냈다. 스포츠동아DB
■ 홈구장과 팀컬러의 중요성
최대 크기 잠실구장 고려 없이 장타만 기대
2011년 박병호 이어 올해 정의윤 트레이드
박병호, 구장·넥센 팀컬러 맞아 최고거포로
2005년 신인드래프트는 LG에게는 ‘기회’와도 같았다. 연고지명인 1차 지명에서 ‘초고교급’ 거포였던 성남고 박병호를 품에 안은 데 이어 2차 1라운드에서도 전체 3순위로 부산고 장타자 정의윤을 지명했다. 박병호와 정의윤은 LG의 10년을 이끌어갈 ‘우타 거포’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2015년 현재, 두 명 모두 LG에 없다. 박병호는 2011시즌 도중 넥센으로 트레이드됐고, 정의윤은 24일 SK와의 3대3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다.
LG는 전통적으로 좌타자가 많았던 팀이다. 오랜 시간 우타자, 그것도 거포에 목말라 있었다. 박병호와 정의윤은 LG에게는 키워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 선수들이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다. 처음부터 ‘방향성’이 잘못됐던 것은 아닐까.
● 최대 사이즈 잠실구장, ‘육상부’ 선택해 성공한 두산
잠실구장은 가운데 담장까지 125m, 좌우 펜스까지는 100m로 국내 구장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홈런이 많이 나오는 좌중간, 우중간이 깊다. 잠실을 홈으로 쓰면서 홈런왕을 차지한 이는 1995년 김상호와 1998년 우즈뿐이다. 두 명 모두 두산의 전신 OB 소속이었다. LG는 배출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LG처럼 거포를 길러낼 생각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NC 김경문 감독이 두산 지휘봉을 잡았던 2000년대 중후반, 두산은 ‘육상부’로 이름을 떨쳤다. 2007년에는 역대 최초로 30도루 타자 3명(이종욱 47개·고영민 36개·민병헌 30개)을 배출했다.
김 감독과 두산의 선택은 현명했다. 굳이 나오기 힘든 홈런보다는, 빠른 발로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야구를 펼친 것이다. 드넓은 잠실구장의 외야를 고려하면 스피드는 단타를 2루타로, 2루타를 3루타로 둔갑시킬 수 있다. 여기에 누상에 나갔다 하면, 혼을 빼놓는 도루를 감행해 상대 투수를 흔들었다.
신선했던 두산의 팀 컬러, 이제 ‘발야구’는 어느 팀이나 추구하는 기본이 됐다. 그러나 당시 두산은 잠실이라는 홈구장과 맞물려 더 큰 효과를 냈다.
● 잠실과 다른 목동, ‘홈런 공장’ 만든 넥센
넥센은 두산과는 달리 ‘장타력’으로 승부를 본 케이스다. 넥센의 안방 목동구장은 가운데 펜스까지 118m, 좌우까지 98m지만, 외야 관중석이 없고 상대적으로 타구장에 비해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다.
LG에서 잠재력을 터뜨리지 못한 박병호를 품에 안으면서 넥센의 팀 컬러는 바뀌기 시작했다. 박병호에게 4번타자로서 삼진을 먹더라도 풀스윙을 할 것을 주문했다. 박병호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홈런왕으로 팀에 보답했다. 염경엽 감독이 부임한 2013년 이후 ‘파워’를 중시하는 넥센의 성향은 더욱 짙어졌다.
박병호와 강정호(현 피츠버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벌크업’을 선택했다. 이택근, 유한준, 김민성 등 홈런을 터뜨릴 수 있는 타자들이 즐비했다. 두산과의 트레이드로 영입한 윤석민도 목동에선 언제나 장타를 터뜨릴 수 있는 인재였다. 염 감독은 “김경문 감독님이 두산 사령탑 시절 홈구장에 맞게 팀 컬러를 구축한 것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벌크업을 장려하는 트레이닝 파트를 전폭적으로 믿었고, ‘장타 군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LG로부터 정의윤을 영입한 SK의 홈구장 인천 SK행복드림구장도 비교적 홈런이 많이 나오는 곳이다. 가운데 펜스까지 거리가 120m지만, 좌우는 95m에 불과하다. 넥센이 박병호를 홈런왕으로 키웠듯, SK가 정의윤의 잠재력을 폭발시킬지 두고 볼 일이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보아 ‘25년 동행’ SM 떠난 근황…“잘 지내고 있어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532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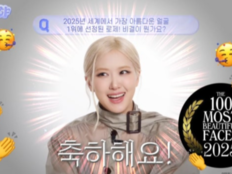

![몬스타엑스 체조 찢었다…근본의 셋리로 새 월투 시작 ft.아이엠 삭발 (종합)[DA:리뷰]](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5581.1.jpg)

![이효리, 평창동 자택서 요가 삼매경…이상순은 “땅콩 버린다?” [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6628.1.pn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트와이스 지효, 역대급 여신 비주얼 속옷 화보 [화보]](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3239.1.jpg)


![‘하시4’ 김지민, 김지영 신부 입장에 끝내 오열…“너무 예쁘고 기뻐서” [SD셀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6390.1.pn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펑고 한 번 더 받는 KT 허경민, 자신 향한 엄격한 잣대 [SD 질롱 인터뷰]](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2808.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