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이 유리했던 6위 경쟁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20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1부) 22라운드 수원과 홈경기에서 쓰라린 1-2 역전패를 당해 순식간에 8위로 밀려났다. 곳곳에 흙이 드러난 최악의 홈그라운드 사정이 패스 위주의 축구를 펼치는 강원에는 악재로 작용한 결과다. 강릉|남장현 기자
리드미컬한 패스, 전방위적인 빌드-업, 유기적인 공격 전개. 김병수 감독이 이끄는 K리그1(1부) 강원FC가 추구하는 팀 컬러다. ‘하나원큐 K리그1 2020’ 파이널 라운드 그룹A(1~6위) 진입과 별개로 강원은 나름의 경쟁력을 발휘하며 충분히 선전해왔다.
그러나 강원에는 가장 무서운 적이 따로 있다. 홈 어드밴티지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그라운드다. 수원 삼성과 22라운드 홈경기가 열린 20일 강릉종합운동장은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이었다.
“잔디를 걷어내고 흙을 파서 보물이라도 숨겨놓지 않았느냐”는 뼈있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현장 상태는 처참했다. 터치라인 주변과 골에어리어, 하프라인, 골문 한복판 등 푹푹 패인 지역이 너무 많았다. 그나마 잔디 높낮이도 일정치 않아 이날 두 팀은 90분 내내 플레이에 애를 먹었다.
특히 강원의 최대 장점인 킬 패스는 끊기기 일쑤였고, 누구든 킥을 시도하면 큰 흙덩이가 튀었다. 바운드도 일정치 못해 리바운드 볼은 서로가 사실상 포기할 지경이었다. 스프링클러가 전·후반전 킥오프를 앞두고 작동하며 수분을 공급했지만, ‘임시처방’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었다.
문제는 강원의 누더기 그라운드가 강릉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강원은 올해 강릉과 춘천을 오가며 홈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춘천 역시 상태는 전혀 다르지 않다. 5월 10일 홈 개막전을 치른 춘천은 그 후 그라운드 잔디를 교체했다. 그런데 여름 내내 지속된 긴 장마와 폭우, 폭염, 태풍까지 겹쳐 제대로 뿌리 내리기도 전에 많은 곳이 썩어버려 헛수고만 한 꼴이 됐다.
이렇듯 원하는 패턴 플레이를 할 수 없으니 당연히 홈 승률도 낮다. 이날 경기 전까지 안방에서 3승3무4패에 그쳤던 강원은 이날 수원에도 1-2 역전패를 당해 목표로 삼았던 그룹A 진입에 끝내 실패했다. 7월 12일 광주FC를 4-1로 격파한 것이 강원의 마지막 홈 승리다.
2위 전북 현대를 올 시즌 2번 모두 잡고, 1위 울산 현대와 대등하게 싸운 강원이지만 수년 동안 지속된 수원과의 악연과 악몽이 거짓말처럼 반복돼 충격이 배가됐다. 강원은 지난시즌부터 수원을 상대로 5경기 연속 무승(2무3패)이고, 역대전적에서도 4승5무14패로 절대 열세다.
누더기 잔디라는 내부의 적, 수원이라는 외부의 적에 꿈이 가로막힌 김 감독은 “오늘의 패배는 쉽게 털어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릉|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원어스 전원 전속계약 종료, 이름은 그대로 쓴다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1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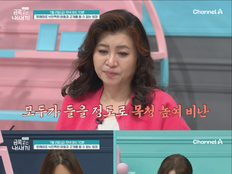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