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세상은 더 팍팍해졌다. 스포츠계도 마찬가지다. 중계권이나 입장권, 스폰서십으로 먹고 사는 프로 종목은 죽을 맛이다. 관중이 없는 경기에 협찬이 들어올 리 없고, 그렇다고 중계가 활발한 것도 아니다. 이래저래 고민이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홈구장인 인천축구전용구장의 명칭 사용권(네이밍 라이츠)을 시장에 내놓은 것도 이런 어려운 사정과 무관치 않다.
명칭 사용권이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 팀이나 경기장 등의 명칭에 기업 또는 브랜드 이름을 붙이는 권리를 말한다. 시장 규모가 큰 해외에서는 구단의 주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선 사용료가 연간 600만 유로(약 79억 원)인 바이에른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가 대표적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선 아스널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이나 맨체스터시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 등이 유명하다. 축구뿐 아니라 야구나 농구, 미식축구 등의 프로 종목에서도 명칭 사용권 마케팅은 활발하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그렇지 못하다. 경기장 수익화 권한을 시설 소유주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어 마케팅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SK그룹이 2011년 핸드볼경기장에 연간 40여억 원을 지불하고 이름을 붙인 게 국내 최초다. 야구에선 2013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시작으로 인천SK행복드림구장, KT위즈파크, 한화생명이글스파크 등이 구장 명칭에 기업명을 넣었다. 키움증권은 경기장이 아닌 히어로즈 구단 명칭을 5년간 총 500억 원에 샀다. 축구에서는 대구FC의 홈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가 처음이다. 3년간 총 45억원에 계약했는데, 구단도 대구은행도 모두 대박을 친 케이스다.
대구에 이어 인천이 명칭 사용권 마케팅에 뛰어 들어 주목 받고 있다. 대구와 다른 점은 공개 입찰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축구전용구장은 인천시의 위탁을 받아 구단이 직접 운영한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또 매각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도 함께 내놓았다. 명칭 사용권에다가 지하철 도원역 역명 병기권, 2022년 완공예정인 인천유나이티드 클럽하우스의 명칭사용권 등을 포함시켰다. 이번 입찰을 주관하는 정동섭 딜로이트 안진 스포츠비즈니스그룹 리더는 “경기장은 감정적 공유가 이루어지는 스포츠 플랫폼의 특성상 기업 또는 브랜드의 인지도와 선호도, 유대감 증대에 효과적이며, 고객과의 밀접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에서 마케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돈을 벌어야 우수 선수 영입과 경기장 건설이 가능하고, 여건이 좋아져야 팬들이 찾는다. 관중이 늘고 성적이 좋아지면 구단 가치가 올라가는 건 시간문제다. 매 시즌 살 떨리는 잔류 전쟁을 치렀던 인천이 좀 더 풍족한 조건을 갖춘다면 성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안정적인 수입으로 유소년 육성이나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할 수도 있다. 이번 공개 입찰의 흥행을 바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성공을 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명칭 사용권이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 팀이나 경기장 등의 명칭에 기업 또는 브랜드 이름을 붙이는 권리를 말한다. 시장 규모가 큰 해외에서는 구단의 주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선 사용료가 연간 600만 유로(약 79억 원)인 바이에른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가 대표적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선 아스널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이나 맨체스터시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 등이 유명하다. 축구뿐 아니라 야구나 농구, 미식축구 등의 프로 종목에서도 명칭 사용권 마케팅은 활발하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그렇지 못하다. 경기장 수익화 권한을 시설 소유주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어 마케팅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SK그룹이 2011년 핸드볼경기장에 연간 40여억 원을 지불하고 이름을 붙인 게 국내 최초다. 야구에선 2013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시작으로 인천SK행복드림구장, KT위즈파크, 한화생명이글스파크 등이 구장 명칭에 기업명을 넣었다. 키움증권은 경기장이 아닌 히어로즈 구단 명칭을 5년간 총 500억 원에 샀다. 축구에서는 대구FC의 홈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가 처음이다. 3년간 총 45억원에 계약했는데, 구단도 대구은행도 모두 대박을 친 케이스다.
대구에 이어 인천이 명칭 사용권 마케팅에 뛰어 들어 주목 받고 있다. 대구와 다른 점은 공개 입찰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축구전용구장은 인천시의 위탁을 받아 구단이 직접 운영한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또 매각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도 함께 내놓았다. 명칭 사용권에다가 지하철 도원역 역명 병기권, 2022년 완공예정인 인천유나이티드 클럽하우스의 명칭사용권 등을 포함시켰다. 이번 입찰을 주관하는 정동섭 딜로이트 안진 스포츠비즈니스그룹 리더는 “경기장은 감정적 공유가 이루어지는 스포츠 플랫폼의 특성상 기업 또는 브랜드의 인지도와 선호도, 유대감 증대에 효과적이며, 고객과의 밀접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에서 마케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돈을 벌어야 우수 선수 영입과 경기장 건설이 가능하고, 여건이 좋아져야 팬들이 찾는다. 관중이 늘고 성적이 좋아지면 구단 가치가 올라가는 건 시간문제다. 매 시즌 살 떨리는 잔류 전쟁을 치렀던 인천이 좀 더 풍족한 조건을 갖춘다면 성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안정적인 수입으로 유소년 육성이나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할 수도 있다. 이번 공개 입찰의 흥행을 바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성공을 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단독] 박지성, 예상치 못한 파격 행보→기대 만발](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20/12/08/104336877.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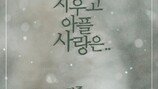










![‘25주년’ 보아, 재계약이냐 은퇴냐…SM은 공식입장 無 [종합]](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07/25/132069738.1.jp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신지원(조현), 힙업 들이밀며 자랑…레깅스 터지기 일보직전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3865.1.jpg)
![공명 측 “어지러움 증상에 입원…곧 드라마 촬영 복귀”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66.1.jpg)

![있지 채령, 허리 라인 이렇게 예뻤어? 크롭룩으로 시선 강탈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3831.3.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임지연, ‘연예인과 불륜’ 등 재벌회장 온갖 비리 폭로 (얄미운 사랑)[TV종합]](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59781.1.jpg)








![황희찬 ‘오늘은 꼭 이겨야 해’ [포토]](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137.1.jpg)


![황희찬 ‘경기가 안 풀리네’ [포토]](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118.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