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면 생각나는 두 남자, 슈베르트와 아버지
“단순한 열정이 나를 슈베르트로 이끌어”
비올라에 투명하게 스며든 일리야의 피아노
“항상 제 마음 속에는 슈베르트의 고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곡을 연주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 비로소 11월 19일, 그것도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날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을 연주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마스터하고 싶었던 저의 포부와 열정, 그리고 그의 고독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단순한 열정이 나를 슈베르트로 이끌어”
비올라에 투명하게 스며든 일리야의 피아노
11월 19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비올리스트 김남중은 이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주 D.821을 연주했다. 이날 독주회는 김남중의 일곱 번째 ‘활이 춤춘다’ 시리즈로 ‘단순한 열정’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김남중에게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는 각별한 ‘인생곡’이다. 그 이유를 그는 이날 무대에서 관객에게 털어놓았다.
“11월이 되면 생각나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된 김남중의 ‘고백(?)’은 왜 그가 지금까지 이 걸작을 연주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김남중의 ‘두 남자’는 슈베르트, 그리고 아버지. 기분이 좋은 날이면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연주해 주렴”했단다. 하지만 비올라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남중에게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는 너무나 어려운 대곡이었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난곡이었다.
그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거부감은 프로 연주자가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무대에서 연주하기 위해서는 세월이 더 흘러야했고, 드디어 시간이 익었다. ‘단순한 열정’이 김남중으로 하여금 활을 잡게 했다. 관객들은 이날, 그를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로 이끈 열정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이를 먹고 나서야 슈베르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에서 저는 슈베르트의 뼈 속까지 스며든 한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도전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J. H 훔멜의 ‘포푸리(판타지)’ g단조 Op.94로 이날 독주회의 문을 연 김남중은 마침내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위해 악기를 어깨 위에 올렸다. 이윽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비올라의 중성적인 사운드를 입고 흘러나왔다.
슈베르트가 이 곡을 작곡한 때는 1824년. 이 해 여름, 슈베르트는 에스테르하지 일가와 함께 체레스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그는 백작의 딸 카를리네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이 시기는 그에게 절망의 나날이기도 했다. 1823년 성병에 걸린 데다 우울증까지 겹쳐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1824년 자신의 일기장에 “나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또다시 눈이 떠지지를 않기를 바란다. 아침이 되면 전날의 슬픔만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고 썼던 슈베르트였다.
“나의 작품은 음악에 대한 나의 이해와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슬픔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 이 세상을 즐겁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슬픔은 이해를 돕고 정신을 강하게 한다.”
김남중의 연주는 색이 짙었다. 그리고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솟구치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뒤섞임이 있었다.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슬픔이 가득하다. 슬픔이 미소를 띠고 있다. 그 깊은 곳, 슈베르트의 심연 속에 웅크린 고독과 외로움.
첼로로 듣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때때로 같은 곡이 연주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수십 번도 넘게 들어왔던 김남중의 소리와도 달랐다는 것이다. 비올라에 살얼음이 끼어 있었다.
인터미션으로 숨을 고른 뒤, 브람스의 비올라 소나타 2번 E플랫장조가 연주되었다. 표정이 싹 바뀌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남중의 사운드가 돌아왔다.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이 곡은 브람스의 마지막 실내악곡이자 마지막 소나타로 알려져 있다. 원곡은 클라리넷을 위해 작곡되었지만 1년 뒤 비올라 버전으로 편곡됐다. 브람스의 만년 작품에 속하지만 브람스 특유의 중후를 덜어내 낭만적인 정서가 가득하다. 슈베르트가 노년까지 살았다면, 그도 이런 곡을 썼을까.
“슈베르트라는 한 영혼의 시린 고독을 느끼고, 브람스의 노년의 찬미와 아름다움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 사이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의 정수를 연주하며 저 역시 만끽할 수 있었음에 행복했습니다.”
이날 김남중의 비올라 곁을 지킨 음악적 호위무사는 일리야 라쉬코프스키였다. 그는 솔리스트로도 유명하지만 요즘 국내 클래식계에서 독주자들에게 가장 인기 높은 반주자이기도 하다.
일리야 라쉬코프스키의 피아노는 비올라의 소리에 투명하게 스며들었다. 그가 만들어내는 사운드는 비올라와 합쳐져 또 하나의 악기처럼 울렸다. 그 효과는 과연 대단해서, 마치 세 사람이 연주하는 듯 착시 아닌, ‘착청감(錯聽感)’이 들 정도였다.
앙코르(그라나도스 스페인무곡 2번 오리엔탈)마저 여운이 길고 달았던 연주.
이런 연주를 들려준 김남중의 열정을 응원한다. 그 단순한 열정은 오늘도 틀림없이 객석 누군가의 시리고 시린 고독을 위로했을 것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사진제공 | 제레미비쥬얼스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박나래 주사 이모’ A씨 “뭘 안다고…”, 심경글 삭제 [종합]](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07/132917975.1.jpg)


![맹승지, 끈 끊어질까 걱정…넥타이 위치 아찔해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05/13290850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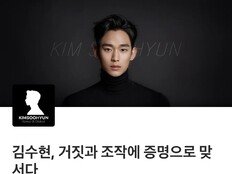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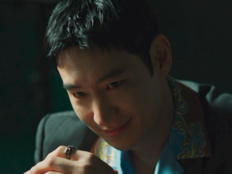
![이동국 딸 설아 폭풍 성장 “언니 재시 복제중”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07/13291515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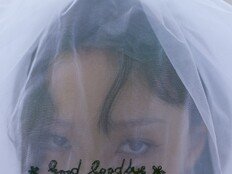
![유승옥, 확실한 애플힙+핫바디…베이글美 여전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05/132909885.1.jpg)
![쯔양이 직접 돈쭐내러 간 곱창집 [SD튭]](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07/132918757.1.png)







![유승옥, 확실한 애플힙+핫바디…베이글美 여전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05/132909885.1.jpg)
![“다 지나간다” 박미선, 암 투병 당시 미소 잃지 않았다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5/12/07/132917714.1.jpg)
![박주현 파격 비키니, 복싱으로 다진 몸매 대박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5/12/07/132916942.1.jpg)

![이동국 딸 설아 폭풍 성장 “언니 재시 복제중”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5/12/07/132915151.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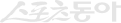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