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이렇게 딱 들어맞을 줄 몰랐다. 뮤지컬 ‘태양왕’(원제 Le Roi Soleil·연출 박인선·제작 EMK)이 용두사미의 절정을 보여줬다.
지난해부터 ‘2014년 최고의 기대작’이라 각광받은 ‘태양왕’ 국내초연은 개막과 동시에 망작으로 전락했다. 루이 14세의 일대기를 그린 ‘태양왕’은 EMK 뮤지컬 컴퍼니와 마스트엔터엔먼트가 의기투합해 제작비 70억 원을 투입한 대작이다. 제작 때부터 화려한 프랑스 왕실을 재현한 세트, 매혹적인 음악,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이야기가 함께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극장에 앉아있기가 힘들었다. 결과물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가장 큰 문제점은 스토리와 배우들의 실력이다. 루이 14세는 “짐(朕)이 곧, 국가”라고 했을 만큼 프랑스 부르봉 절대왕정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프랑스 국민에게 원망과 비난의 존재였지만 절대적인 존재이기도 했다. 그런 인물을 극 속에서는 여자 때문에 눈물콧물을 쏟는 일명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왕으로 만들어버렸다. 대중을 사로잡는 위엄과 카리스마 넘치는 왕의 일대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태양왕’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했다.
루이 14세와 3명의 여성이 사랑에 빠지는 원작의 이야기를 담았다고는 하지만 개연성이 부족하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사라졌으니 다른 이야기들은 들쑥날쑥하고 웃음을 주는 곳은 요란하기만 하다. 주인공의 “짐이 곧 국가”라는 대사에서 감동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어수룩한 이야기에 캐릭터도 살지 못한다. 게다가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는 설상가상이다. 루이 14세로 분한 신성록과 안재욱의 노래와 연기를 보고 있자니 관객들은 좌불안석이다. 물론 남자배우들이 소화해야 하는 음악의 음역대가 높은 편이다.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신성록의 가성과 안재욱의 불안정한 음정처리는 몰입을 방해한다. 굳이 저 배우들을 캐스팅해야 했는지 의문마저 들 정도다. 심지어 한 관객은 1막이 마치고 “그냥 집에 갈까?”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10만 원이 넘는 티켓값을 지불하고도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

주연들에 비하면 조연들의 연기는 봐줄만하다. 프랑소와즈(김소현, 윤공주), 마리(임혜영, 정재은), 몽테스팡(이소정, 구원영), 보포르(김성휘, 조휘), 이자벨(오진영), 마자랭(김덕화, 박철호), 안느(우현주) 등은 안정적으로 극을 이끌어가고 필립(김승대, 정원영)이 관객에게 웃음을 주는 깨알애교를 펼친다.
극의 아름다움을 한층 느끼게 하는 퍼포먼스는 분명 화려하지만 겉도는 느낌이다. 와이어에 매달려 하늘을 날고 봉에 매달려 과감한 동작을 보여주는 배우들의 역량은 상당하다. 클래식 발레, 현대무용, 팝핀,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장르의 안무는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지만 극과 따로 노는 듯한 분위기라 집중은 되지 않는다.
국내초연이고 프랑스 뮤지컬이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맞지 않을 거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뮤지컬 ‘태양왕’은 흠이 많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눈높이가 높아진 관객들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 작품들이 수많은 관객들의 곁을 지나갔는가. 관객들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제작사들도 수준 있는, 10만원 내외의 티켓 값이 아깝지 않은 작품을 선보야 할 것이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사진제공|EMK 뮤지컬컴퍼니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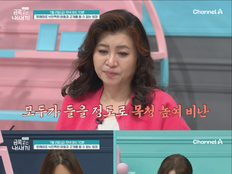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이민정, 딸과 첫 해외여행서 응급 상황…“♥이병헌이 밤새 간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1053.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정다은♥’ 조우종 새 출발, 9년 인연 끝냈다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0/02/05/99554979.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