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A 양현종. 스포츠동아DB
KBO리그 FA(프리에이전트) 제도는 격변기에 있다. 중소형 FA의 이적 기회를 위한 등급제가 논의되고 있고, 도입 시 FA 18년 역사를 뒤흔들만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시기에 사상 초유의 계약 하나가 화두를 던졌다. 올해 FA 투수 최대어 양현종(28)이 원 소속팀 KIA와 총액 22억5000만원에 ‘1년 계약’을 했다. 통상적으로 FA시장은 ‘4년 계약’으로 획일화돼 있지만, KIA와 양현종은 서로의 사정을 감안해 1년 계약을 했다. 1년 뒤 양현종이 원한다면, 방출로 지금껏 없었던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다.
A급 선수의 FA 계약이 4년으로 통일된 이유는 FA 재자격 취득까지 풀타임 4시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이 4년보다 많았던 건 공식적으로 2003년 말 두산에서 롯데로 이적한 정수근(6년간 옵션 포함 40억6000만원) 뿐이었다. 계약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는 대개 4년을 담보하기 힘든 베테랑 선수나 보상규정에 따라 이적이 힘든 중소형 FA에 한정됐다.
양현종과 KIA가 1년 계약에 도달한 배경엔 주체하기 힘든 ‘계약금 폭등’ 현상이 있다. 계약금은 해외에선 ‘사이닝 보너스’로 불리는데, 메이저리그의 경우 장기계약 시 대개 10%를 넘지 않는다. LA 다저스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는 2014년 초 7년 총액 2억1500만달러에 계약하면서 사이닝보너스는 1800만달러로 전체 금액의 8.37%에 그쳤다. FA 역시 많아야 20%대다. 최근 샌프란시스코로 이적하면서 4년 6200만달러에 계약한 마무리 마크 멜란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00만달러의 계약금을 받았는데, 첫 해 연봉은 400만달러(이후 1000만~1400만~1400만달러)에 불과하다. 계약금 중 선지급 받는 1200만달러를 합치면 첫 해 1600만달러를 수령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사이닝보너스의 비중을 줄이거나 전체 연봉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게 일반화된 메이저리그와 달리, KBO리그는 계약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삼성에서 LG로 이적한 차우찬은 95억원 중 계약금으로 55억원(57.89%), 지난해 말 NC 유니폼을 입은 박석민은 96억원 중 56억원(58.33%)이었다.
KBO의 표준 ‘야구선수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은 2회로 분할하여 1회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KBO리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즉 수십억원의 계약금을 계약 첫 해에 모두 지급해야하는 것이다.
양현종과 1년 계약한 KIA 역시 계약금의 문제가 컸다. 팀에 잔류한 나지완의 계약금은 40억원 중 16억원이었고, 사상 첫 100억원 계약으로 영입한 최형우의 계약금은 40억원으로 모두 총액의 40%였다. 양현종과 100억원대 계약을 할 경우, 1년 동안 감당하기 힘든 지출이 불가피했다.
대개 구단들은 ‘특별예산’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모기업의 지원을 통해 마련하곤 한다. 국내 프로스포츠 중 FA에게 이러한 형태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건 야구밖에 없다. 프로축구와 남자프로농구가 연봉과 인센티브로 나눠 계약하고, 나머지는 오직 연봉만 지급한다.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계약금 상한제’ 도입이 논의 중이다. 이는 FA 등급제와 맞물려있다. 선수협회와의 논의로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해 제도 보완을 하자는 식이다. 하지만 등급제가 제도 변화의 끝이 되어선 안 된다. FA 4년 재자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메이저리그의 경우, 1년 계약을 하든 10년 계약을 하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FA다. 한국과 같은 선수 보상이 없어 이적에 걸림돌이 적다. 구단은 필요에 따라 단기계약 혹은 장기계약을 하면 그만이다. 선수공급이 많아지기에 시장의 적절한 가격형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현재로선 4년 재자격 조항을 폐지하긴 힘들다는 게 KBO 의 설명이다. FA 자격유지 선수가 넘치게 되고, 보상규정에 따른 구단의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결국 등급제를 통한 보상규정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A급 선수들의 지나친 장기계약 요구로 구단의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다. 제한적인 선수층 탓에 특정 선수들의 몸값만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FA 등급제를 통한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뒤, 계약기간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도 거품 빼기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김영준의 18.44m] 롯데, ‘골든타임’을 허비할건가](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6/09/19/80347157.4.jpg)

![[베이스볼 브레이크] 외국인선수 계약 기상도, 어디까지 왔나?](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6/12/21/81979534.2.jpg)


![보아 ‘25년 동행’ SM 떠난 근황…“잘 지내고 있어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5326.1.jpg)

![몬스타엑스 체조 찢었다…근본의 셋리로 새 월투 시작 ft.아이엠 삭발 (종합)[DA:리뷰]](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5581.1.jp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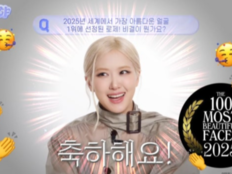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하시4’ 김지민, 김지영 신부 입장에 끝내 오열…“너무 예쁘고 기뻐서” [SD셀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6390.1.pn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펑고 한 번 더 받는 KT 허경민, 자신 향한 엄격한 잣대 [SD 질롱 인터뷰]](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2808.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