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1년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제1회 NHK배 컬링선수권대회에서 오구리 유지가 스톤을 던지고 있다. 사진제공|기타미시교육위원회
■ 일본 컬링대표팀의 감동스토리
1. 홋카이도 양파 산지 기타미 출신들
2. 일본 컬링 탄생시킨 선구자 오구리
3.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선수들 지원
4. 스승 영전에 바친 감동의 올림픽메달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기자가 가장 집중해서 봤던 경기는 여자 컬링 한일전(준결승)이었다. 피 말리는 연장 접전이 벌어진 그 경기는 두 팀의 공통점이 많아서 더욱 흥미진진했다. 우리는 마늘의 주산지인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고교 동창 선후배들이 팀을 이뤘다. 일본은 양파가 많이 나는 홋카이도 기타미(北見)에서 함께 학창시절을 보낸 선수들이 팀을 이뤘다. 오츠크 해를 바라보는 곳에서 초동학생 때부터 함께 컬링을 하며 이런저런 우정을 쌓아온 선수들이었다. 오랜 세월의 무게로 다져진 우정과 얼음판 위에서 흘린 두 나라 대표팀의 땀은 경쟁 팀이 절대 가지지 못한 장점이었다.
● 한국과 일본 컬링의 새 역사를 만든 주인공
컬링은 북반구의 몇몇 국가들에서만 인기를 누리고 경쟁력도 높은데, 한국과 일본은 선지자의 노력과 열정으로 단시간에 기적을 만들어냈다. 우리 컬링의 역사는 2006년 5월 의성에 컬링전용경기장이 건설되면서 시작됐다. 생소한 운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북체육회가 공동지원을 했고, 사유지에 전용경기장을 들어서면서 역사가 만들어졌다. 지역의 꿈나무들을 모으고 이들을 훈련시킨 김경두 전 대한컬링협회 부회장의 오랜 헌신이 없었다면 이번 평창올림픽의 아름다운 기억은 신기루로 끝날 뻔했다.
일본에도 그런 리더가 있었다. 오구리 유지였다. 1980년 그는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컬링 강습회에 참가한 뒤 새로운 스포츠의 매력에 흠씬 빠졌다.
오구리는 마을의 전통축제 때 컬링을 선보인 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천연 경기장을 만들었다. 아내와 조그만 가게를 운영했던 그는 겨울이 길고 추운 기타미에서 눈을 다져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물을 부어서 컬링이 가능한 얼음판을 만들었다. 장비가 부족하자 스톤을 대신해 프로판가스통이나 알루미늄통을 사용했다. 브러시의 대용품으로는 대나무 빗자루가 등장했다. 비싼 스톤을 대신해 직접 돌을 깎아서 사용했다.
오구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생활 스포츠로서의 컬링의 효과를 알아봤다. 열정을 높이 사서 지역의 초대 컬링협회장이 됐다. 그는 지역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기타미는 1988년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컬링전용경기장을 건설했다. 그곳은 이제 일본 컬링의 성지가 됐다.

오구리의 열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본여자컬링대표팀 LS 기타미. 초등학교 시절 그가 발탁한 선수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내 고인의 꿈과 약속을 지켜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오구리와 다섯 아이들
오구리는 지역 아이들에게 눈을 돌렸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찾아다니며 컬링의 재미를 설명했다. 재능이 있는 꿈나무를 발굴했다. 전용컬링장이 들어선 기타미의 도코로 지역은 컬링이 체육수업의 과정으로 들어갔다. 사람을 위한 투자 덕분에 많은 유망주들이 발굴됐다. 1998년 나가노올림픽 때는 5명의 일본대표선수가 기타미 도코로 출신이었다. 2006년 토리노와 2010년 밴쿠버대회 때는 3명의 선수가 도코로 출신이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우리의 팀을 만들었다. LS(Loco Solare)기타미의 탄생이었다. LS는 태양처럼 빛나는 도코로의 아이들이라는 뜻이다. 평창올림픽에 출전한 일본대표선수는 모두 오구리와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힌 우리 동네 선수다.
주장 모토하시 마리는 가장 먼저 오구리의 손에 이끌려 스톤을 밀었다.
2010년 다른 지역의 컬링팀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 지역의 팀을 창설하겠다”면서 가장 먼저 오구리에게 인사를 드렸다. 올림픽에 2번이나 출전했던 마리는 “고향의 빛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리지역 팀을 만들겠다”며 앞장섰다. 그의 노력 덕분에 2010년 8월 LS기타미가 만들어졌다. 지역사회는 선수들이 걱정 없이 운동하도록 지원했다. 가장 먼저 팀에 합류한 선수가 리드 요시다 유카리, 세컨드 스즈키 유미였고 요시다 자매의 지나미도 서드로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오구리가 초등학교 시절 컬링을 가르쳐준 꿈나무들이었다. 오구리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자질이 있다”며 항상 희망을 키워줬다. 팀의 완성은 스킵 후지사와 사스키의 영입이었다. 그는 5세 때 컬링을 시작한 영재였다. 아버지 후지사와 미쓰요시의 영향으로 일찍 컬링가문의 일원이 됐다. 미쓰요시는 오구리의 제자다. 중학교 교사였던 1998년 나가노올림픽 일본 남자컬링팀의 후보선수가 됐다. 사스키는 아버지의 자질을 이어받아 어릴 때부터 군계일학이었다. 중부전력 소속으로 2014소치올림픽 대표선발전에 도전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좌절을 경험한 뒤 컬링을 포기하려던 때도 있었다. 사스키는 고향팀에 합류하면서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었다.
● 오구리가 세상을 떠나던 날 병실에서 선수들은 평창행을 약속하다
2017년 5월 오구리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한창 훈련에 열중하던 선수들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도착 20분 전 그는 영면했다. 향년 88세였다. 오구리의 마지막 소원은 LS기타미가 평창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었다. 자신도 평창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반드시 할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리자. 꼭 평창에 나가자”고 영정 앞에서 다짐했다.
세계선수권대회 때, 지역 주민들이 오구리의 영정을 들고 LS 기타미를 응원했다. 평창올림픽에서도 LS기타미의 선수들은 악전고투를 거듭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상황,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생전에 오구리가 했던 말을 모두 가슴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구리는 “절대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좋은 경기를 하라”고 가르쳤다. 선수들은 그 말을 따랐고 약속을 지켰다. 일본여자컬링 역사상 최초의 메달을 따낸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메달을 들고 오구리의 무덤을 찾아갔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속보] 아프다던 류현진, 결국…상상 못한 근황](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8/03/05/88951585.1.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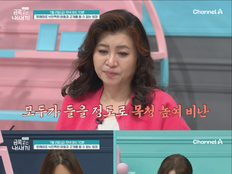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이민정, 딸과 첫 해외여행서 응급 상황…“♥이병헌이 밤새 간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1053.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