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ufasa and scar - the lion king - photo by joan marcus ⓒ disney
디즈니가 만든 뮤지컬에서는 어김없이 디즈니만의 ‘철학(혹은 공식)’ 냄새가 물씬하다. 대략 이런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봐도 재미있을 것(그렇다고 아동극은 아니어야 할 것), 지나치게 어둡거나 어렵지 않을 것, 분명한 메시지를 지닐 것, 들을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할 것, 무엇보다 해피엔딩이어야 할 것.
디즈니가 제작한 첫 뮤지컬인 ‘미녀와 야수(1994)’부터 ‘아이다(2000)’, ‘메리포핀스(2004)’, ‘타잔(2006)’, ‘인어공주(2008)’를 거쳐 최신작인 ‘겨울왕국(2018)’에 이르기까지 이 공식을 벗어난 작품은 없다. 심지어 ‘아이다’와 ‘인어공주’는 원작의 비극적 결말을 뜯어 고쳐서까지 해피엔딩으로 바꿔 놓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7일 대구 계명아트센터에서 개막한 뮤지컬 라이온킹은 퍼펙트한 ‘디즈니표 뮤지컬’이라 해도 좋겠다. 아니, 라이온킹이야말로 디즈니의 제작어법에 가장 충실한, 디즈니의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디즈니가 만든 그 어떤 뮤지컬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제법 쌀쌀한 기온에 재킷 지퍼를 끌어올리고는 쿠폰으로 산 커피 한 잔을 쥔 채 밤 사막 한복판의 궁전처럼 환하게 불을 밝힌 계명아트센터를 바라보며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저 안에 광활한 밀림이 있겠지’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났다.
배우들이 물항아리 얹듯 머리에 인 소품으로 형상화한 수풀 위로 아빠 사자 무파사와 아기 사자 심바가 뛰어 노는 장면이 떠올랐다. 라이온킹의 명장면 중 하나다.

mukelisiwe goba as rafiki and the north american tour company - the lion king - photo by joan marcus ⓒ disney
앞서 밝혀 두었듯 디즈니 뮤지컬은 선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라이온킹이 관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첫 장면에서 이미 펼쳐 내보여진다. 마치 주술사의 주문과 같은 개코원숭이 라피키의 노래가 시작되면 믿을 수 없이 거대한 붉은 태양이 대지 위로 떠오른다.
이어 기린이 무대 위를 거닐고 가젤이 뛰어다닌다. 형형색색의 새들, 얼룩말, 사슴, 코뿔소가 객석 통로를 유유히 걸어 무대에 오른다. 마침내 거대한 코끼리가 모습을 드러내면 객석에서는 비명 같은 탄성이 터져 나오게 된다.
역사상 그 어떤 뮤지컬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장관과 함께 불리는 넘버가 ‘서클 오브 라이프(Circle of Life)’다. 삶은 돌고 돈다. 죽음은 또 다른 탄생을 부른다.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순환을 통해 생명은 영원한 삶을 얻는다. 이 유명한 ‘서클 오브 라이프’ 오프닝은 프라이드록의 왕 무파사의 아들 심바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이다.
흥미로운 것은 디즈니 뮤지컬이 메시지를 다루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우린 숨기는 거 없다. 그냥 봐라”다. 메시지를 곳곳에 숨겨 놓고 관객과 보물찾기를 벌이는 일은 없다. 그렇다 보니 곱씹을 만한 은유나 상징도 없다. 디즈니 작품의 단점이라기보단 선택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뮤지컬을 이루는 두 기둥은 극본(가사 포함)과 음악이다. 하지만 라이온킹만큼은 하나의 기둥을 추가해야 한다. 그 기둥은 장르가 아닌 사람의 이름이다. 바로 연출가 줄리 테이머.
이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같은 동물’들을 구현한 아이디어는 줄리 테이머로부터 나왔다. 덕분에 라이온킹은 분장과 움직임만으로 고양이들을 표현한(물론 이것도 대단하다) ‘캣츠’로부터 성큼 진화할 수 있었다.
사실 라이온킹은 은유와 상징이 부재한 작품이 아니다. 라이온킹의 은유와 상징은 대사와 음악이 아닌, 제각각 달리 표현되고 기능하는 정교한 퍼펫과 마스크에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줄리 테이머, 마이클 커리의 마스크와 퍼펫, 리처드 허드슨의 무대 디자인, 도널드 홀더의 조명이 좁은 무대 위에 광활한 아프리카의 초원을 펼쳐 놓았다. 여기에 레보 엠의 토속적인 음악이 얹혀지며 라이온킹은 그야말로 현대 미술작품의 움직이는 전시장처럼 완성됐다.
괜찮다면 이쯤에서 라이온킹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 일종의 관람 팁이라 해도 좋겠다.
무파사의 어슬렁거리는 걸음은 실제 사자의 스텝을 모방하면서 왕의 위엄을 표현한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 은근 중독성이 있다. 공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와 함께 거울을 보며 흉내내 보자.

lionesses - the lion king - photo by joan marcus ⓒ disney
조명이 열일한 무대의 색감이 마치 우리나라의 천연염색을 입힌 것처럼 아름답다. 그 은은한 색감을 감상해보자. 필름 카메라 시절의 사진 같기도 하다.
아프리카 토속음악의 핵심은 침대일체형 인간마저 벌떡 일으켜 세우는 리듬이다. 무대의 양 사이드에는 타악기 연주자가 배치되어 있다. 공연장을 가득 휘돌며 펴져 나가는 타악기의 사운드, 배우들의 웅장한 허밍이 무대를 더욱 광활하게 느끼게 해준다. 상상력이 펄럭펄럭 넓어져 간다.
비주얼에만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비주얼을 구현한 아이디어도 즐겨보자. “와! 멋지다” 하고 첫눈에 반하고, “저걸 저렇게 표현하다니!” 하고 두 번째 눈에 놀라게 된다.
신통방통한 동물들의 모습, 움직임으로도 충분하지만 식물들에게도 눈을 주어 보자. 라이온킹에서는 식물들마저 생명력을 갖고 꿈틀거리는 것만 같다.
오프닝에서 소 닭 보듯 하던 퓨마와 기린이 마지막 군무 장면에서 슬쩍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의 인사는 조금 생각할 재미를 준다.
마지막으로 ‘하쿠나 마타타’. 라이온킹을 만나는 150분 동안 고민, 걱정 따위는 제발 객석 의자 밑에 내려놔두자. 이 뮤지컬을 보는 당신의 모든 게 잘될 테니까. 하쿠나 마타타.
대구|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속보] 류현진, 최고 연봉 신기록…현지 들썩](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8/11/13/9284653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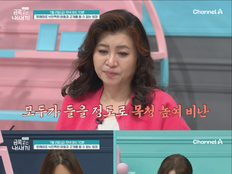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강도에 역고소’ 당한 나나 “무너지지 않고 바로 잡을 것, 걱정 마시라” [전문]](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79222.1.png)

![이민정, 딸과 첫 해외여행서 응급 상황…“♥이병헌이 밤새 간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1053.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트와이스 모모, 티셔츠 터지겠어…건강미 넘치는 바디라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4297.1.jpg)
![레드벨벳 슬기, 아찔한 바디수트…잘록한 허리+깊은 고혹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4151.1.jpg)

![‘정다은♥’ 조우종 새 출발, 9년 인연 끝냈다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0/02/05/99554979.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