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릴 때 별명이요? ‘닫음’. 아하하!”
손열음의 ‘열음’이라는 이름은 국어교사였던 어머니 최현숙씨가 지어준 순수 한글이름입니다. ‘열매를 맺음’이라는 말에서 맨 앞 글자와 끝 글자를 따 지었다고 하지요.
딸이 피아니스트로 대성할 것을 예견이라도 하신 걸까요. 저는 ‘열 개의 손가락이 빚어내는 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0년 전 저와의 인터뷰에서 손열음씨는 모차르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결선에서 쳤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영상은 클래식 팬이라면 한 번쯤 유튜브에서라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 손열음씨는 자신을 “모차르트 애호가”라고 정의하면서 “모차르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라고 물었지만 딱 부러지는 답을 듣지는 못했죠.
그저 손열음씨는 “기본적으로 저하고 잘 맞는 느낌”이라고 두루뭉수리 답했을 뿐입니다. 아, 힌트 같은 것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차르트를) 평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모차르트가) 입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간이나 잊고 있던 이 질문이 문득 다시 떠오른 것은 어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였습니다. 연주자가 아직 입장하기 전, 조명 아래 눈을 착 내리깔고 있는 까만 피아노를 노려보고 있자니 문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날 연주회는 이른바 ‘손열음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리사이틀’ 전국투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5월에는 원주, 서울, 통영. 6월에는 광주, 대구, 고양, 김해를 돌며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를 완주하게 됩니다.
제가 찾은 첫 연주회는 5월 2일 화요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번부터 6번까지 6개 소나타를 차례로 연주합니다. 6일 예술의전당의 11, 12, 13, 14번의 ‘떡’이 내심 더 커 보이긴 하지만 평소 잘 듣지 않게 되는 레퍼토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우는 포도를 향해 오늘도 뛰어오릅니다.
콘서트홀은 그야말로 초만원. 합창석까지 열었더군요. 로비는 손열음씨의 ‘위대한 모차르트 대장정’ 출범식을 보기 위한 음악 팬들로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손열음씨가 등장합니다.
예의 어깨까지 드리운 긴 머리. 두 팔을 드러낸 화이트 상의에 역시 화이트의 바지, 힐까지 싹 화이트입니다. 건반과 살짝 멀어 보이는 ‘손열음 포지션’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는 곧바로 1번 알레그로로 돌진합니다.
소나타 연주는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열음씨는 암보로 연주했습니다. 아마 18번까지 그렇게 하겠지요. 소나타 한 곡당 20분씩(실은 좀 더 되겠지만)만 잡아도 6시간이 훌쩍 넘는 연주분량의 악보를 전부 머릿속에 저장해놓고 있다니. 과연 초특급 프로의 세계란!
이날 손열음씨의 모차르트는 3월에 나온 음반과는 확실히 ‘다른 맛’이 있더군요. 음반에는 담기 힘든 자유로움과 신선한 아이디어가 곳곳에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적어도 ‘모차르트는 이래야만 해’라는 게 없어서 좋았습니다.
작은 종처럼 투명하게 울리는 고음, 부드러우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장식음들, 단단하게 리듬을 받쳐 든 왼손. “음색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던 손열음씨지만 이날 연주에서는 달랐습니다.
세계적인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정작 “손열음의 모차르트는 뭐야”라고 묻는다면 즉답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손열음만의 모차르트’는 분명 존재하지만 막상 쥐려고 하면 모래처럼 스르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버리곤 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날처럼 잔뜩 집중해서 연주를 듣고 있으면 ‘그렇지’하고 얻어 걸리는 것들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손열음의 모차르트’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거다’라기보다는 ‘이건 아니다’라고, 반대로 지워나가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 손열음의 모차르트는 지나치게 말랑말랑하지 않다.
● 손열음의 모차르트는 지나치게 학구적이지 않다.
● 손열음의 모차르트는 지나치게 끈적거리지 않는다.
● 손열음의 모차르트는 지나치게 밝지도 않다.
● 손열음의 모차르트는 ‘이래야 모차르트지’라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 드디어 ‘손열음 모차르트의 비밀’이 슬슬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실은 요런 걸 찾아내는 재미도 꽤 쏠쏠하답니다.

1번과 2번을 끝낸 손열음씨가 그제서야 환한 웃음을 보이며 객석을 향해 인사합니다.
15분간의 인터미션 후 2분에서는 4, 5, 6번을 달립니다. 2부에서는 의상도 좀 더 과감해졌습니다. 등과 어깨를 드러낸 블랙 상의에 화이트 바지. ‘이제 좀 편히, 제대로 쳐볼까’ 하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손열음의 모차르트라고는 해도, 한 작곡가의 소나타만 주구장창 들으면 지루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연주가 필요한 작품에서는 화난 고양이처럼 앙칼진 연주를 들려주곤 하는 손열음씨지만 이날 연주에서는 ‘모차르트답게’ 송곳니 한 개쯤 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가 펼쳐내는 프레이즈 하나 하나, 악장 하나 하나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딤섬 뷔페 같군요. 지루할리가요.
연주가 중반쯤 들어가니 피아노 소리도 공간에 충분하게 적응합니다. 같은 공연장, 늘 거기 있는 피아노라고 해도 그날의 공기, 관객 수, 이들의 호흡과 기운에 따라 소리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2부가 되니 피아노의 소리가 공연장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스며듭니다.
즐겁고 행복한 연주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날 들은 2번 F장조 K.280의 2악장 아다지오가 고막 위를 돌아다닙니다. 마치 어둔 달밤, 사박사박 눈이 내리는 듯한 연주였거든요.
오랜만에 ‘손열음’을 폐 속 깊이 들이 마시고 왔습니다.
10년 전의 질문에 대해 이날 아주 조금은, 깨물어 먹을 정도의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사진제공 | 파이플랜즈
※ 일일공프로젝트는 ‘일주일에 한 편은 공연을 보자’는 대국민 프로젝트입니다.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문가영, 어깨라인 드러낸 오프숄더…청초 비주얼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786.1.jpg)
![우즈, 첫 정규 17곡 꽉 채웠다…“도약의 출발점”[일문일답]](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1675.1.png)
![‘육상계 카리나’ 김민지, 성형설 입 열었다 “저도 이렇게 예뻐질 줄…”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4063.1.jpg)
![‘임신 18주’ 김지영, 60kg 진입→혼인신고 완료…“옷이 다 작아” [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1408.1.png)


![‘임신 31주’ 나비, 만삭 D라인 화보…아들 배에 귀 ‘뭉클’ [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0984.1.png)
![‘환승연애4’ 백현, 전 여친 박현지 X룸 생수의 진실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7729.1.jpg)
![에스파 윈터, 슬립 차림 고혹적 분위기…색다른 느낌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6570.1.jpg)
![샤라포바, 이탈리아서 뽐낸 수영복 자태…몸매 여전해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477.1.jpg)





![안정환, 피자집 창업 논란 해명 “기부 목적” [전문]](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3/03/07/118211740.1.jpg)
![랄랄 또 성형…심각하게 부은 얼굴에 ‘딸도 기겁’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765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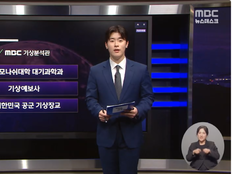

![샤라포바, 이탈리아서 뽐낸 수영복 자태…몸매 여전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477.1.jpg)
![문가영, 어깨라인 드러낸 오프숄더…청초 비주얼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786.1.jpg)

![이채영, 화끈한 노브라 패션+키스마크…언니 옷 여며요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678.1.jpg)
![‘44kg’ 감량했던 김신영 “돌아왔다” 입 터진 근황 [DA클립]](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1/133442467.1.jpg)

![남지현 촬영장 현실 폭로…“감독님이 ‘못생긴 X’ 이라 불러”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0337.1.png)
![씨스타 다솜, 복근 말도 안 돼…청순미 벗어던지고 과감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8373.1.jpg)
![고아성, 해외 이동 중 폭설에 위급상황 “차 미끄러져 패닉”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8063.1.jpg)
![캐나다 行 ‘이휘재♥’ 문정원, 4년 만 근황…“어느새 3월” [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4/133459538.1.jpg)


![에스파 윈터, 슬립 차림 고혹적 분위기…색다른 느낌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6570.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