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원도 알아봐야 하고… 소설도 써야 되고…”
신간 ‘붉은 비단보’의 저자 권지예 작가는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이며 동시에 소설가다. 학부모 역할에만 몰두할 수도 없고, 창작에만 몰입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그냥 ‘허허실실’ 살기로 했단다. ‘예술가도 불완전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성 예술가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은 모 아니면 도다. ‘4차원 세계’에서 공상을 거듭하며 살거나,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자살한다.》
명랑소녀 ‘빨강머리 앤’ 혹은 비운의 요절 작가 ‘전혜린’이다.
그러나 그 중간도 있다.
“저는 절 보고 평범하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스캔들도 일으키고 그래야 작가답지 않냐?”고 우스갯소리도 건넨다. 여성이라고 무엇을 포기해선 안된다. ‘현실 감각’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예술세계’와 공존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권지예 작가는 “앞으로 예술가는 자기 삶도 즐기면서 직업적으로 더 냉철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하게 ‘더 많은’ 작품으로 독자와 만나야 한다. 요절하면 신화가 될 뿐, “더 이상 작품이 없지 않냐?”는 반문이다.
‘이 땅에서 예술 하는 사람’ 으로서 생활형 고민을 소설에 녹여낸 탓일까? ‘모던으로도 부족해 늘 포스트모던 한 것에 목말라 있다’던 작가가 조선시대 여인을 찾아갔다. 가정을 박차는 인형의집 ‘노라’는 되지 못했지만, 가정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사대부 집안 여인이 주인공이다.
바로 ‘신사임당’이 모티브다. 현모양처의 전형, 그도 예술가였다!
작가는 신사임당을 통해 떠오르는 ‘생애 이면과 바깥의 조도(照度) 차이’에 집중했다. ‘자유로운 영혼’, ‘피 흘리는 영혼’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서 더 고통스럽다는 얘기다. 가슴 속에 예술적 기운을 꼭꼭 숨겨두고, 가정에서 억누르고 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작가는 “영혼의 고통이 질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유교적인 사회 속 여자가 ‘그림 톤을 잃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켜내려고 했던 것’은 충분히 매력적인 주제이다. 생활과 예술적 기질 사이에서 가까스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다.
딱 ‘붉은 비단보’ 여주인공 ‘항아’의 모습이다. ‘항아’는 예술적 재능을 지닌 사대부가의 딸로, ‘준서’라는 서자 출신의 문재를 사랑했지만 끝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아홉 살에 대나무 숲을 그리러 갔다 만난 첫사랑이다. 서울로 시집을 가고 이후 영영 다른 길을 간다. 항아가 간직한 ‘붉은 비단보’ 안에는 그간 켜켜이 쌓아온 예술적 소품이 가득하다.
준서를 그리워하며 그린 산수화, 준서의 초상화, 연서, 붉은 모란을 그려 넣은 옥색 치마‘등 감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소설가에게 ‘낯선 모험’이었다는 이 소설은 본인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주부, 일상이 무료한 젊은 미혼 여성 등에게 추천한다. 종래에 유행했던 TV 퓨전 사극, 멜로드라마보다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소설을 읽으며, 꾹꾹 눌러놓았던 무의식의 사랑과 열정도 발견할지 모른다.
항아의 이름은 항상 항(恒)자에 나 아(我 )자, ‘항상 나’이다. 주인공이 할아버지에게 고집한 이름이다.‘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는 현대 여성과 ‘항아’는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과 열정 사이에서 아슬아슬 절제미를 지켰던 항아, 치열한 그의 감정선을 따라가 보자.
변인숙 기자 baram4u@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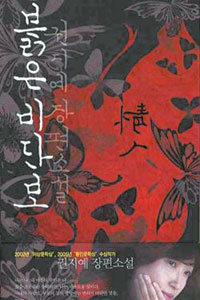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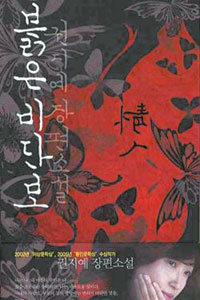
 ‘F3 진출 레이서’ 신우현, 반전의 무면허 (전참시)
‘F3 진출 레이서’ 신우현, 반전의 무면허 (전참시) ‘2049 최고 시청률‘ 기록한 런닝맨, 이번엔 힘지효 소환했다
‘2049 최고 시청률‘ 기록한 런닝맨, 이번엔 힘지효 소환했다 ‘아기가 생겼어요’ 최진혁-오연서, 연기+비주얼+케미 로코 최적화 조합
‘아기가 생겼어요’ 최진혁-오연서, 연기+비주얼+케미 로코 최적화 조합 ‘둘째 득녀’ 조정석, ♥거미와 사는 집 공개…호텔급 주방 눈길
‘둘째 득녀’ 조정석, ♥거미와 사는 집 공개…호텔급 주방 눈길 아이브 안유진, 수영복 입고 건강미 발산 ‘청량 섹시미’
아이브 안유진, 수영복 입고 건강미 발산 ‘청량 섹시미’![사쿠라, 실크 드레스 입고 우아美 폭발…은근한 볼륨감까지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6/133169543.3.jpg) 사쿠라, 실크 드레스 입고 우아美 폭발…은근한 볼륨감까지 [DA★]
사쿠라, 실크 드레스 입고 우아美 폭발…은근한 볼륨감까지 [DA★] 박명수 “전현무 부인, 로봇이 될수도…” (사당귀)
박명수 “전현무 부인, 로봇이 될수도…” (사당귀)![전현무 “김태훈, 왜 멍청이 남편인지 알겠네”…창원 먹트립 ‘올킬’ [TV종합]](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7/133176269.1.jpg) 전현무 “김태훈, 왜 멍청이 남편인지 알겠네”…창원 먹트립 ‘올킬’ [TV종합]
전현무 “김태훈, 왜 멍청이 남편인지 알겠네”…창원 먹트립 ‘올킬’ [TV종합] ‘조폭연루설’ 논란 속 복귀 조세호, 핼쓱해진 얼굴 포착 (도라이버)
‘조폭연루설’ 논란 속 복귀 조세호, 핼쓱해진 얼굴 포착 (도라이버) 유재석, 사고 치고 회장직 大위기 (놀뭐)
유재석, 사고 치고 회장직 大위기 (놀뭐) 엔하이픈, 발매 첫날 165만 장…네 번째 더블 밀리언셀러 ‘가시권’
엔하이픈, 발매 첫날 165만 장…네 번째 더블 밀리언셀러 ‘가시권’ ‘엄친아 끝판왕’ 손태진, 다정+센스만점…요리까지 잘해 (편스토랑)
‘엄친아 끝판왕’ 손태진, 다정+센스만점…요리까지 잘해 (편스토랑) 임영웅 잠실웅바라기스쿨, 팬심이 만든 600만원의 기적
임영웅 잠실웅바라기스쿨, 팬심이 만든 600만원의 기적 QWER, 日 애니 ‘도굴왕’ 오프닝 연다 “첫 OST 가창 영광”
QWER, 日 애니 ‘도굴왕’ 오프닝 연다 “첫 OST 가창 영광” 캣츠아이 ‘Internet Girl’, 英 오피셜 싱글 차트 2주 연속 진입
캣츠아이 ‘Internet Girl’, 英 오피셜 싱글 차트 2주 연속 진입 허가윤, 친오빠 사망 후 발리행…“내일 죽어도 후회 없게”
허가윤, 친오빠 사망 후 발리행…“내일 죽어도 후회 없게” 유희관, 작고한 母 생각에 울컥 “단 한 사람 위해 준비” (불후)
유희관, 작고한 母 생각에 울컥 “단 한 사람 위해 준비” (불후)![소유진, ‘방송복귀’ ♥백종원과 투샷 공개…여전한 부부 케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5/133164240.3.jpg) 소유진, ‘방송복귀’ ♥백종원과 투샷 공개…여전한 부부 케미 [DA★]
소유진, ‘방송복귀’ ♥백종원과 투샷 공개…여전한 부부 케미 [DA★]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