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시아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제9회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 27일 막을 내렸다. 이 대회는 개최순번(일본→한국→중국)에 따라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데 이어 중국이 개최권까지 반납하면서 올해 일본에서 펼쳐졌다. 우리도 개최 의지를 보였으나 기존 순번을 유지하자는 일본축구협회(JFA)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흥행은 역시나 ‘역대급’ 낙제점이었다. 20일 도요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남자부 한·중전을 지켜본 관중은 충격적이다. 214명. 심지어 하루 전 일본-홍콩전도 4980명에 그쳤다. 프로축구 경기보다 못한 수치에 일본 언론들도 깜짝 놀랐다.
유감스럽게도 일본만의 현상은 아니다. 2019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8회 대회도 다르지 않았다. 남자부 한국-홍콩전 관중은 1070명이었다. 최대 흥행카드인 남자부 한·일전은 2만9000여 명이었다. 올해도 적당히 체면치레는 했으나 흥행 참사는 피할 수 없었다.
팬들의 외면에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솔직히 흥행요소가 많지 않다. 특히 스타 부재를 빼놓을 수 없다.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주간에 포함되지 않아 유럽 등 해외리그의 핵심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한다.
냉정히 말해 1.5군에도 미치지 않는 전력을 꾸린 대표팀에 많은 관심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더욱이 올해 대회는 일본과 중국이 자국리그의 어린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켜 훨씬 시들해졌다.
이제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로 전락한 E-1 챔피언십이 유의미해지려면 정확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처럼 큰 변수가 없는 한, 일정부터 바뀌어선 안 된다. 이전 대회는 여름에 열었다가 다음 대회는 한겨울에 개최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대회마다 스케줄이 오락가락하면 권위를 지키기는 어렵다.
선수 차출 규정도 명쾌해야 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은 11월 개막할 2022카타르월드컵을 위한 최종 시험대로 삼고 한·중·일리그의 대어급들을 여럿 호출한 반면 다른 참가국들은 그렇지 않았다. 일부는 연령별 대표팀에 가까웠다. 대회 규정에 ‘국가대표 감독’이 출전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뻔했다. 차라리 프랑스 툴롱컵처럼 대회 출전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회 방식의 변화도 모색했으면 한다. 지금까지는 늘 같은 패턴이었다. 한·중·일은 고정 멤버이고, 나머지 회원국은 예선을 거쳐 출전하는 형태다. 총 3경기는 보장하되, 출전국을 확대하고 토너먼트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필요하다면 중동, 아프리카 국가를 초청해도 좋을 것 같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나는 SOLO’ 8기 올킬녀 옥순, 볼륨 몸매 과시 [DA★]](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22/07/27/114676850.2.jpg)








![손담비, 출산 3개월만에 17kg 빼더니…발레복이 ‘헐렁’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4/133156207.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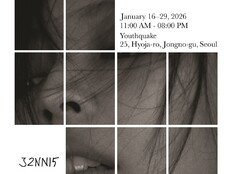


![블랙핑크 리사, 섹시 터졌다, 골든 글로브 파티 올킬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4/13315376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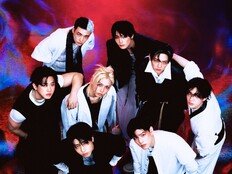

![전현무, 기부 바자회서 ‘바가지 논란’…고장난 승마기 30만 원 [SD이슈]](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5/133168725.1.png)
![“기 받아 갑니다”…권성준·최강록, ‘흑백’ 우승자들의 조합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4/133155685.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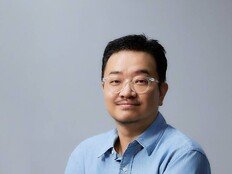



![‘논란 또 논란’ 박나래 인터뷰 공개 후폭풍…임금·전세대출 해명도 도마[SD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14/133152254.1.png)

![블랙핑크 리사, 섹시 터졌다, 골든 글로브 파티 올킬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14/133153761.1.jpg)


![소유진, ‘방송복귀’ ♥백종원과 투샷 공개…여전한 부부 케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15/133164240.3.jpg)




![[단독] 전북 전진우, 英 챔피언십 옥스포드 유나이티드行 임박…이적합의 & 막판 조율 中](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15/133168025.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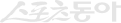
댓글 0